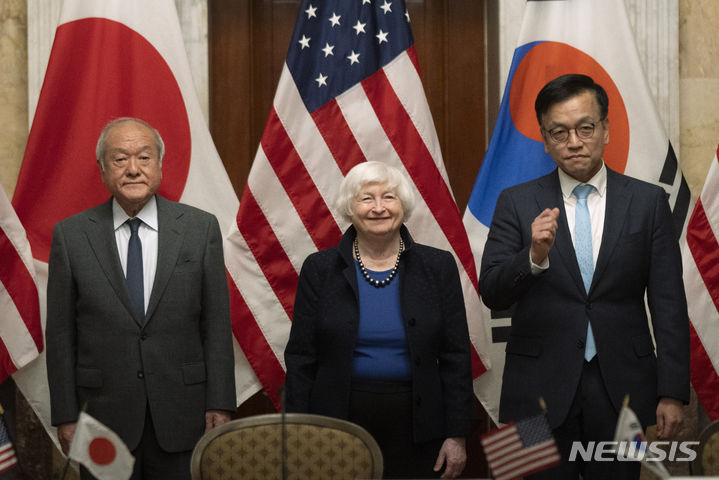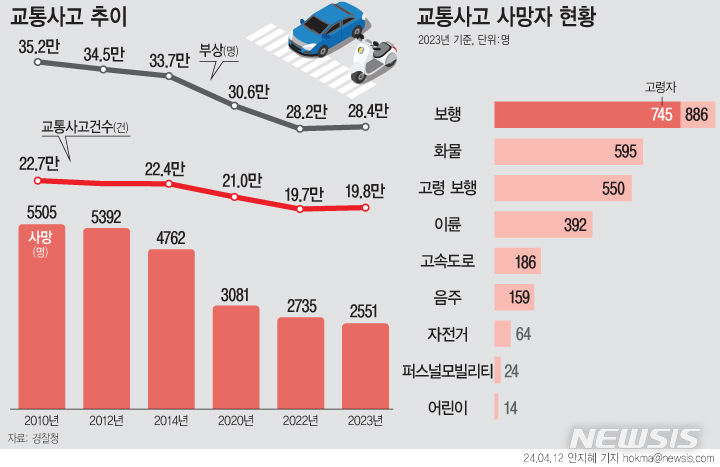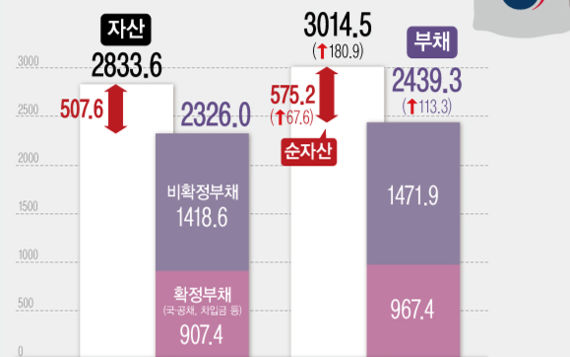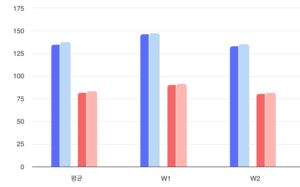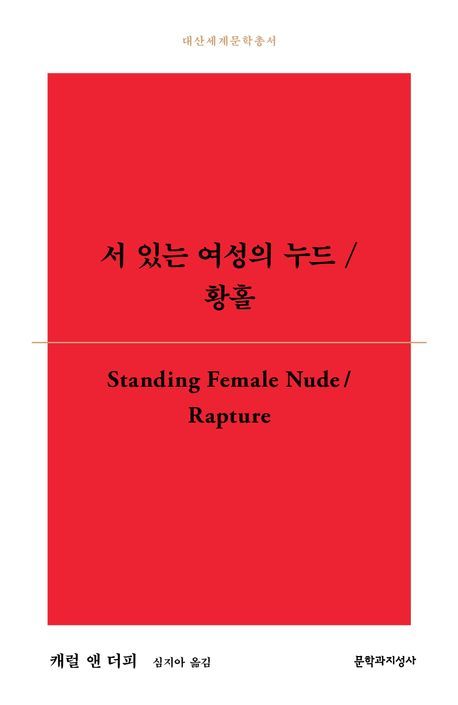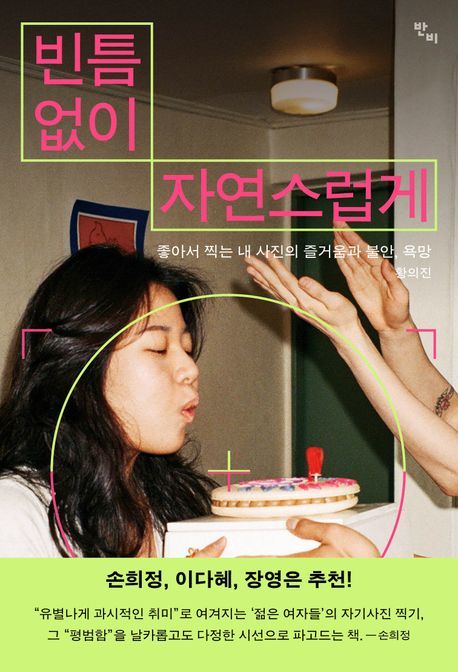[데스크 창]기부천사 회장과 갑질 회장님들...

중국 춘추시대 제나라의 명재상 관중(? ~ BC 645)의 명언이다. 그의 정책이 ‘부국강병’이었던 것으로 볼 때 부국강병의 출발은 ‘인재 육성’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래서 이 말은 ‘교육’의 중요성을 일컫는 말로 수천 년이 흐른 지금도 회자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한국을 꼽을 수 있다. 1950년부터 1953년까지 3년여에 걸쳐 6·25전쟁의 참화를 겪은 한국이 불과 50여 년 만에 세계 10대 무역국의 하나로 우뚝 선 힘이 교육에 있음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 한다.
그러나 이 땅에는 여전히 배움에 목마른 사람이 많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인 한국이 그럴진대 1950·60년대 한국처럼 질곡의 세월을 보내고 있는 빈곤국 국민은 어련하겠는가.
이를 안타까워하며 국내는 물론 아시아, 멀리 아프리카까지 배움의 기회를 아낌없이 나눠주는 사람이 있다.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이다.
1983년 3월 부영을 설립한 이 회장은 이듬해인 1984년부터 지난해까지 분양·임대를 포함해 22만9547가구를 국내에 공급했다. 이 중 임대물량은 21만6803가구로 전체 공급 물량의 83%를 차지한다. 사업을 진행 중인 곳까지 합치면 전국에 부영 사업지만 335개, 총 26만3956가구(2016년 1월 8일 기준)에 달한다.
그사이 설립 당시 자본금 5000만원에 불과했던 그룹 총자산 규모는 이달 기준 16조8050억원(공정자산 기준)으로 급증했다. 지난해 재계 서열(민간기업 기준) 19위에 올라섰고, 건설사 시공능력 평가에서는 12위를 차지했다. 이 회장의 개인 자산 규모도 2조100억원으로 급증해 지난해 미국 경제전문지 포브스가 선정한 국내 억만장자 순위 13위를 거머쥐었다.
이 회장은 서민을 상대로 임대주택 사업을 벌여 벌어들인 천문학적인 돈을 자신과 일가족을 위해 꼭꼭 감춰두지 않았다. 헛되게 쓰지도 않았다.
지금까지 무려 5000억원을 국내외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희사했다. 그래서 그에게 남은 것은 ‘기부왕’ ‘기부천사’라는 타이틀이다.
특히 그는 교육에 아낌없이 지갑을 열었다. “교육 재화는 한 번 쓰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계속 재생산되는,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신념에 따라서다.
실제 그간 국내 93개 초·중·고교와 12개 대학 등에 교육시설을 지원했고, 대학 등 61개 각급 학교에 후원금을 기탁했다. 또 캄보디아·라오스에 각 300개씩 총 600개 학교를 세운 것을 비롯해 총 15개국에 교육용 칠판(60만4244개)을, 17개국에 디지털 피아노(6만1290대)를 기증했다. 그뿐만 아니다. 2008년 사재를 출연해 설립한 우정(宇庭)교육문화재단을 통해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동안 10여 개국에서 온 외국인 유학생 790명에게 장학금으로 약 30억원을 지원했다.
이는 어려웠던 학창 시절 기억 때문인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1941년 전남 순천군(현 순천시) 운평리에서 태어난 이 회장은 1961년 건국대 정치외교학과에 입학했으나 등록금을 마련하지 못해 학업을 중단하고 공군에 자원입대해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은 학창 시절 자신이 겪었던 고된 기억에서 후학들이 벗어날 수 있도록 교육 기회를 베풂으로써 이 시대 세계의 참스승으로 우뚝 섰다.
요즘 이른바 ‘회장님’들이 자행한 온갖 저질스러운 행태가 드러나 가뜩이나 세상살이에 지친 국민에게서 한 조각 남은 미소마저 빼앗아 가고 있다.
차라리 그들이 갑질 경쟁이 아니라 이 회장과 기부 경쟁을 했다면….
그런데 어째서 암울했던 1980년대를 풍미한 개그맨 김병조(조선대 초빙교수)씨의 유행어 “먼저 인간이 되어라”가 자꾸만 떠오르는 것일까.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