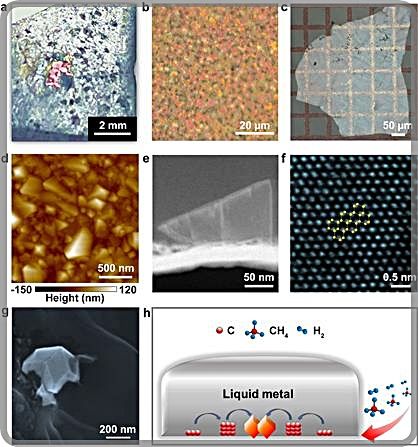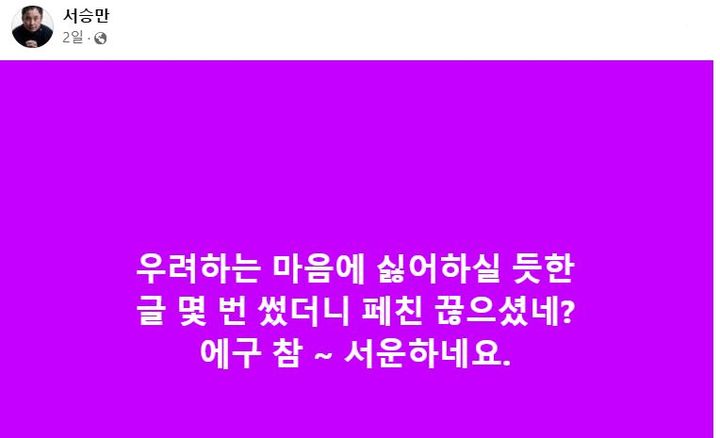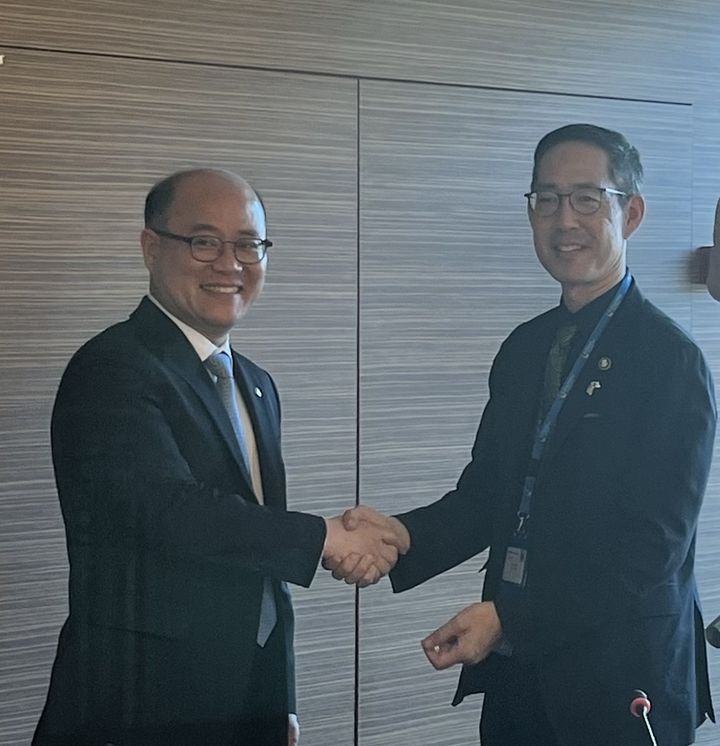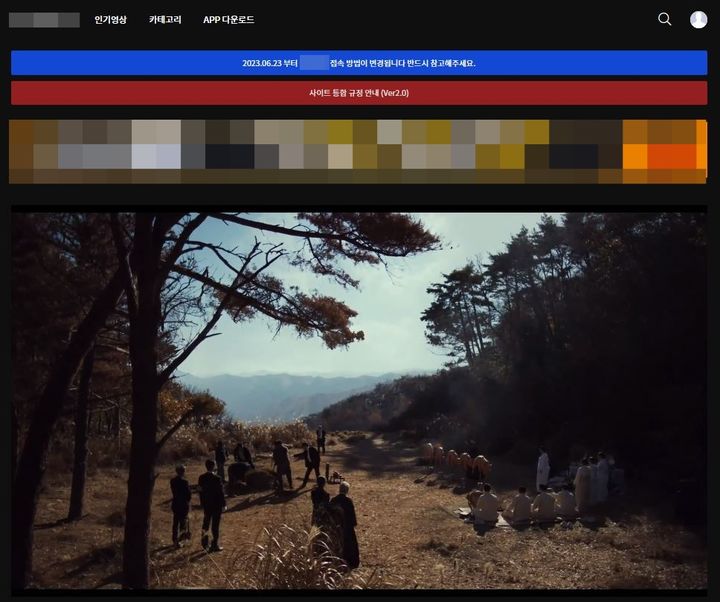"불금인데 일찍들 퇴근하지?"…'칼퇴'도 힘든데 '조퇴' 가능할까

일본 '프리미엄 프라이데이' 벤치마킹
정시퇴근도 힘든데 조기퇴근 가능할까
【세종=뉴시스·】이예슬 기자 = "자, 금요일이니까 퇴근할 수 있는 사람은 퇴근해요."
"부장님은 금요일인데 뭐 하실 거예요?
"난 야근해야지 뭐"
배우 조정석이 출연한 한 CF의 대사다. '불금'에 사무실을 떠나고 싶은 젊은 직장인들이 결국 상사의 눈치가 보여 입었던 재킷을 벗고 책상 앞에 앉는 장면이 표현됐다. 정시퇴근조차 어려운 직장 문화를 풍자한 것이다.
정부가 한국판 '프리미엄 프라이데이'를 유도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으면서 실제로 이 문화가 정착될 수 있을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건전한 여가문화를 조성하고 위축된 소비심리를 회복하기 위한 방안인데 정시퇴근도 힘든 한국의 직장 문화를 감안할 때 실제로 뿌리내릴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된다.
정부는 23일 내수활성화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내수위축 보완을 위한 소비·민생 개선 대책을 내놨다. 대책에는 일·가정 양립을 위해 매월 1회 '가족과 함께하는 날'을 지정하는 안이 포함됐다.
예를 들어 월~목요일에 30분씩 초과근무를 하고 '가족과 함께하는 날'로 지정된 금요일에는 오후 4시까지 2시간 단축 근무를 해 전체 근로시간을 유지하자는 제안이다.
장시간 노동하는 문화를 개선하고 '불금' 시간을 일찍 앞당겨 소비 활성화에 도움이 되게 하자는 아이디어다. 오는 24일부터 시행되는 일본의 '프리미엄 프라이데이'를 본땄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다만 강제성이 없는 '캠페인'에 그친다는 점에서 기업들이 실제로 따라줄지는 의문이다. 이호승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민간 부문을 촉진하기 위해 여러 장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며 "일가정 양립 우수기업을 인증할 때 하나의 평가 요소로 삼는다거나 노사관계 안정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을 고민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퇴근 시간 이후로도 30분, 1시간 더 일 하는 것은 '애교'로 보는 인식이 팽배한데 월~목요일에 초과 근무를 했다고 금요일에 조기 퇴근시킬 유인으로 작용할지도 미지수라는 점이다. "이번주 금요일 조기퇴근하니 오늘은 야근 좀 하지?"라는 노골적 압박이 가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프리미엄 프라이데이가 기업의 방침으로 정해졌다고 하더라도 근로자들이 사무실 문을 박차고 나갈 수 있을지 여부는 또 다른 문제다. 현재도 많은 기업 및 기관들이 일주일에 하루 '가정의 날'을 정해놓고 정시퇴근을 유도하고 있지만 상사의 눈치를 보거나 남아있는 업무가 많아 허울 뿐인 구호에 그치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이다.
물리적으로 퇴근했더라도 각종 IT기기가 발달한 지금, 업무는 어디서고 연장될 수 있다. 기업이 일·가정 양립의 중요성을 크게 인식하지 못한다면 프리미엄 프라이데이와 같은 정부의 노력도 헛수고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
최근 회사가 서울에서 경기도 신도시로 이전돼 통근버스를 타고 출퇴근하는 직장인 이혜연(32·여)씨는 무조건 오후 6시에 '칼퇴'한다. 아직 회사 근처에 대중교통 노선이 갖춰지지 않아 통근버스를 놓치면 퇴근이 불가능해서다.
이씨는 "몸은 회사를 떠났지만 일이 남으면 노트북을 들고 퇴근해 집에서 업무를 다시 시작해야 할 때도 있다. 이에 대한 회사의 보상은 당연히 없다"고 말했다.
이씨는 "금요일 조기 퇴근이라는 정부의 시도는 획기적이지만 직장 문화가 바뀌어야 효용성이 발휘되는 아이디어"라며 "'금요일인데 일찍 퇴근해, 보고서는 월요일 출근 직후 올리고'라는 지시가 떨어지면 사실상 빨리 퇴근하지 말라는 것이나 다름 없다"고 꼬집었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