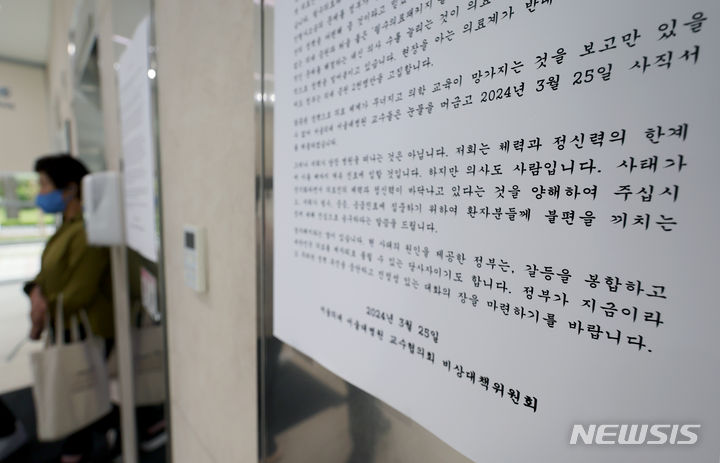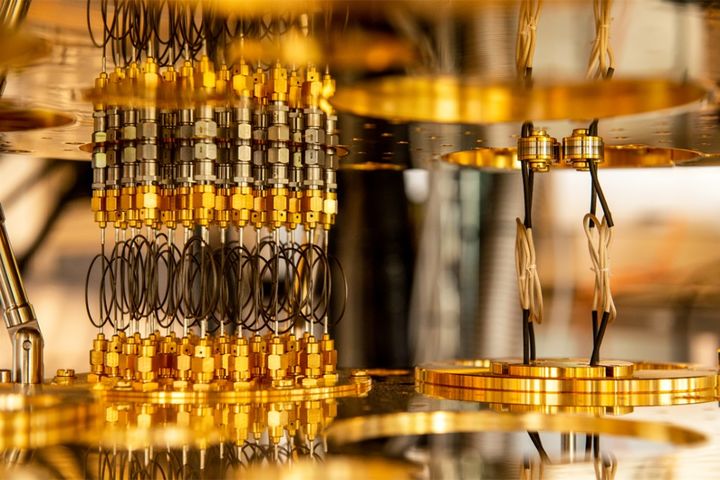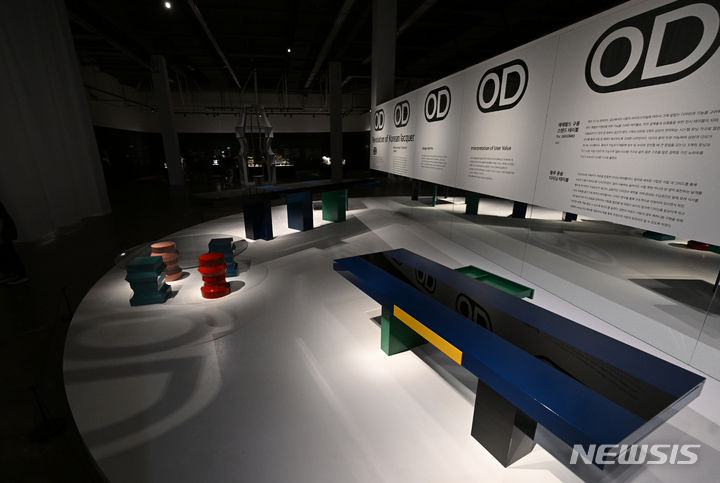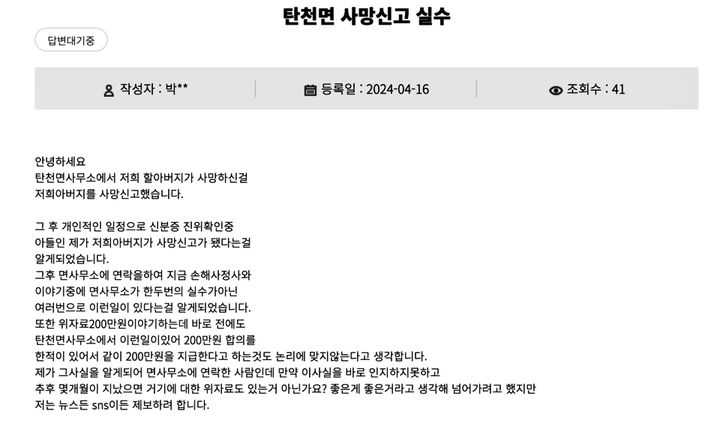[시집]장석주 '헤어진 사람의 품에 얼굴을 묻고 울었다'·이제니 '그리하여 흘려 쓴 것들'
![[시집]장석주 '헤어진 사람의 품에 얼굴을 묻고 울었다'·이제니 '그리하여 흘려 쓴 것들'](http://image.newsis.com/2019/01/08/NISI20190108_0000256504_web.jpg?rnd=20190108194445)
◇헤어진 사람의 품에 얼굴을 묻고 울었다
1979년 조선일보 신춘문예로 등단한 장석주의 시집이다.
'바람이 불어요. 황조롱이 알이 부화하고, 여자는 산고 끝에 귀 둘 달린 아이를 낳아요. 걸인이 어두운 시간을 끌며 지나가요. 추분에 어떤 연인은 헤어져요. 쾅. 쾅. 쾅. 바람이 덧문을 거칠게 여닫을 때 화산을 수십 년째 잠잠했어요. 당신의 기분은 침울하고, 그 기분은 전염됩니다. 오늘 당신은 여기에 없어요. 당신의 쇄골을 점자책 읽듯 더듬을 때 저녁이 오네요. 저녁에는 동물원을 서성거렸어요. 채식주의 생활이 끝나지 않았으므로 나는 슬프지 않았습니다.'('바람의 혼례' 중)
'불우로 밥을 먹고/ 불행을 간식으로 삼켰으니,/ 우리는 불우와 불행의 공모자거나/ 침묵이 낳은 물음이다./ 침묵은 사전에 등재되지 않은 어휘다.// 아침은 저녁이 되고/ 별이 내려와 협죽도가 피고/ 찰나는 영원의 가장자리에서만 붐빈다./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것을 상상하고/ 갈 수 없는 데까지 가보려고 한다'('베를린의 한낮' 중)
장 시인은 "이번 시집은 작다"며 "작아지려고 탕약처럼 뭉근한 불로 오래 졸였다"고 전했다. "작은 슬픔으로 큰 슬픔에 닿기 위하여 애썼다. 덕분에 내 상상력은 뿔냉이나 엽낭게의 감정노동만큼 조촐해졌다. 작음은 이번 시집에서 내세울 단 하나의 자랑거리다. 더 작아지지 못한 건 흠이다. 더 작아져서 큰 실패에 닿지 못했음을 후회할 거다." 148쪽, 1만원, 문학동네
![[시집]장석주 '헤어진 사람의 품에 얼굴을 묻고 울었다'·이제니 '그리하여 흘려 쓴 것들'](http://image.newsis.com/2019/01/08/NISI20190108_0000256497_web.jpg?rnd=20190108194445)
2008년 경향신문 신춘문예에 '페루'가 당선돼 등단한 이제니의 시집이다.
'돌을 만지는 심정으로 당신을 만진다. 가지 하나조차도 제 그림자를 벗어나지 못하는 한낮이다. 두 팔 벌려서 있는 나뭇가지를 보았습니다. 당신은 곳곳에 서 있었습니다. 사라지는 것은 사라지는 것으로 사라지지 않는다. 길가 작은 웅덩이 위로 몇 줄의 기름띠가 흐르고 있었다. 몇 줄의 기름띠 위로 작은 무지개가 흐르고 있었다. 한 방울 두 발울 번지고 있었다'('돌을 만지는 심정으로 당신을 만지고' 중)
'그것은 조용히 나아가는 구름이었다. 찬바람 불어오는 골목골목을 꼬리에 꼬리를 물고 사라지는 그림자였다. 구름에도 바닥이 있다는 듯이. 골목에도 숨결이 있다는 듯이. 흔적이 도드라지는 길 위에서. 눈물이 두드러지는 마음으로'('고양이의 길' 중)
이 시인은 "이제 나는 깊은 밤 혼자 무연히 울 수 있게 되었는데 나를 울게 하는 것은 누구의 얼굴도 아니다"고 한다. "오로지 달빛 다시 태어나는 빛 그것이 오래오래 거기 있었다. 발견해주기만을 기다리면서 홀로 오래오래 거기 있었다." 189쪽, 9000원, 문학과지성사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