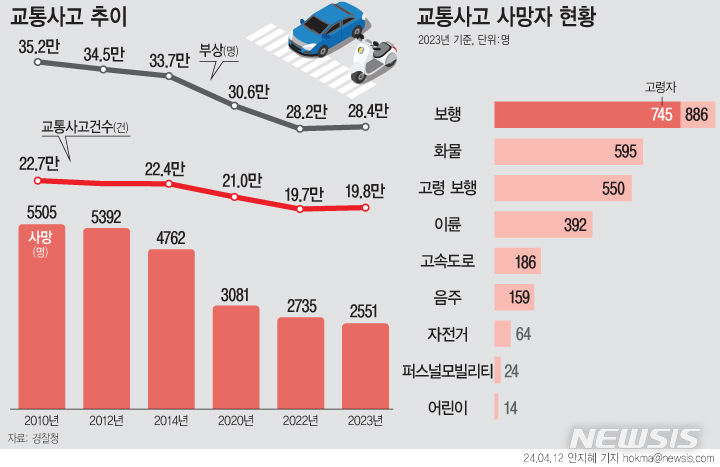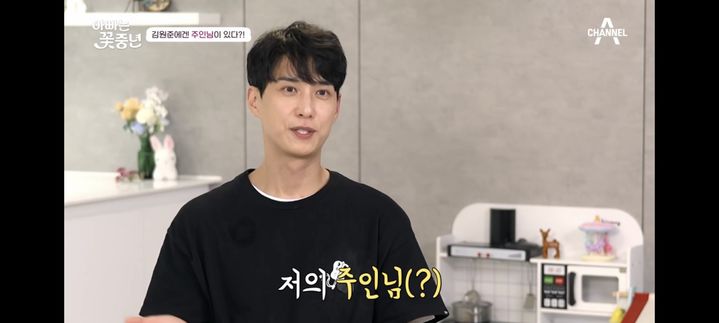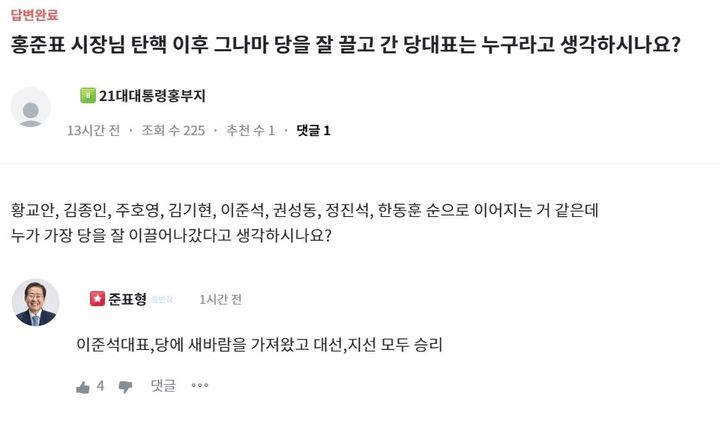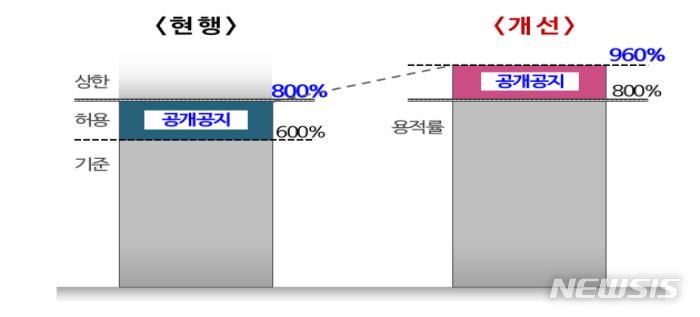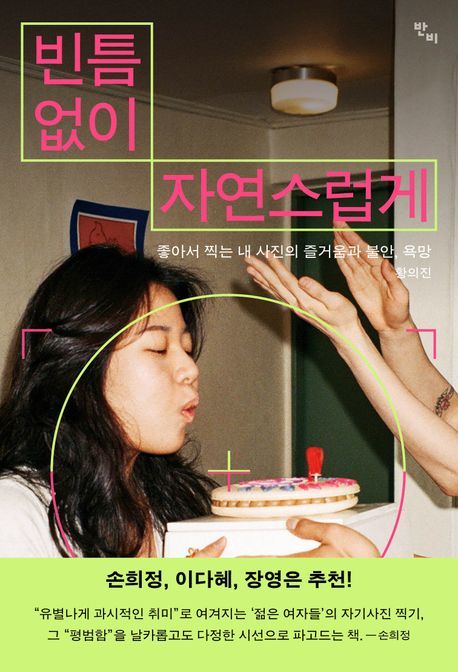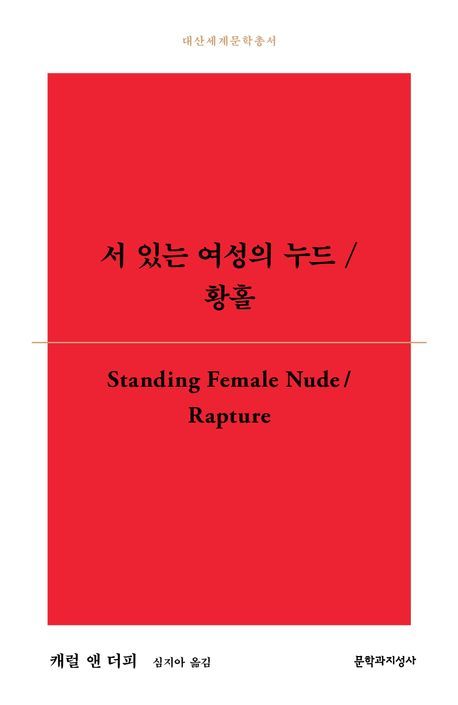日징용소송 2심도 1억 배상 판결…피해자 모두 별세(종합)
1심 이어 2심도 1억원 지급 판결
"원고들 강제 연행…조직적 기망"
마지막 생존자는 지난 2월 사망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법률대리인인 임재성 법무법인 해마루 변호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일본 신일철주금 상대 손해배상 2심 선고를 마친 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신일철주금 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해자들에게 1억원씩 총 7억원을 지급하라며 원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2019.06.26. [email protected]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판사 김용빈)는 26일 강제동원 피해자 곽모 할머니 유족 등 7명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일본제철은 1인당 1억원씩 지급해야 한다.
재판부는 신일철주금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지난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과 같은 취지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일본제철은 중일전쟁과 태평양전쟁 등 불법적 침략전쟁의 수행과정에서 일본 정부의 인력 동원 정책에 적극 협조, 강제적인 수단과 협박을 사용해 일부 원고들을 강제 연행했다"며 "일본 정부와 일본제철이 이들에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식의 거짓말을 해 회유한 것은 조직적인 기망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또 "이들은 일본인에 비해 부당하게 낮은 월급을 받았고 그마저도 고향 송금, 저금 등의 이유로 받지 못했다"며 "제공된 음식도 부실해 주변 밭의 농작물을 훔쳐 먹고 외출을 제한당하고 도망이 불가능한 생활을 했다"고 봤다.
한일 청구권 협정 때문에 개인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에서 일본이 10년간 3억 달러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2억 달러의 차관을 행하는 합의가 있었지만 액수의 명목이 무엇인지에 대한 명백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또 청구권협정에는 개인청구권의 소멸에 관해 한일 양국 정부의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볼 충분한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위자료 액수는 1심과 같이 1인당 1억원으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장기간의 세월이 경과해 우리나라의 물가와 국민소득수준이 크게 상승했기 때문에 1억으로 보는 게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곽 할머니 등은 지난 1942~1945년 일본제철의 가마이시·야하타 제철소에서 근무했다. 이들은 동원 당시 나이 17~27세로 열악한 환경에서 약속보다 적은 임금을 받은 데 따른 책임을 지라며 지난 2013년 3월 소송을 냈다.
원고들은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사망했고 마지막 생존자였던 이모 할아버지도 지난 2월15일 세상을 떠났다. 이 사건 대리인단은 이날 선고 직후 "판결 선고 전에 가슴이 아팠던 게 2월15일 그때가 신일철주금에 3차 방문을 해서 협상을 요구했던 시점"이라며 "그날 바로 이 할아버지가 유일하게 생존하셨다가 돌아가셨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미 대법원 판결이 있음에도 항소심이 3년7개월 가까이 이유도 없이 늘어졌고, 늘어지지 않았으면 생존 상태에서 젊은 날 피해에 대해 뒤늦게나마 만족해하면서 여생을 살지 않았을까 (싶다)"며 "일본제철이 기업 책임을 다한다는 자세가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유감"이라고 말했다.
한편 신일철주금은 지난 4월1일 과거에 사용하던 일본제철으로 사명을 변경했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