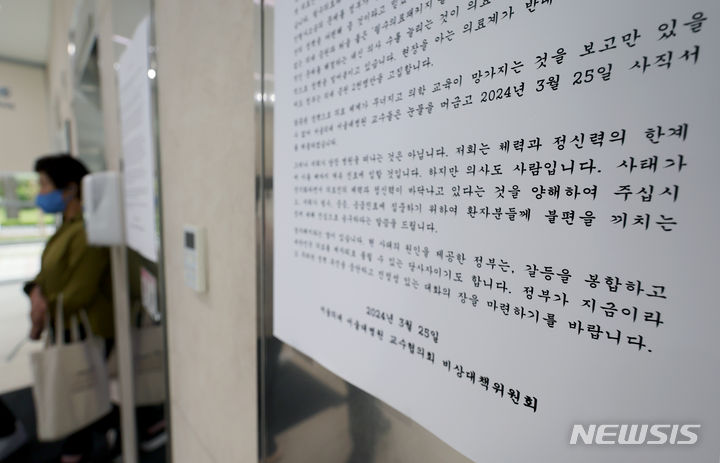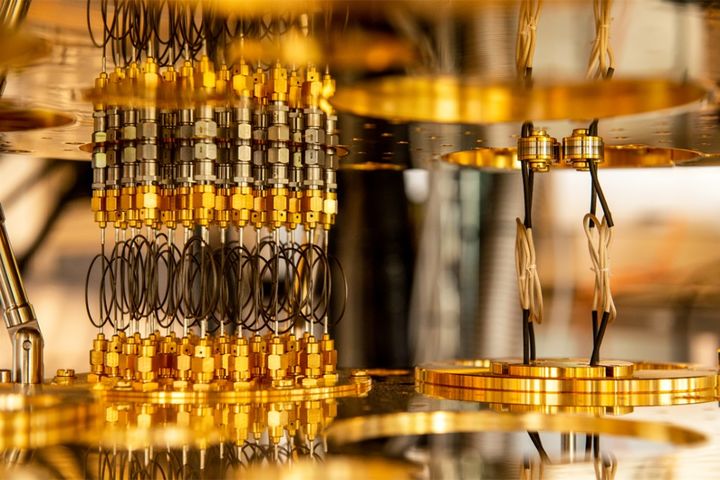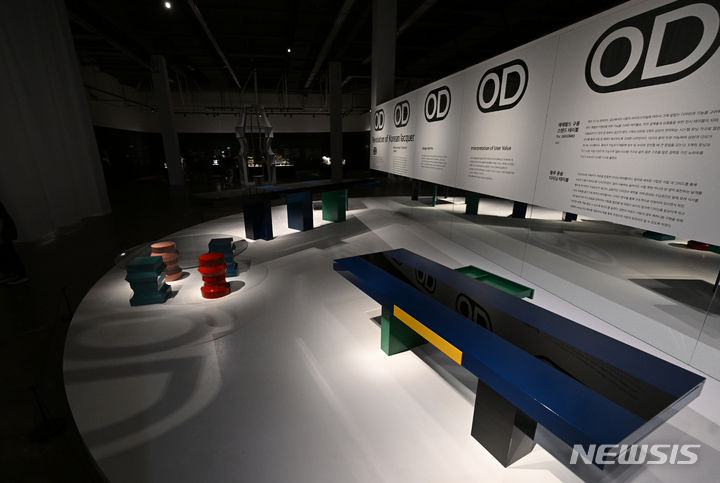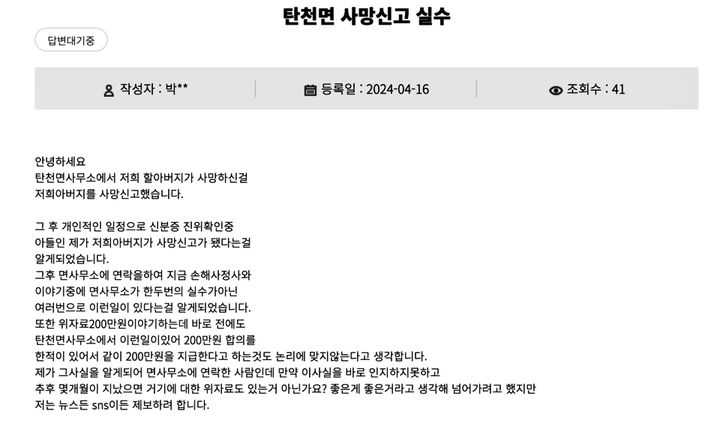[리뷰]겨울에 봄꽃향기가···'목련 아래의 디오니소스'
![[서울=뉴시스] 연극 '목련 아래의 디오니소스'. (사진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제공) 2019.12.24. realpaper7@newsis.com](http://image.newsis.com/2019/12/24/NISI20191224_0000451949_web.jpg?rnd=20191224083445)
[서울=뉴시스] 연극 '목련 아래의 디오니소스'. (사진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제공) 2019.12.24. [email protected]
술집을 겸하는 카페 '디오니소스'가 배경. 이 카페 대표는 젊은 연극 배우다. '술의 신'이자 '연극의 신'인 '디오니소스'에서 따온 소스를 예명으로 사용하고 있다. 소스와 그를 돕는 알바생이자 희곡 작가인 '피스'는 10분짜리 연극을 카페에서 선보이려 한다.
하지만 두 사람은 저마다 상처를 지니고 있다. 소스는 출생을 알 수 없다는 근원적 고통에 시달린다. 피스는 신춘문예에 번번이 떨어지며 시상이 부족한 자신에 대해 한탄한다. 실타래의 '아리아드네', 추락의 '이카루스'를 상징하는 인물들도 카페를 찾아 불쑥불쑥 자신의 상처를 드러낸다.
소스의 양부(養父)의 등장으로 극적 긴장감이 더욱 높아진다. 사실 그는 디오니소스의 양부인 '실레노스'와 같은 존재다. 소스와 노스는 어릴 적 기억을 공유 또는 외면하며 대립한다.
그러던 중 그리스 비극이 탄생한 '디오니소스 극장'에서처럼 이곳 카페 디오니소스에서도 신화에서 모티브를 얻은 비극이 공연된다. 하지만 몇 되지 않는 관객은 극에 집중하지 못한다. 연극을 보던 중 실랑이가 벌어진다. 그러던 중 실제 자신만의 비극이 눈꽃처럼 터져 나온다.
이들은 추운 겨울을 잘 견뎌냈을까. 상처가 다 아물지 않아도, 이들은 다시 일어선다. 아직 꽃샘추위가 남아 있지만 막 봄이 시작된 극 중에서 3층에 위치한 카페 창문을 열자 목련 꽃 내음이 풍겨진다.
겨울이 끝나고 봄에 열린 '디오니소스 축제'처럼, 우리 일상에도 새봄은 온다. 작품은 마지막에 따듯한 기운이 뭉근하게 배어 나온다. 덕분에 12월 끝자락에도 온기가 감돈다. 따사로운 햇살이 귀하다는 걸 알게 해준다.
결국 '목련 아래의 디오니소스'는 연극에 대한 연극인 '메타연극'이 우리 삶의 은유가 될 수 있음을 상기시켜준다. 쇼적인 연극이 난무하는 사이에서, 은유와 상징을 통해 인생을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는 연극을 만났다.
무엇보다 신화가 우리와 먼 이야기가 아니라, 삶의 근원과 맞물려있다는 것을 증명한다. 그래, 이것이 연극의 채도였다. 피스가 그리스 신화에서 누구를 은유하는지 밝혀지는 마지막 장면에서 그런 부분이 더욱 도드라진다.
실레노스 역의 명계남은 능청스런 연기와 함께 존재만으로도 무게감을 안겨준다. 익살도 성찰로 승화하는 것이 그의 연기 스타일이다. 양동탁, 박희은, 서정식, 노준영 등 다른 출연 배우들의 안정감 있는 연기도 돋보인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최하는 '2019 창작산실 올해의 신작'을 통해 선보이는 작품 중 하나다. 내년 1월12일까지 대학로 아르코예술극장 소극장.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