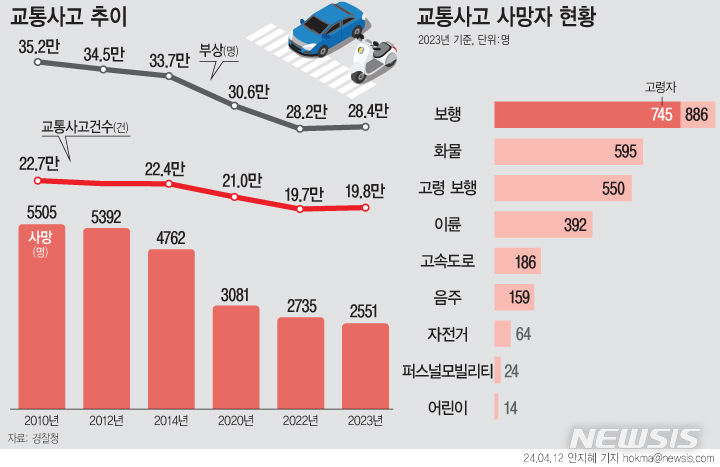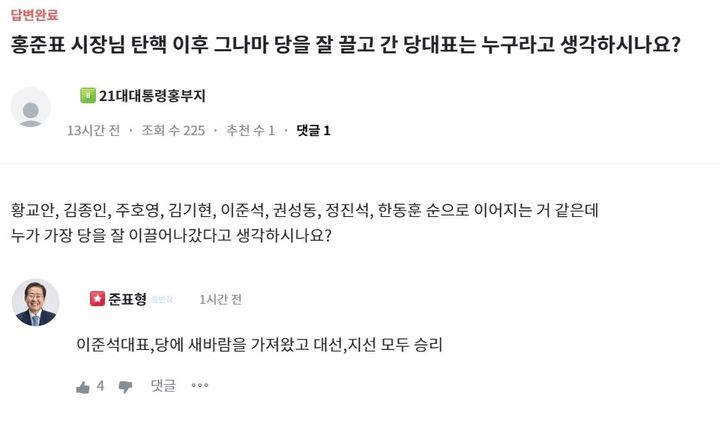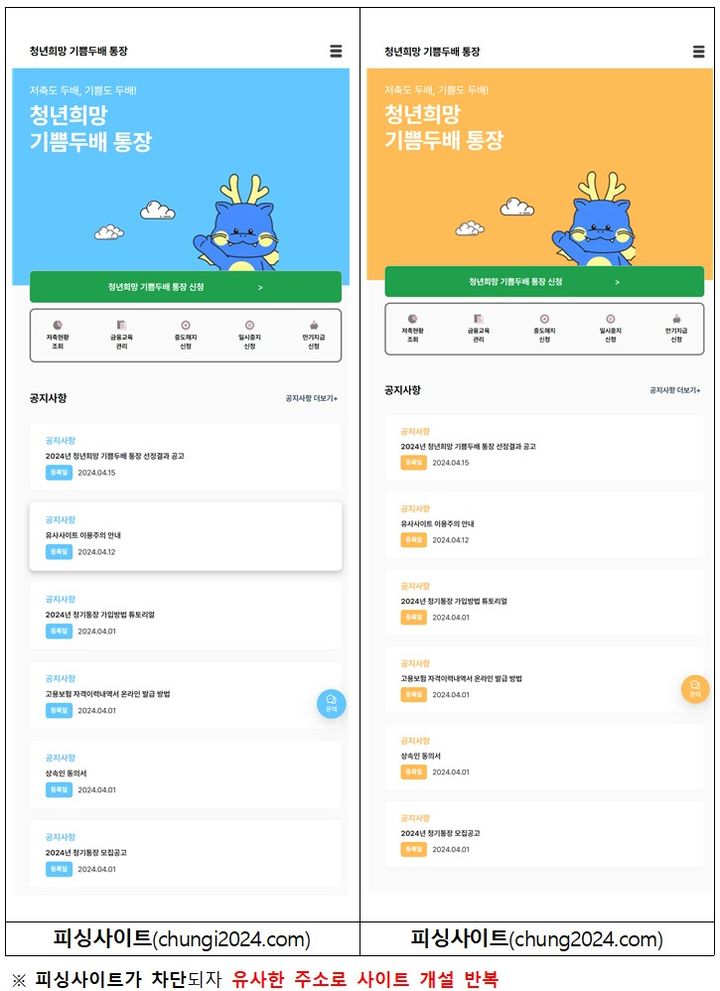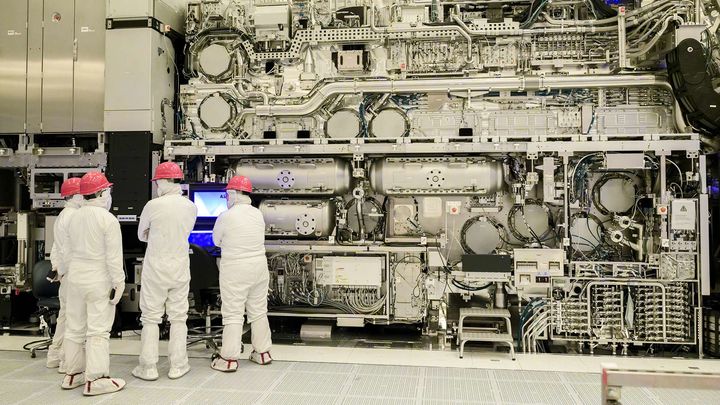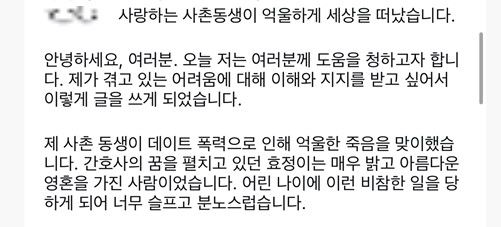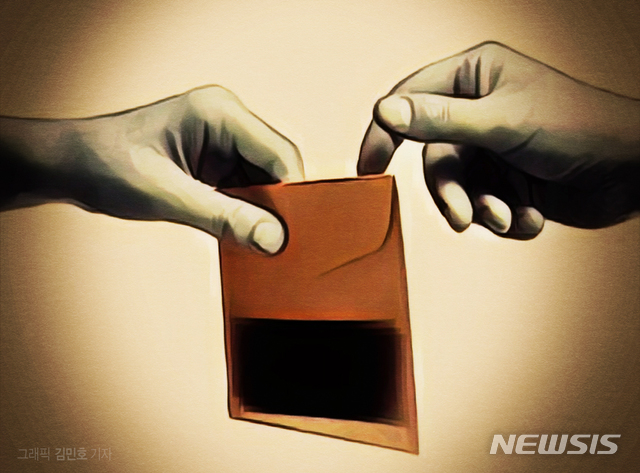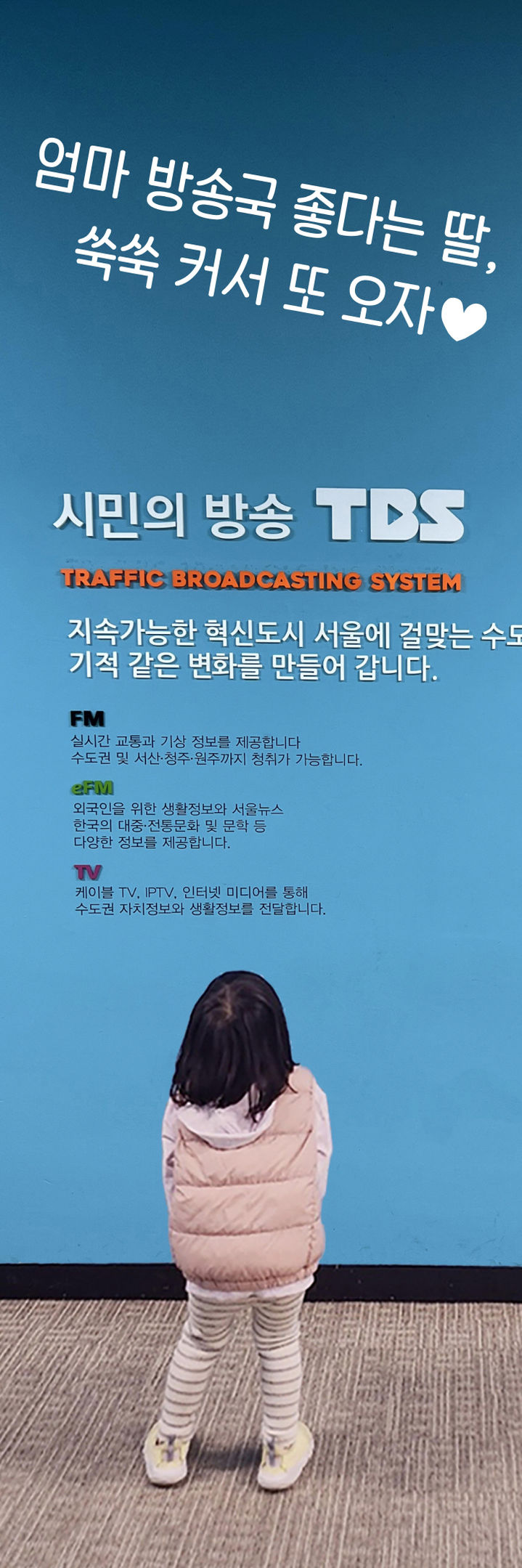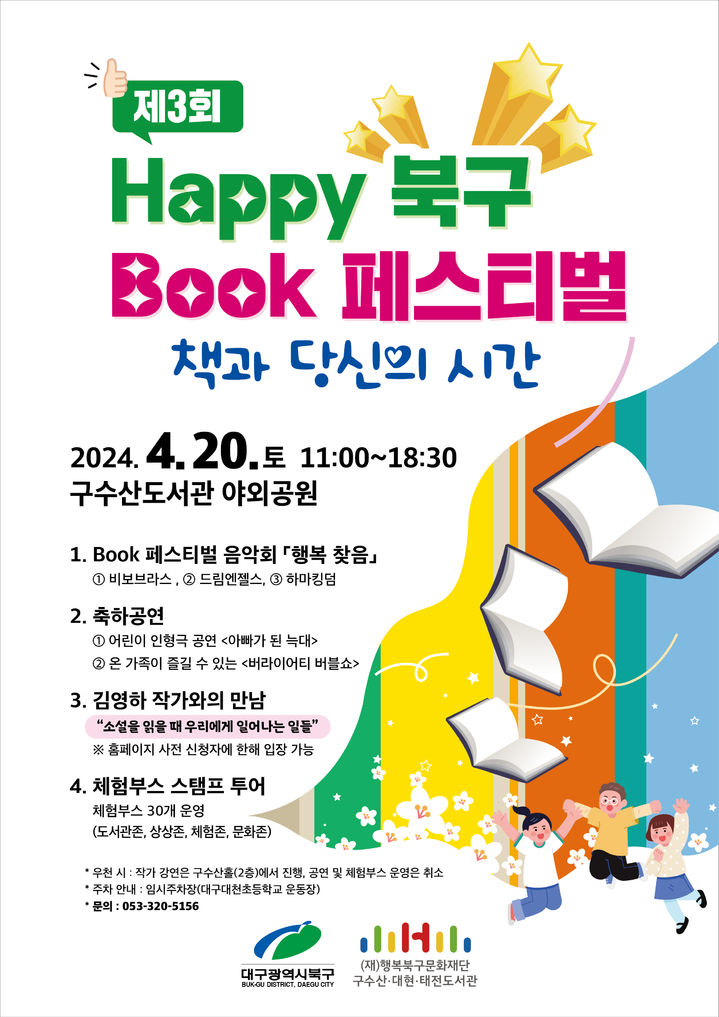[조연희의 타로 에세이]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진동…20번 ‘심판’ 카드

타로 20번 ‘심판’ 카드. (사진=조연희 작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아버지가 임종하실 것 같다는 전화를 받고 병원에 달려갔다. 혼비백산해서 달려온 우리에게 간병인은 이 상태로 며칠 갈 수도 있다고 귀띔해주었다. 그제야 우리는 안심했다. 산소마스크를 쓴 채 눈을 감고 있는 아버지 옆에서 작은 아버지는 죽을 고비를 넘긴 작은 어머니의 안부를 전해주었다. 행여 장례식 동안 친척 어른들을 모시는데 소홀할까봐 몇 가지 당부를 하시기도 했다.
죽음이 임박한 환자는 일반 병동에서 임종실로 옮긴다. 편안한 분위기에서 임종을 맞을 수 있도록 은은한 조명에 화초도 놓여 있고 가족을 위해 편안한 소파도 구비돼 있었다.
그런 분위기 탓인지 긴장된 마음이 조금 풀어진 듯했다. 오랜만에 만난 언니에게 난 하소연하듯 이 얘기 저 얘기를 털어놓았다. 계약이 깨졌노라는 얘기. 은행 이자가 얼마 나간다는 얘기 등등. 언니가 안타까운 표정을 지을 때마다 난 우군을 만난 양 목소리가 조금 고조되기도 했던 것 같다.
어느새 장례식 준비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다. 오빠는 사망신고서가 있어야 호국원에 모실 수 있다고 했고 언니와 난 빈소 크기는 어느 정도로 할지, 음식은 몇 인분을 주문해야 할지 등에 대해서도 얘기를 나누었다. 상조회에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손수 챙겨야 할 것이 많을 듯했다.
그날, 아버지는 임종하시지 않았다. 다음날 언니와 내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오빠만 지켜보는 가운데 임종을 하셨다.
보는 것을 들어라
인간은 정보의 80%를 시각에 의지한다고 하는 데 여기서는 오히려 정보를 외면한 채 오직 소리에 집중하고 있는 듯했다. 온몸으로 소리를 느끼는 듯했다.
문득 헬렌 켈러의 말이 떠올랐다 그녀는 소리를 들을 수 없는 것과 눈이 보이지 않는 것 중 소리를 들을 수 없는 것이 더 괴로울 것 같다고 했다. 볼 수 없는 것은 그저 사물과 자신을 떼어놓을 뿐이지만 들을 수 없는 것은 다른 사람과 떼어놓기 때문이기 때문이란다.
소리란 진동이 아니던가. 듣는다는 것은 소리에 진동하는 것이고, 진동하는 것은 곧 공명하는 것이다. 그리고 공명해야 비로소 감응할 수 있다. 내 몸이 텅 빈 항아리처럼 공명하는 것. 네 숨소리, 네 울음에 같이 진동하는 것. 눈으로 듣고 소리로 보는 것. 그것이 어쩌면 궁극적인 깨달음의 경지일지 모른다.
어떤 타로리스트는 이 카드를 ‘부름(calling)’과 ‘다시 태어남(reborn)’의 이중 구조로 되어 있다고 설명한다. 나를 지목해서 미션을 맡기기 위한 부름이라는 것이다. 이 카드는 제목처럼 기다림, 평가라는 심판의 뜻도 담고 있지만 깨달음, 새로운 기회라는 뜻도 있다. 노력한 만큼 반드시 보답을 받을 것이므로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 준비하라는 뜻도 있다.
마지막으로 청각이 닫히는 이유
그것도 모르고 아버지의 숨이 파도치던 그 밤 온 내 지껄여댔다. 온갖 세상살이에 대한 근심과 걱정을 토로했다. 내 입을 틀어막을 수 없었던 그날 혹시 아버진 내 소음 때문에 지겨운 하루를 더 살아야 했던 것은 아닐까. 시끄러운 우리의 소음이 아버지를 하루 더 이승에 붙들어 맨 것은 아닐까.
그러고 보니 우리는 울면서 태어나 가족들의 울음소리를 들으며 세상을 떠난다. 울음이야 말로 삶의 시작과 끝을 알리는 징소리였다. 울음이야 말로 가장 아름다운 진동이고 가장 뜨거운 공명이며 감응일 수 있기에 말이다.
그런데 그날 난 왜 울지 못했을까. 평소 소원했던 것만큼 더 큰 화해의 반향이 될 수도 있었을 텐데. 적어도 그날 난 아버지의 마지막 숨소리, 그 떨림에 집중했어야 했다. 적어도 귀 속에 대고 조용히 말했어야 했다. 아버지 고생 많으셨다고, 걱정 마시고 편히 가시라고.
▲조연희 '야매 미장원에서' 시인 [email protected]
※이 글은 점술학에서 사용하는 타로 해석법과 다를 수 있으며,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