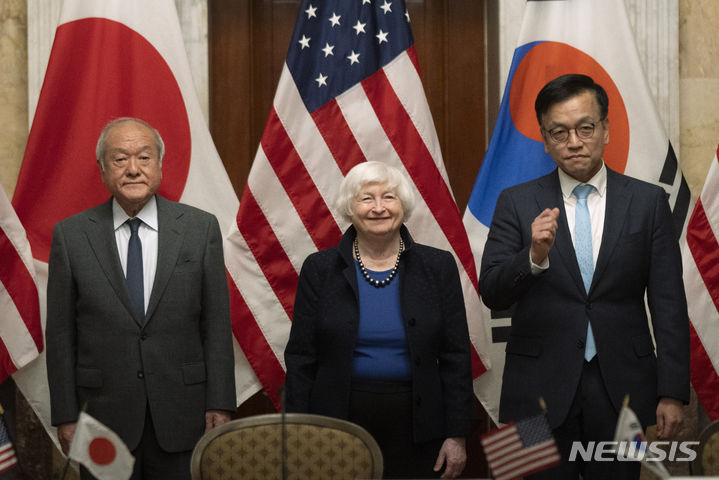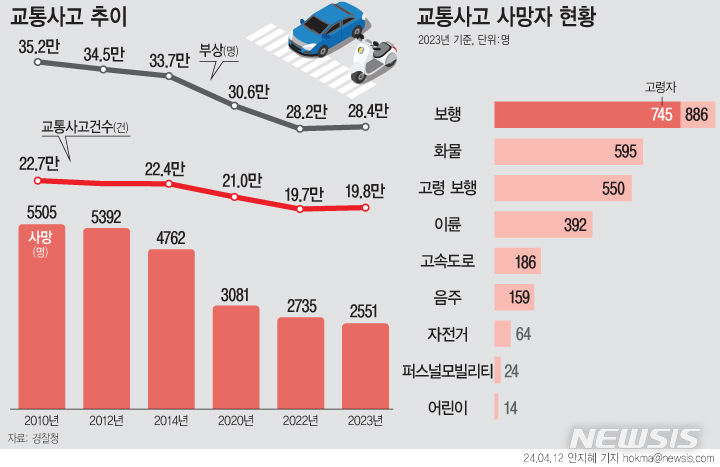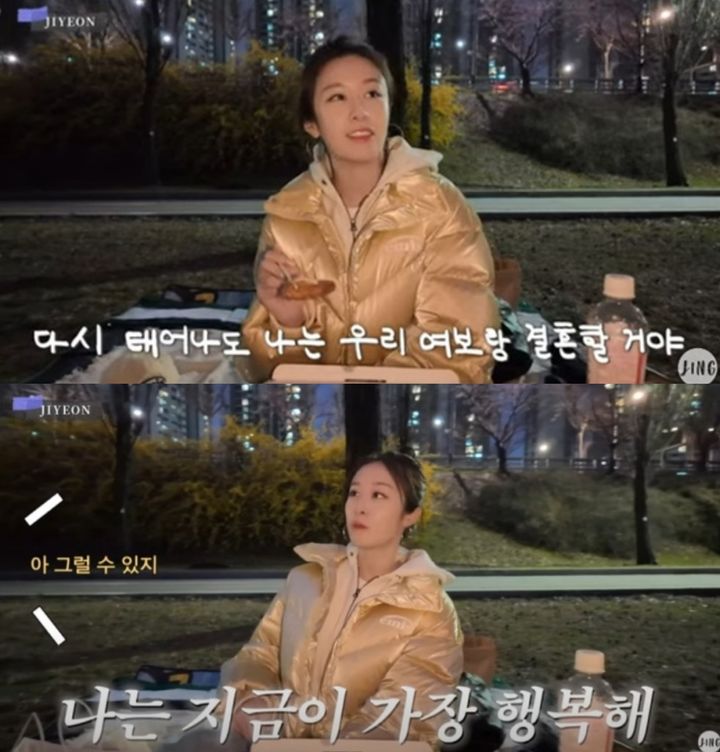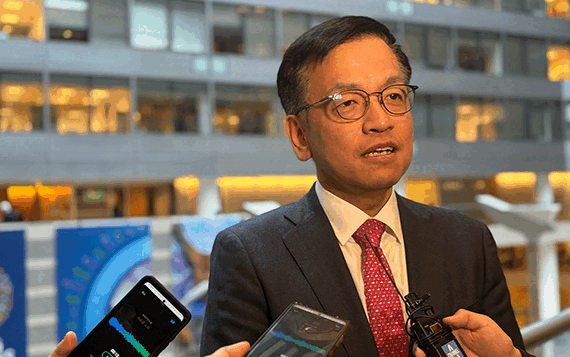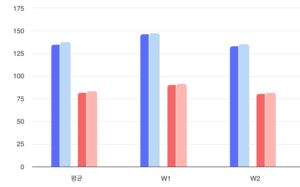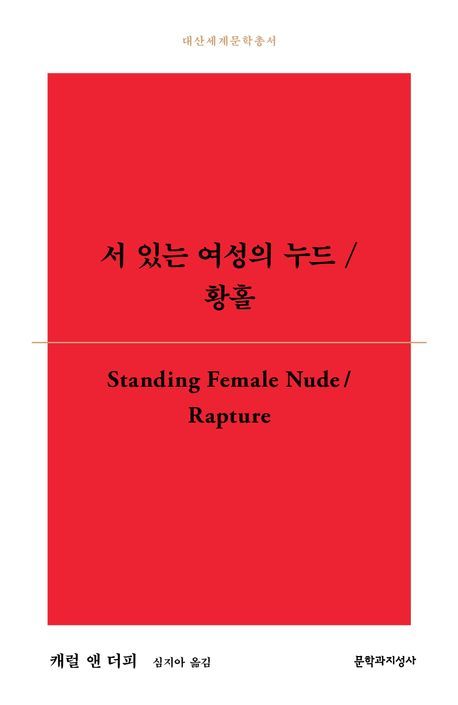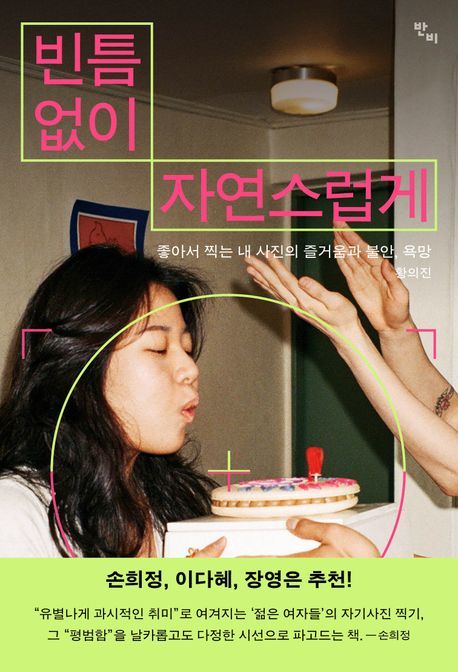[데스크 창]신경숙의 사과, 한 번으로 끝나길

지난 16일 이응준 시인이 신 작가의 표절을 폭로했다는 뉴스를 본 순간 첫 반응은 ‘설마, 그럴 리가’였다. 해리포터 시리즈를 쓴 조엔 K. 롤링처럼 크게 성공한 소설가에게 으레 따라붙는 표절시비려니 여겼다. 그래도 ‘혹시, 몰라’ 하는 마음으로 이 시인이 허핑턴포스트 코리아에 게재한 글을 읽어 봤다. 죽 훑어보고 나니 신 작가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고, 한 번 더 읽어보니 의혹이 비온 뒤 독버섯처럼 자라났다.
‘천황폐하 만세’를 외치며 할복자살한 일본 극우파 작가 미시마 유키오의 ‘우국’을 표절했다는 주장이었다. 게다가 표절논란의 한복판엔 번역자 김후란의 ’기쁨을 아는 몸’이란 문학적으로 빼어난 형용이 자리 잡고 있다. 한 평론가는 ‘기쁨을 아는 몸’이란 표현이 우연히 번역자와 신 작가의 머릿속에 독자적으로 떠오를 가능성은 ‘집 앞의 바위에 벼락이 떨어졌는데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이 조각될 확률’이라고 조롱했다.
‘모든 게 무너진다’는 한 재난영화의 홍보문구가 떠올랐다.
핍진한 생활을 도덕적 순수성으로 버텨내며 이슬만 먹고도 사는 줄 알았던 동네에서 해괴한 표절 스캔들이라니! 메르스 앞에 방역 시스템 무너지듯 문단에 대한 믿음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다.
난데없이 영화나 다큐에서 본 이름 모를 도공이 떠올랐다. 연기가 몽글몽글 피어오르는 식은 가마 옆에 도공이 앉아 있다. 굵은 주름이 팬 이마엔 땀방울이 포도송이처럼 맺혔고 제멋대로 자란 턱 수염엔 말라붙은 막걸리 찌꺼기가 덕지덕지 붙어 있다. 늙은 도공이 예리한 눈을 가늘게 뜨고 막 구워낸 도자기를 요리조리 돌려가며 뚫어지게 들여다보고 있다. 가슴이 오그라들 것처럼 조마조마하다. 아니나 다를까 도공은 장도리를 들어 가차 없이 백자를 박살낸다.
안타까운 전율이 온 몸에 퍼진다. 범인(凡人)이 보기엔 완벽하게 아름다운 백자를 저렇게 산산조각 내다니, 잔인한 일이다.
내가 아는 예술혼은 그렇게 남이 아닌 스스로에게 잔인한 것이었다. 돋보기를 대고 들여다봐야 드러날까 말까 하는 미세한 흠, 장인이 아니면 볼 수도 느낄 수도 없는 티, 그런 걸 걸러내는 지독한 장인정신이 누구도 흉내 낼 수 없이 우수한 고려청자, 조선백자를 만들어 낸 것이다.
신 작가는 23일자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표절이란 문제 제기를 하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밝히고 독자들에게 사과했다. "'우국'을 읽은 기억은 나지 않지만, 이제는 나도 내 기억을 믿을 수 없는 상황" 이라고 덧붙였다.
우국을 읽었고 그 기억의 잔상으로 표절에 가까운 문장들을 썼을 가능성을 열어뒀지만 여전히 기억은 나지 않는다는 뜻일 게다.
좀더 빨리, 좀더 직설적으로 사과하지 않은 게 아쉽지만 그나마 다행이다. 신 작가는 표적이 됐던 소설 '전설'을 작품집에서 들어내고 문학상 심사위원을 비롯해 모든 것을 내려놓겠다고 밝혔다.
이 사과와 개인적인 조치들로 '표절 스캔들'이 진정될 지는 의문이다. 문단과 출판계의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응준 시인은 뉴시스와의 인터뷰에서 표절문제는 문단에서 ‘알 만한 사람은 다 아는 일’이라고 밝혔다. 거대 출판사와 비평가, 인기 작가가 삼각 동맹으로 침묵의 카르텔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다. 이 문학권력이 작가, 평론가, 군소 출판사들의 입을 틀어막고 억압해 해묵은 표절문제가 공론화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현택수 한국사회문제연구원장이 이 표절사태를 검찰에 고발했다. 양식과 양심, 문학의 법정에서 다룰 사안을 법관에게 위임하는 건 부적절하다. 풀 수 없는 매듭을 3자에게 떠넘기면 칼로 자르려고 들 것이고 그러면 상처는 더 깊어진다.
입 다문 작가, 목소리를 잃은 평론가 앞에 망연자실했던 독자들은 ‘찝찝함, 배신감, 울분을 아는 몸’이 됐다. 한 명의 독자 입장에서 신 작가의 사과가 이번 한 번으로 끝날 수 있기를 바란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