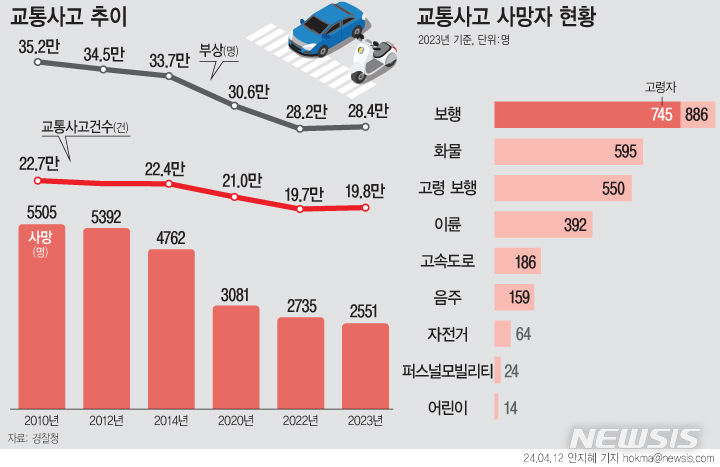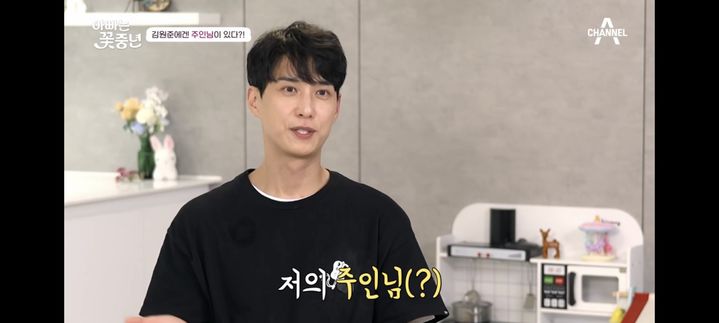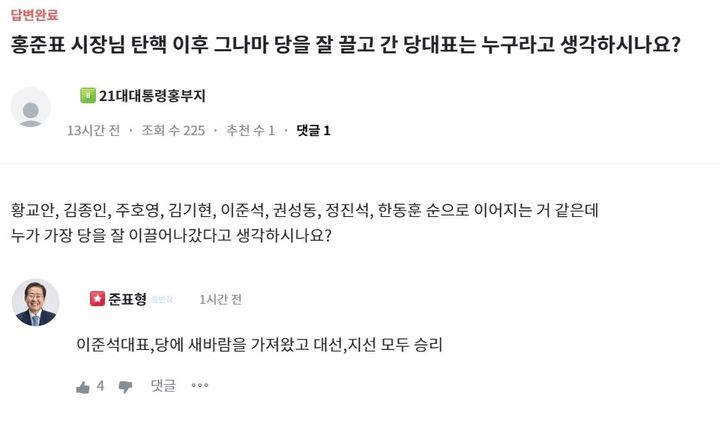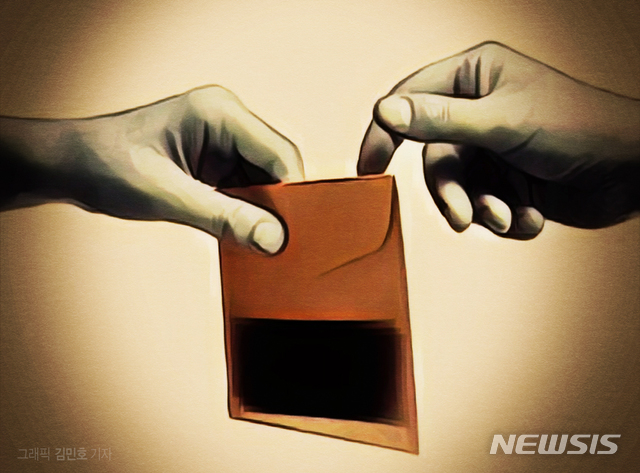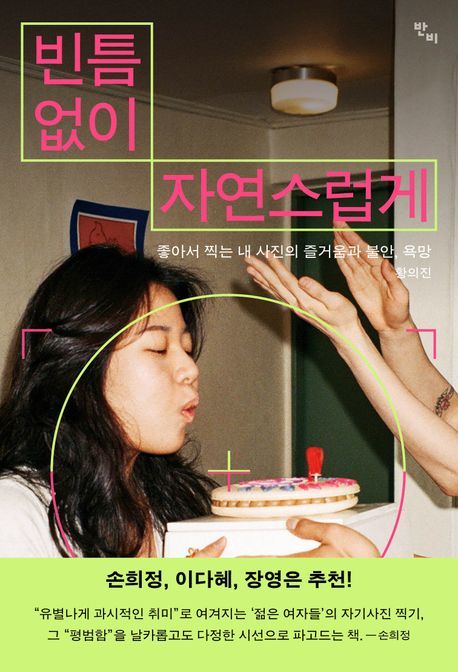[기자수첩]노숙인 이동목욕탕 더 늘려야

말로는 '특종이 탐난다면 하수구도 뒤져야 한다'지만 노숙인 취재는 참 쉽지 않다.
가장 어려운 것은 냄새.
개개인의 인생역정이나 사연을 듣는 것은 조금 더 다가가고, 조금 더 기다리면 된다. 하지만 그들의 몸과 옷에서 나는 퀴퀴한, 말로 표현하기 힘겨운, 코를 끝없이 자극하는 냄새는 참 극복하기 어려운 과제다.
처지를 뻔히 알면서도 자신도 모르게 턱의 각도를 꺾는다. 얼굴은 웃음을 지으려고 하지만 코끝은 그렇지 않다.
고백하자면 기자 개인으로선 냄새만큼은 참 극복하기 쉽지 않다.
노숙인들은 생각보다 민감하다. 사랑하는 사람의 눈길만 달라져도 금방 초라해지는 연인처럼 자신을 향한 혐오의 징후를 느끼면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다.
폭염이 기승을 부리던 지난 10일 낮 영등포역 인근 이동목욕탕. 영등포구가 운영중인 '노숙인을 위한 목욕탕'이다.
수건을 들고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는 노숙인들의 얼굴에 땀이 비오듯했다. 냄새에 민감한 기자는 여전히 본능적으로 고개를 살짝 돌렸다. 참 어쩔 수 없었다.
2명씩 이동목욕탕으로 들어갔다. 쪽문이 닫히면 곧바로 물 끼얹는 소리가 창문 밖으로 새어나왔다. 간간이 물장난 치는 소리가 났다. 목욕을 마친 이들이 한명씩 계단을 걸어내려왔다. 수건으로 머리카락을 털어냈다.
향긋한 샴푸 냄새가 났다. 영등포구청에서 마련해준 속옷에 새 옷까지 차려입자 노숙의 냄새는 저 멀리 사라졌다.
2.5t짜리 탑차를 해수욕장 샤워실로 개조한 이 작은 공간에서 지난해에만 3000여명이 몸을 씻었단다. 노숙인은 물론 쪽방촌 거주민, 일용직 노동자들도 이곳을 찾는단다.
목욕을 마친 노숙인 이모(41)씨는 "전에는 옆에 다가가면 사람들이 인상부터 찡그렸다. 우리도 그렇다. 노숙인들도 서로 냄새나는 것을 싫어한다. 목욕을 하고나면 그런 일이 없다"고 말했다.
더 많은 이동목욕차가 생겼으면 한다. 노숙인과 한뼘 더 가까워지는 세상을 꿈꾼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