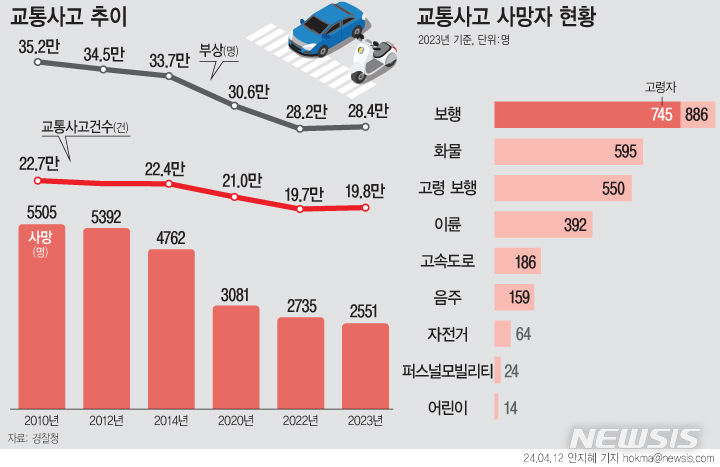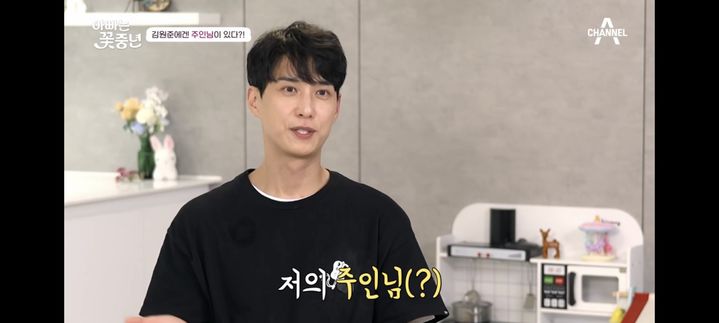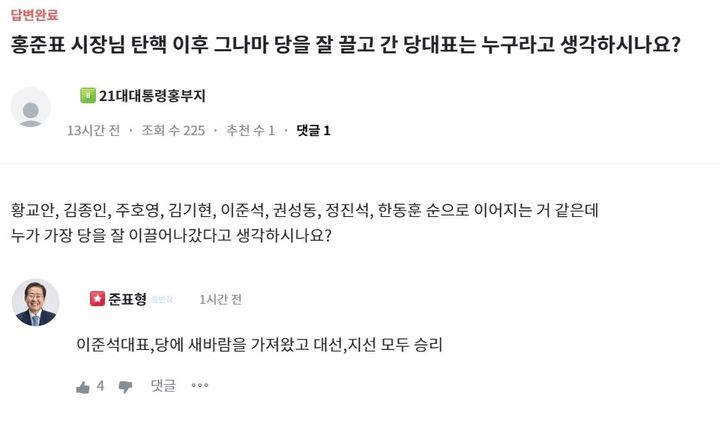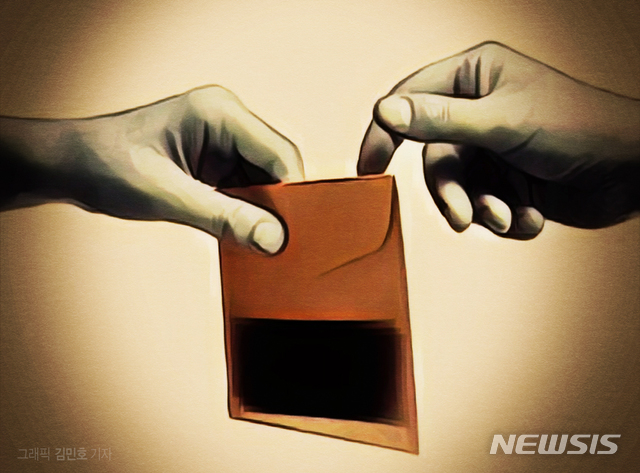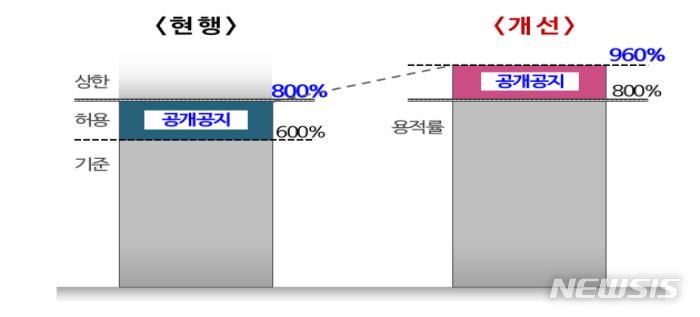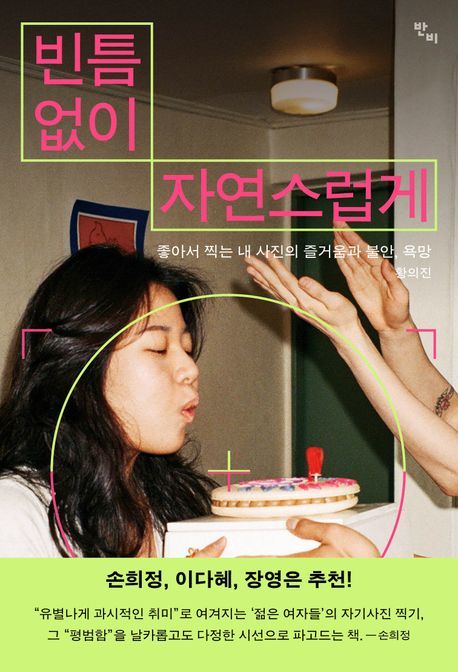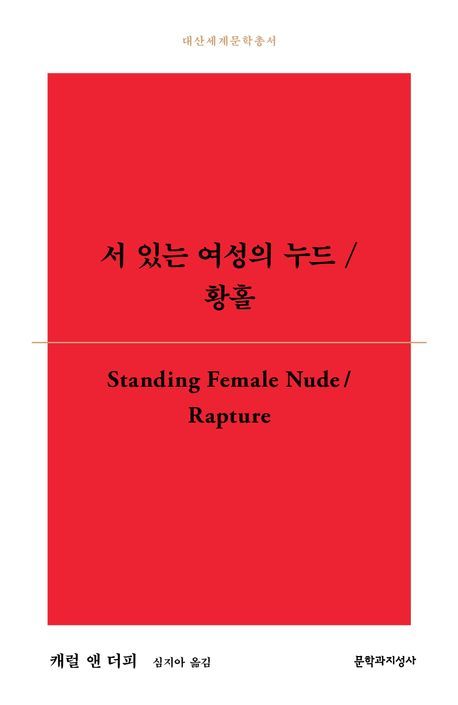[기자수첩] '故박종철 열사'… 30년만에 펼친 취재수첩

스무 한 살의 귀염둥이 ‘땡철’(박종철의 애칭)이의 혼을 "아부지는 아무 할 말이 없대이"라며 임진강에 흘려 보낸 고 박종철 열사의 아버지 박정기씨를 30년만에 지난 14일 다시 만났다.
이날 부산 서면 소민아트센터에서 열린 고(故) 박종철 열사 30주기 추모식에서 뵌 그는 올해 아흔 살의 세월보다 더 무거운 멍에를 짊어진 탓에 등이 많이 굽어서 혼자 서있기도 힘들 정도로 쇠약해 보였다.
당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취재과정에서 처음 만난 그는 부산시 수도국 시설 공무원 신분 때문에 경찰의 고문으로 아들이 숨진 충격적인 상황에서도 울분을 삭인채 취재기자에게 마저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긴장하며 꼿꼿한 자세로 가족들을 다독이던 모습이 떠 올라 울컥했다.
당시 대학생이던 종철씨의 누이 박은숙(55)씨는 딸과 함께 추모식에 참석했다.
30년전 1987년 1월 15일 오전.
당시 중앙일보 기자로 근무하던 나는 부산경찰청 기자실에서 본사 데스크로부터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서울대학생의 죽음’을 통보받고 사실 확인 취재에 돌입했다.
공안사건 수사 중 발생한 사망사건은 반드시 사망자의 신원 확인(사찰)부터 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적중했다.
곧바로 시청 당직 근무자로부터 “간밤에 치안본부로부터 연락을 받고 신원확인 하느라 진땀을 뺐다”는 넋두리와 함께 ‘朴鍾哲’이라는 한자 이름과 가족 및 집(청학양수장) 전화번호까지 알아냈다.
집에 있던 은숙씨로부터 “종철이가 사고를 당해 14일 밤에 아버지와 오빠가 서울로 가고 나도 엄마와 함께 서울갈 준비를 하고 있다”는 사실 확인과 함께 “서울에서 경찰 두명이 와서 종철이 소지품을 챙기고 있다”는 상황 설명도 들을 수 있었다.
이 덕분에 오전 10시 30분 석간신문 1판 사회면에 ‘경찰에서 조사 받던 대학생 쇼크사’라는 제목의 2단 기사를 첫 특종 보도했다.
우리나라 민주항쟁의 도화선이 된 '박종철군 고문치사 사건'이 언론을 통해 세상에 처음 알려진 것이다.
군부독재시대 언론 통제가 심했던 터라 기자의 이름도 없이 보도하게된 이 기사는 편집에서 독자들의 눈에 띄기 쉽게 ‘왈순아지매’ 만화 옆에 게재하는 묘를 살려 눈길을 끌었다.
첫 보도 후에도 경찰은 백제화장터에서 화장하고 장례를 치르는 동안 가족들과 기자들을 격리시켜 보도를 차단했다.
장례를 치른 뒤 부산 영도 청학양수장에 위치한 고 박종철씨의 집을 단독 출입처로 삼으면서 그동안 입을 굳게 다문채 울분을 삭이던 아버지 박정기씨와 ·어머니 정차순씨의 인터뷰를 잇따라 특종 보도했다.
박 씨는 공직 퇴직 후 '전국 민족민주 유가족협의회'를 이끌면서 나머지 인생을 아들이 못 이룬 민주주의를 위해 살고 있다.
아울러 민주주의 세상을 만들고자 했던 박종철 열사의 꿈을 받들기 위해 ㈔민주열사박종철기념사업회가 만들어 지고 박종철인권상을 제정해 매년 수상자를 선정하는 등 다양한 기념 사업도 펼쳐지고 있다.
이날 박정기씨는 30년전의 기억을 회상하듯 “아직도 종철이가 바라던 세상은 오지 않은 것 같다”며 “종철이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제대로 된 민주사회가 하루빨리 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거리의 촛불집회 없이도 세상이 밝고 투명한 민주사회가 열리는 그날을 함께 기원한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