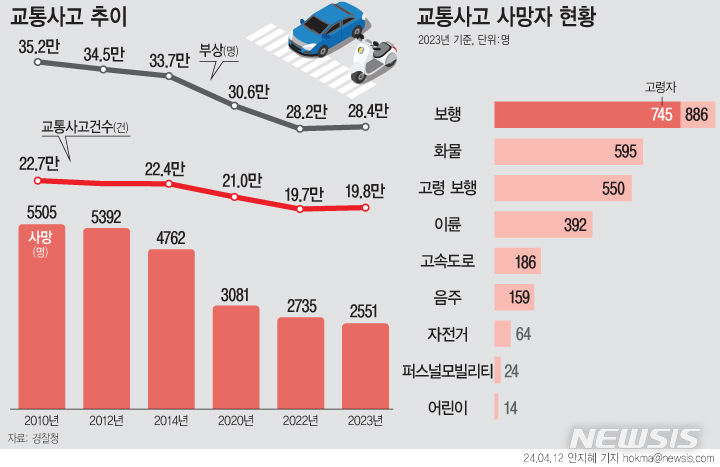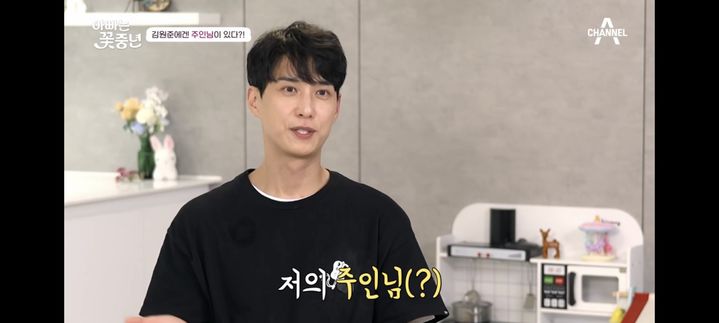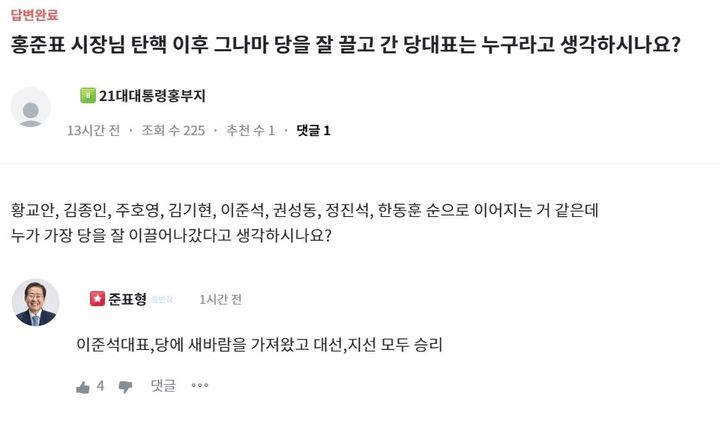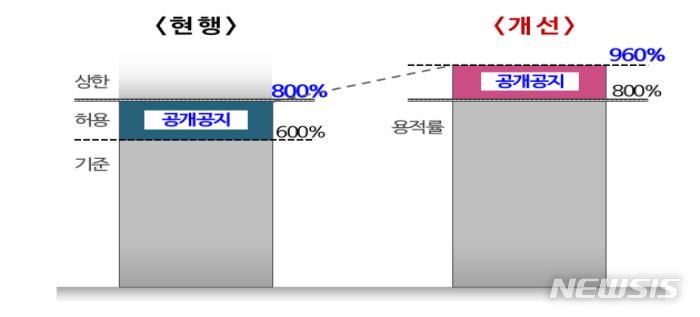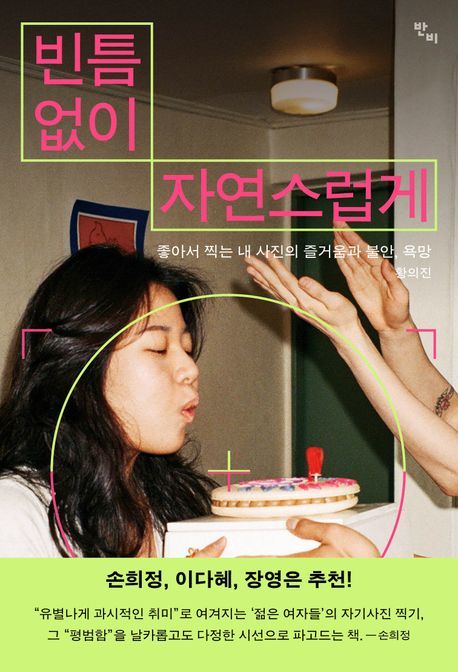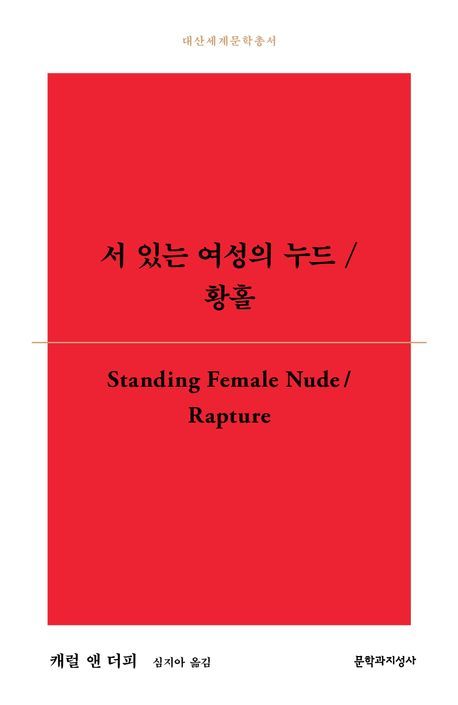[종합]노승일·최순실측 'K스포츠재단 사유화' 두고 갑론을박

최씨 측 "더블루케이 망하지 않았느냐"
노 부장 "이 사건 이후 자진해서 없어진 것"
【서울=뉴시스】오제일 나운채 기자 =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61·구속기소)씨 재판에서 K스포츠재단 노승일(41) 부장과 최씨 측이 '최씨의 K스포츠재단 사유화'를 두고 갑론을박을 벌였다.
노 부장은 최씨가 K스포츠재단 기금을 1000억원까지 늘이려는 계획을 세운 것 등을 미뤄볼 때 재단이 최씨 소유의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고, 최씨 측은 판단 근거를 추궁하며 노 부장을 압박한 것이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최씨와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7차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노 부장은 "최씨가 더블루케이 사무실에서 사실상 K스포츠재단 업무도 지휘 감독했다"고 밝혔다.
노 부장은 "더블루케이가 전략을 짜고 지시하는 머리 역할이었다. 최종적 권한은 모든 게 더블루케이에 있었다"며 "K스포츠재단은 돈을 가지고 실행만 하는 몸통"이라고 말했다.
'K스포츠재단도 이사회가 있지 않느냐'는 검찰의 질문에는 "이사회가 있지만 모든 분이 최씨를 안 거치면 선임이 안 된다. 창피하지만 K스포츠재단 이사회는 유명무실한 기구"라고 답했다.
노 부장은 최씨가 K스포츠재단 기금을 1000억원까지 늘이려는 계획을 세우고, 이를 위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올 것을 지시했다고도 했다.
애초 삼성 등 대기업 등이 288억원을 출연하기로 예정돼 있었지만, 추가 후원금을 타낼 계획을 세우고 관련 지시를 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노 부장은 '1000억원 기금을 계획한 점 등에 비춰볼 때 K스포츠재단을 설립한 것도 최씨라고 생각하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네"라고 답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최씨 측 변호인은 "재단을 최씨가 소유했다는 것이, 최씨가 재단 돈을 마음대로 썼다는 것이냐"고 물었다. 또 "사유화는 개인 소유란 뜻인데, 노 부장의 말은 최씨가 운영에 관여한 걸로 보인다"고 압박했다.
이에 대해 노 부장은 "사유화가 맞다"며 "본인이 마음대로 자금도 집행하고 인선도 하는데, 사유화가 아니면 어떤 것이 사유화이냐"고 되물었다.
최씨 측이 "최씨가 돈을 자기 주머니로 가져간 적이 있냐"고 재차 묻자 노 부장은 최씨의 조카 장시호씨가 이사로 있는 더스포츠엠이 K스포츠재단과 계약한 것을 거론하며 맞섰다.
노 부장은 "더스포츠엠 설립이 2016년 3월이고, K스포츠재단과 5~6월 계약한다. 돈이 빠져나간 거에 장씨가 있는데 그 부분은 최씨 회사라고 안 보이는가"라며 "더스포츠엠도 최씨 거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최씨 측은 "더블루케이가 엄청난 이익을 챙겼어야 하는데 망하지 않았느냐"고도 지적했다. 노 부장은 "망해서 없앤 게 아니라 이 사건이 생기면서 자진해서 없어진 거"라며 "시간이 좀 더 지났으면 더 많은 이익을 챙겼을 것"이라고 대답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최씨가 더블루케이 등을 통해 수익을 내기 위해 정부 내부 문건을 참고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최씨가 '종합형 스포츠클럽 운영 현황 및 개선방안 보고' '스포츠클럽 지원사업 전면개편 방안' 등 문건을 건네며 보고서 작성 등을 지시했다는 것이다.
노 부장은 '더블루케이가 스포츠클럽 지원사업 전면개편 방안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었던 이유' '누슬리 영업 에이전트 계약 체결 경위' 등에 대해 "비선실세 최씨가 있지 않았으면 가능하지 않은 상황" "청와대가 뒷배경이 아니었으면 체결 안 했을 것"이라며 최씨의 영향력을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