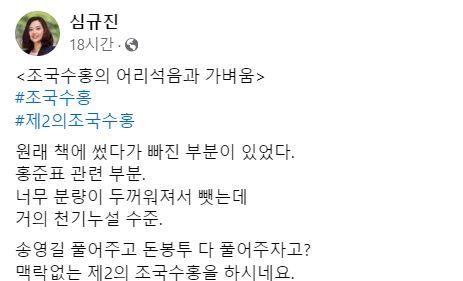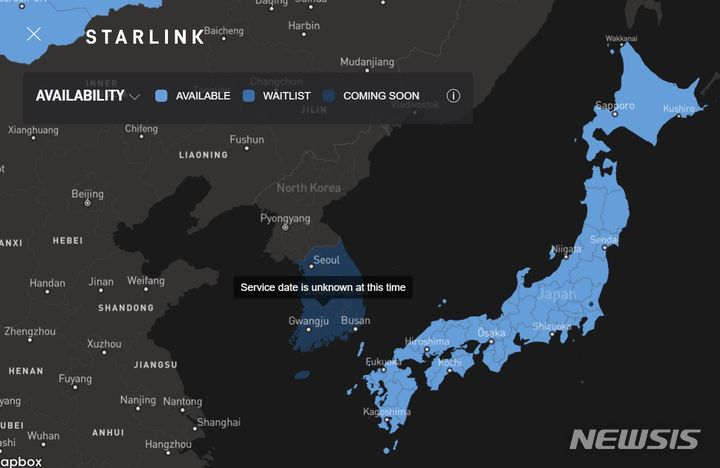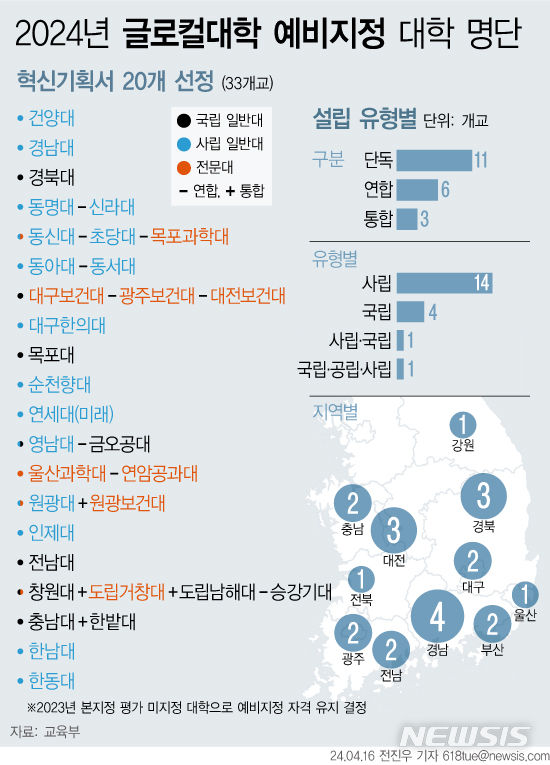삼성전자, '중국과 영토분쟁' 인도 스마트폰 시장서 반사이익 전망

【서울=뉴시스】최현 기자 = 중국과 영토분쟁으로 대립하면서 무역전쟁까지 벌이고 있는 인도의 스마트폰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반사이익을 얻게 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17일 중국 현지언론 등에 따르면 인도 정부는 93종의 중국산 수입제품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 여기에는 전자제품을 비롯해 석유화학, 화공, 철강, 비철금속, 섬유, 실, 기계류, 고무, 플라스틱, 전자제품, 소비용품 등 다양한 제품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인도 스마트폰 시장에서 중국 제조사의 거센 추격을 받고 있는 삼성 입장에서는 유리한 국면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인도에서 저변을 넓히고 있는 중국 스마트폰 제조사들은 이번 사태로 불이익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관측된다.
◇전운 감도는 인도·중국, 일촉즉발 위기…국경문제에 무역분쟁까지
인도와 중국의 국경분쟁은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분쟁 지역인 도카라(중국명 둥랑·부탄명 도클람)에는 전운이 감돌고 있다.
중국과 인도, 부탄 3개국 국경이 맞닿아있는 도카라는 지난 6월부터 중국의 도로 건설로 인한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부탄은 도카라가 자국의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고, 인도는 부탄의 편을 들고 있다. 3국은 이 지역의 국경이 1890년 중국과 영국 간의 조약에서 확정됐다고 인정하고 있지만 국경선에 있어서는 견해차가 크다.
중국을 도카라를 실효 지배하고 있는 자국 땅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부탄은 국경이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부탄의 보호국인 인도가 직접 나서고 있는 형국이다.
2015년 기준 부탄의 전체 수출액 5억 달러 중 90.3%가 인도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부탄은 경제적으로도 인도에 기대고 있는 국가다. 인도가 부탄에 행사하는 정치적 영향력도 만만치 않다.
인도 역시 중국이 도카라에 도로를 완성시키면 자국의 전략적 요충지인 '실리구리 회랑'으로의 접근이 용이해지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실리구리 회랑은 인도 북동부 7개주와 바로 연결되는 군사적 요충지이기도 하지만 이 지역을 중국이 점령하게 되면 인도는 동서로 나뉘게 된다. 인도가 중국의 행위를 좌시할 수 없는 이유다.
이에 인도는 시킴과 동부 국경에 4개 군단 18만명의 병력을 집결시키고 포병과 탱크 등 기갑부대, 미사일 발사대를 전진 배치했다. 아울러 국경에서 15km 이내에 사는 주민에 대피령을 내렸다.
중국도 분쟁 현장인 국경과 티베트 일대에 미사일, 탱크, 전투기 등과 병력을 증원했다. 기본적으로 양측 모두 전쟁 준비를 마친 상황이라 언제라도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상태다.
홍콩 동망(東網)에 따르면 중국은 오는 9월3~5일 열리는 브릭스(BRICS) 정상회의 후에 인도에 대한 군사공격을 감행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의 만남이 마지막 협상 장소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인도와 중국간의 문제는 단순히 영토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중국이 인도의 원자력공급국 그룹(NSG) 가입을 지지하지 않고, 인도가 중국이 주도하는 실크로드 경제권 구상인 '일대일로(一帶一路)'에 참여를 거부한 것도 이를 반증한다.
중국이 인도와 적대관계인 파키스탄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도, 티베트 불교의 정신적인 지도자인 달라이 라마가 인도에 망명해 반중 활동을 전개하는 것도 양국을 전쟁 위기로 몰아가는 요인 중 하나다.
◇인도 공략 중인 中 스마트폰 제조사들 '날벼락'
2016년 중국-인도 무역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인도에 있어 최대의 무역 파트너이자 최대 수입 대상국이다. 지난해 양국간 무역액은 711억8000만 달러로 이 중 인도의 중국 제품 수입액은 594억3000만 달러에 달했다. 하지만 수출액은 117억5000만 달러에 그쳤다.
중국은 인도에 전자기기, 통신 설비, 소프트웨어, 공업기계 등을 위주로 수출하고 있고, 인도는 가죽, 면화, 광석 등 상대적으로 저가품을 수출하면서 양국간 무역격차는 급격히 확대되고 있다.
지난 10년간 연평균 50% 가까이 몸집을 키워온 중국 스마트폰 시장은 포화 단계에 이르렀다. 이에 중국 스마트폰 제조사들은 자국이 아닌 인도 등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인도의 스마트폰 보급률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39%에 불과하다.
13억 인구를 지닌 만큼 규모 면에서도 중국과 견줄 만큼 매력적인 시장이기도 한데다 아직까지 피처폰에서 스마트폰으로 옮겨가고 있는 추세라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
인도 스마트폰 시장은 지난해에도 전년 대비 18% 성장했다. 작년에 글로벌 시장 전체 성장률이 2~3%에 불과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인도는 중국에 이어 떠오르는 '약속의 땅'으로 부상하고 있는 셈이다.
인도의 지난해 스마트폰 출고량은 2억대가 채 되지 않았다. 비슷한 인구에 스마트폰 출고량이 5억대가 넘는 중국과 비교하면 낮은 수준이다.
스마트폰 판매량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휴대폰 평균 단가(ASP)를 꾸준히 올리고 있는 이유다. 올해 2분기 인도 시장의 스마트폰 출하량은 전년 대비 4% 증가했고, 스마트폰 ASP의 증가로 전체 매출규모는 25%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수년째 인도 스마트폰 시장 1위를 달리고 있는 삼성전자는 중국 스마트폰 제조사들의 추격을 받고 있다. 삼성전자는 2분기 기준 인도 스마트폰 시장에서 점유율 24.1%로 왕좌를 지키고 있다.
2015년 인도에 진출한 샤오미는 15.5%의 점유율로 2위를 차지했고, 중국업체인 비보(12.7%), 오포(9.6%), 레노버(6.8%)가 뒤를 이었다. '톱5'에서만 중국업체의 비중이 44.6%에 달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인도와 중국의 사이가 악화일로를 거듭하면서 중국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인도에서 고전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관세 문제도 있지만 인도 소비자층에게 외면을 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중국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단기적으로는 관세 압박에, 장기적으로는 인도 시장에서의 브랜드 가치 하락으로 영향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며 "양국의 관계가 쉽사리 풀릴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