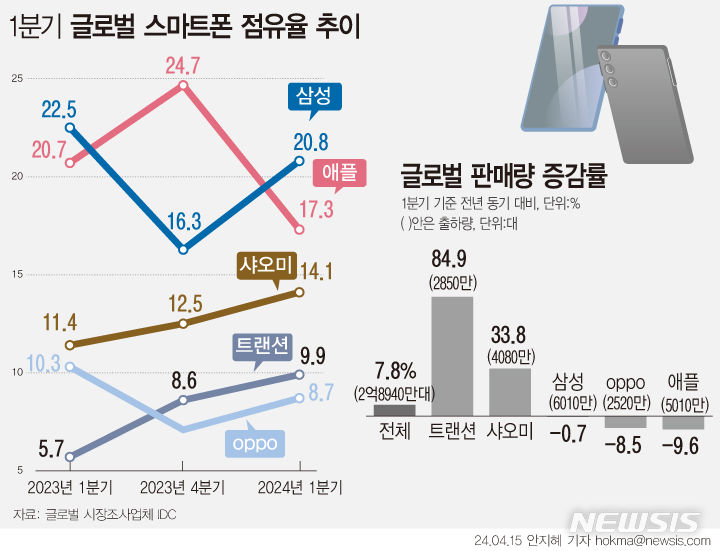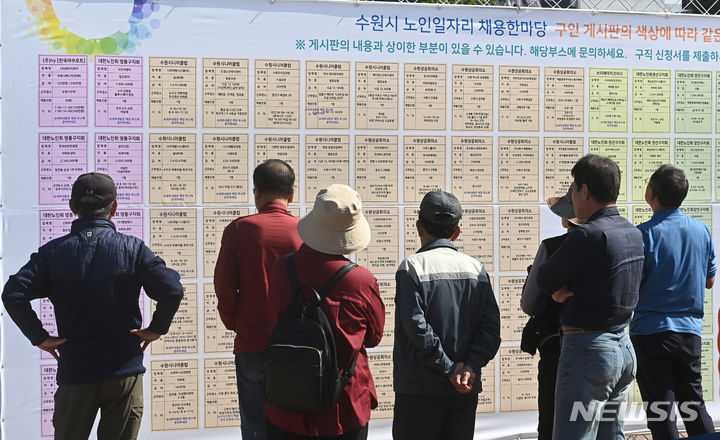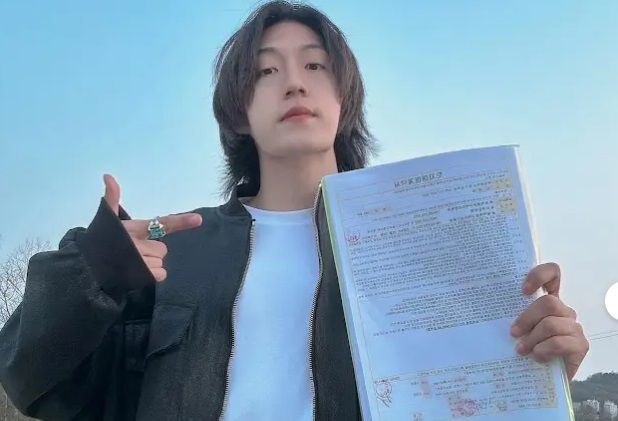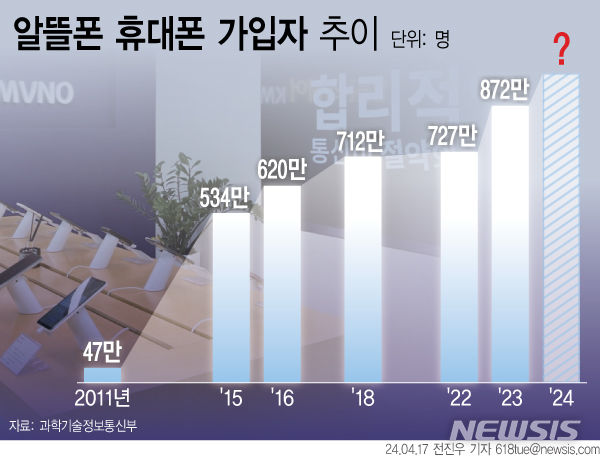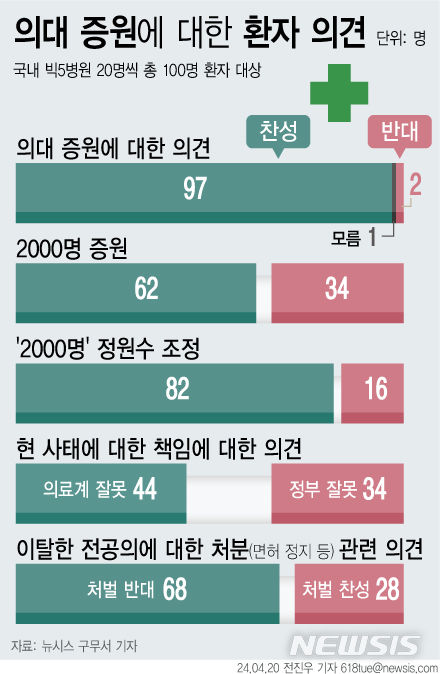친박 핵심들, 朴 출당 논의 공식화에 '침묵'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12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로 들어서며 지지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17.03.12. [email protected]
류석춘 혁신위원장은 23일 홍 대표가 혁신위와 사전협의 없이 박 전 대통령의 출당 문제를 꺼냈다고 불만을 드러내면서도 "인적 혁신 문제는 원래 우리가 생각한 스케줄보다 대표가 먼저 시작을 해서 우리에게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다"며 당초 계획보다 속도가 빨라질 것임을 예고했다.
홍 대표는 지난 16일 전국 순회 토크콘서트 첫 행선지이자 박 전 대통령의 고향인 대구에서 출당 여부에 대해 "정치적 책임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간과하고 넘어갈 수 없다"며 "앞으로 당에서 논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22일 강원민방(G1) 시사매거진 '인사이드'(INSIDE)에 출연해서도 "아직 탄핵의 여파가 남아있고 이걸 극복하지 않으면 지방선거를 하기 어렵다"며 "이걸 극복하는 수단으로 구체제와의 단절 작업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 대표는 "(구체제와의 단절 작업) 거기서 박 전 대통령의 출당 얘기가 나온다. 이건 유무죄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책임 문제"라며 "당이 이렇게 괴멸되고 한국 보수진영 전체가 국민에게 신뢰를 상실하게 된 계기를 만든 정치적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친박 김태흠 최고위원도 같은 날 라디오 방송에 나와 "당규에 따라 최종심 형이 확정될 경우 탈당 권유라든가 아니면 출당이라든가 징계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다"며 "지금은 그런 시점이 아니고 형 확정 이후에 돼야 한다"고 반발했다.
하지만 상당수 친박 핵심들은 사실상 '침묵'하는 분위기다.
대통령 정무특보 출신으로 박 전 대통령과 '각별'한 관계로 알려진 윤상현 의원은 SNS 등을 통해 활발한 대외 활동을 하고 있지만 박 전 대통령 출당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친박 좌장'으로 불리며 박근혜 정부 경제부총리를 역임했던 최경환 의원 역시 박 전 대통령 출당 문제가 공식화된 이후인 17일 SNS에 글을 올렸지만 새만금 세계잼버리 대회 성공 유치를 기원하는 글이었다.
'친박 맏형' 격인 서청원 의원을 비롯해 홍문종, 김진태, 이장우 의원 등도 모두 침묵을 지키고 있는 상황이다.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 근무 경력이 있는 한 친박계 의원실 관계자는 "우리가 나설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현재 당대표는 홍준표"라며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당대표에게 반기를 들 수는 없지 않나.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을 탈당한 '원조 친박'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은 강력 반발하고 있어 한국당 내 친박계와 대조를 이루고 있다.
조 의원은 2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홍준표씨는 잡놈"이라며 "자기 것을 위해서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맹비난했다.
그는 "말도 오늘 내일 바꿀 수 있고, 제가 29살부터 정치했는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라며 "정치 잡놈의 행태를 다 하는 사람이 홍준표"라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그러면서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공천을 받고 박 대통령 이름을 팔아 국회의원이 된, 이른바 한국당 내 친박 세력도 박 대통령 출당 여부 관련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며 "박 대통령 탄핵과 구속에 이런 친박 세력의 비겁한 행태도 중요한 원인이며 전 국민들이 손가락질 하고 있다는 걸 정녕 모른단 말인가"라며 한국당 내 친박계의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