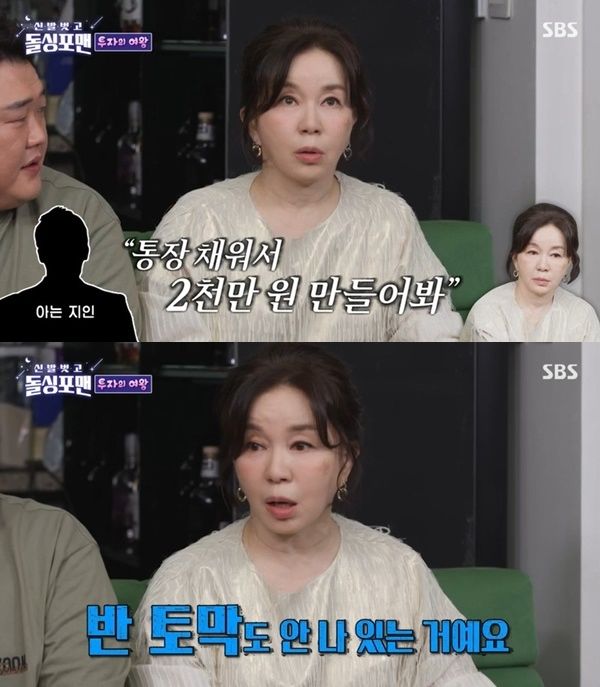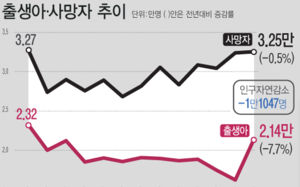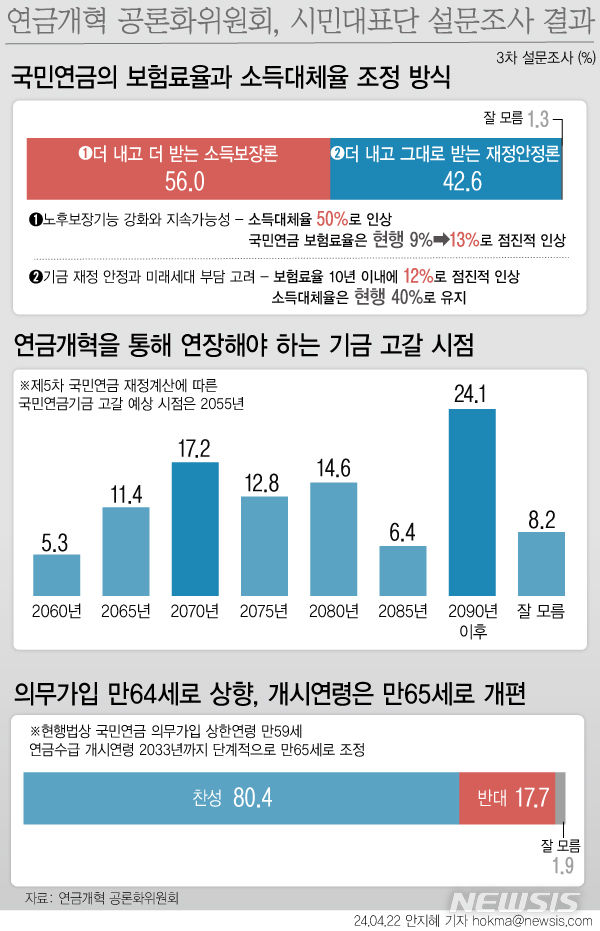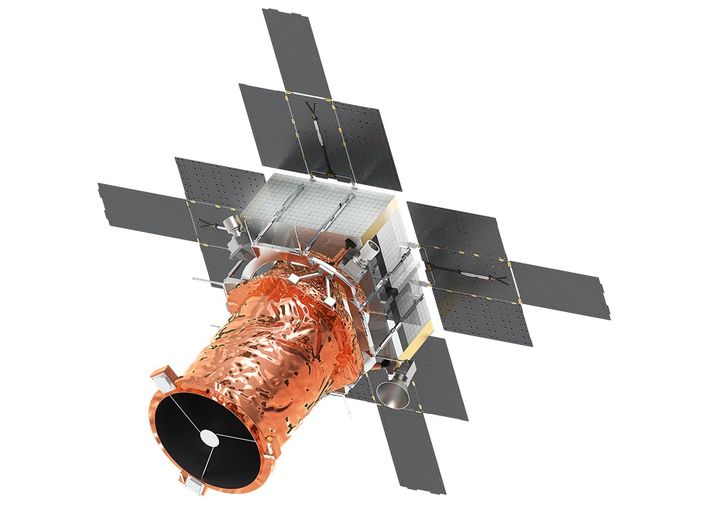[남북정상회담 D-3]文·金 '핫라인' 첫 통화, 회담 이후로 미뤄질 듯
靑, '회담 전 통화'→'회담 전후 미정'
의제조율 등 회담 준비 순항…회담 이후 통화에 무게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24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남북 정상 간 직접통화 일정에 대해 "정상회담 직전에 이뤄질지, 아니면 직후가 될지는 아직 모른다"며 "얼굴을 한 번도 보지 않은 분들끼리 직접 전화를 먼저 하기엔 어색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상회담일인) 27일 이전에 한다면 정상간 통화는 실질적인 내용을 갖고 통화하는 게 아니다.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것"이라며 "굳이 상징적인 통화를 할 필요가 있을까 싶다"고 부연했다.
청와대와 북한 국무위원회를 연결하는 핫라인 설치는 지난달 초 대북특사단의 방북 때 남북이 합의한 6개 사항 중 하나다. 남북의 '군사적 긴장완화와 긴밀한 협의'를 위한 것으로 첫 통화를 정상회담 이전에 갖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남북은 지난 20일 핫라인을 개통했다. 4분19초 동안 남북 실무진이 시험통화를 하며 최종점검도 마쳤다.
하지만 정상회담을 불과 사흘 앞둔 현재까지 남북 정상의 역사적인 첫 통화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 사이 청와대의 입장도 바뀌었다.
전날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르면 오늘(23일) 김 위원장과 문 대통령간 역사적 첫 통화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발언하자 청와대는 이를 부인하며 "27일 남북정상회담 이전이 될지 이후가 될지 미정"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당초 '정상회담 전 첫 통화'에서 회담 이후 쪽으로 점차 무게추가 옮아가고 있는 것이다. 다만 이는 남북 간에 이견이 있다거나 하는 문제는 아니며 정상회담 준비가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정상회담 준비가 잘 돼 가고 있는 만큼 통화를 위한 통화는 이뤄질 것 같지 않다"며 "남북 고위급 회담도 분위기상 (정상회담 이전에) 열리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9일 남북 고위급 회담이 끝난 뒤 '필요시 4월 중 후속 고위급 회담을 열어 의제를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지만 현재까지 개최되지 않고 있다. 이는 남북 간 의제조율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의미로 정상 간 통화가 이뤄지지 않은 것과 비슷한 맥락이란 것이다.
청와대는 정상회담 의제 확정을 위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가정보원장의 평양 재방문 가능성도 낮아졌다고 밝혔다. 남북은 전날 열린 3차 의전·경호·보도 분야 실무회담을 통해 양측 정상의 구체적인 동선과 세부일정까지 최종 확정한 상태다.
일각에서는 오는 27일 전세계에 생중계될 예정인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역사적인 첫 만남을 보다 부각시키기 위해 청와대가 핫라인 통화를 연기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지난 두 차례 남북 정상회담은 평양에서 열렸지만 이번에는 처음으로 남측 지역인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열린다. 북한 최고지도자가 처음으로 남한 땅을 밟게 된다는 의미다.
문 대통령이 군사분계선(MDL) 남측 선상까지 영접을 나가있다가 걸어내려오는 김 위원장과 악수를 나누거나 포옹하는 장면이 전세계에 송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장면을 위해 청와대는 남측 취재진이 판문점 북측 지역으로 넘어가 김 위원장의 방남 장면을 담아낼 수 있도록 했다.
이런 가운데 회담 전에 핫라인 통화가 성사되면 오히려 남북 정상 간 대좌의 상징성이 반감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 서로 얼굴도 보지 못한 상태에서 첫 통화는 날씨나 안부 인사 등의 의례적인 내용으로 흐를 수 있는 만큼 정상회담 뒤에 협의 이행 등을 위한 실질적인 통화를 갖는 게 더 의미가 있다는 점을 청와대는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