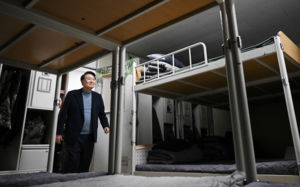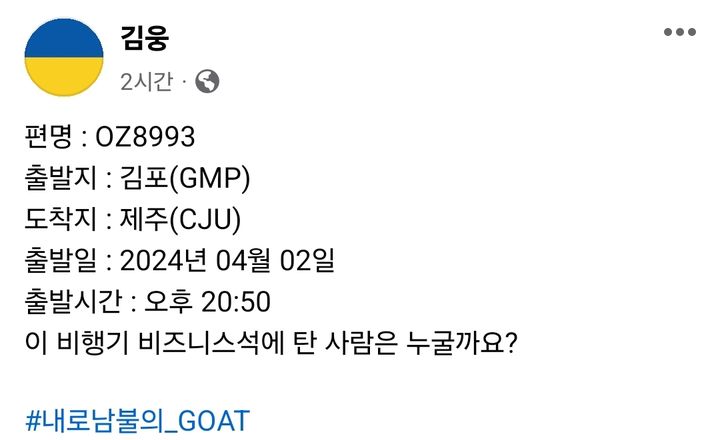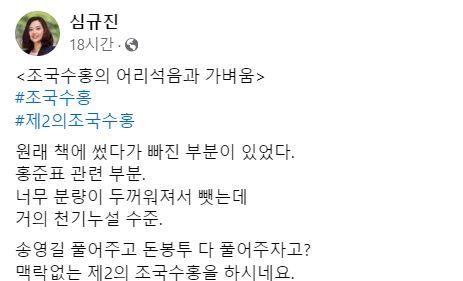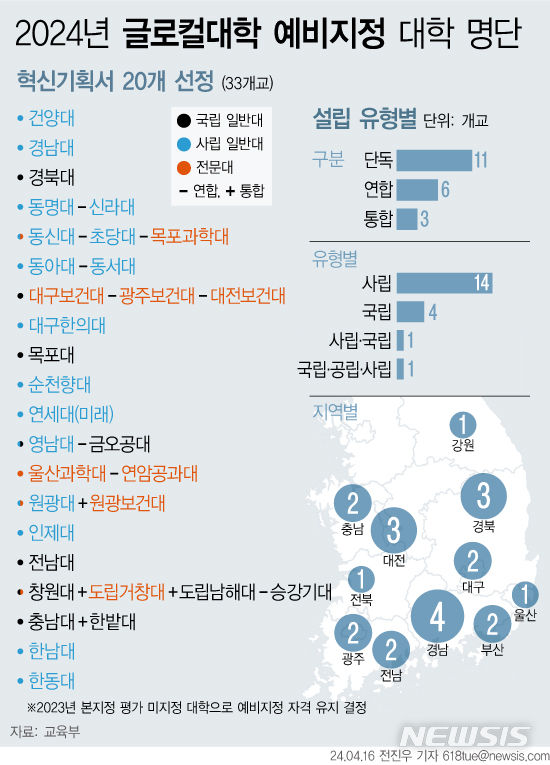[기자수첩]가요순위,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안 된다
![[기자수첩]가요순위,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안 된다](http://image.newsis.com/2018/07/23/NISI20180723_0000177832_web.jpg?rnd=20180730091841)
신해철은 세상에 없지만, 그의 예언은 맞아떨어지고 있다. 2018년에도 순위제는 얼굴만 바꿔 가요계를 멍들게 하고 있다. 음원차트가 진원지다. '순위 매기기'의 나라인 한국의 맨얼굴이 똬리를 튼 곳이다. 한국의 모든 이슈는 포털사이트에 있다.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 순위에 따라 당일 화젯거리가 정해진다. 음원차트에서도 마찬가지다. 실시간 차트 상위권에 든 곡에 대한 언급과 주목도가 높아진다. 그래야 인터넷 기사, 방송 출연 등의 부가혜택이 생긴다.
이 와중에 부작용은 필연이다. 대중적인 인기가 자연스럽게 반영되는 것이 아니라 팬덤에 따라 순위가 갈린다. 아이돌 그룹이 새 음원을 발표하면, 팬들이 차트 순위를 올릴 목적으로 특정 음원을 집중 스트리밍하는 '총공'이 보기다. 싱어송라이터 윤종신의 "차트는 현상의 반영인데 차트가 현상을 만드니 차트에 어떡하든 올리는 게 목표가 된 현실"이라는 지적은 적확하다.
팬덤이 없는 가수 또는 조직이 현상을 만들기 위해 최근 무기로 내세우는 것이 소셜 미디어를 통한 '바이럴 마케팅'이다. 음원차트 1위에 올랐으나 인지도가 없는 터라 음원차트 조작 논란에 휩싸인 닐로와 숀이 이 바이럴 마케팅의 수혜자라고 가요계는 판단하고 있다. "편법이다", "거대 팬덤이나 전통 미디어에 의지하지 않은 좋은 전략"이라는 등 의견은 분분하다.
불법이든 아니든, 가요계의 다양성에 해를 끼치는 것은 맞다. 눈에 띄는 음악이 눈에 띄게 하려고 해서 눈에 띈 음악이라니···. 음원차트의 공정성은 이렇게 불신 받는다. 가요계 내부에서도 서로가 서로를 의심한다.
가요 담당기자로서 한때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차트', '톱100'만 내내 듣던 시절이 있다. 제 얼굴에 침 뱉기지만, 음원차트 순위로 기사를 '쉽게' 쓰기도 한다. 이제는 다른 방식으로 음악을 찾아 듣는다. 유튜브, 애플뮤직 등도 그 중 하나다. 주로 듣는 음악과 비슷한 음악을 추천해주는 '큐레이션' 기능 때문이다. 추천해준 음악들을 따라가다 보면, 알지 못했던 좋은 음악을 발견하게 된다.
최근에는 미국 서브팝 밴드 '더 신스(The Shins)'의 '뉴 슬랭'을 알게 됐다. 영화 '가든스테이트'(2004)에 실린 곡이지만, 차트에서 대박이 나지 않은 곡이어서 알지 못했다. 나른하지만 뭉근하게 설레는 리듬 위로 노곤한 보컬이, 폭염이 바짝 구워버린 대지처럼 메말라 버린 내 플레이 리스트에 단비를 내린다. 음원차트를 바라보는 심경을 대변하는 듯한 노랫말도 귀에 감긴다.
"난 평생 못 찾을 지도 모르는 좋은 삶을 찾고 있어. 믿음과 불 타는 들판 없이 내가 다시는 순수해지기 너무 어리석은 걸까(I'm looking in on the good life i might be doomed never to find. Without a trust or flaming fields am i too dumb to refine?)"
문화스포츠부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