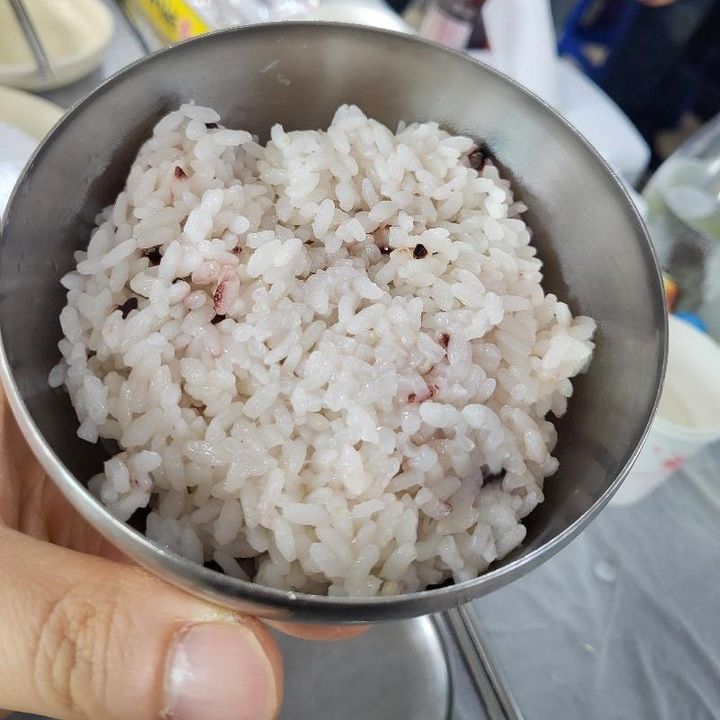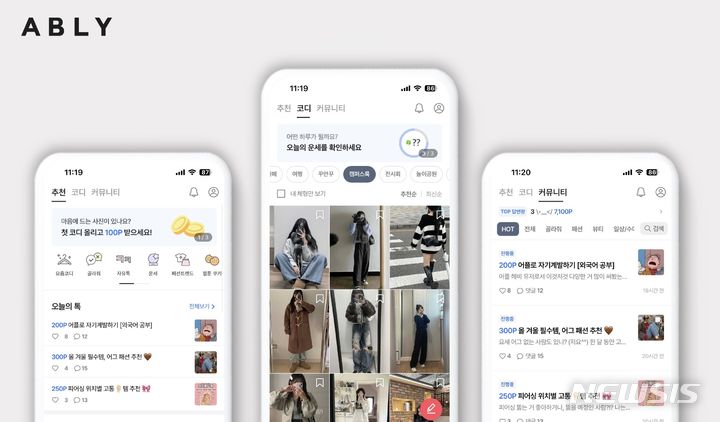최치언, 5차원 연극 작가·연출자···'어쩌나 어쩌다 어쩌나'

창작집단 상상두목 대표로 공연 연출가이기도 하다. 문학인을 명예단원으로 둔 이 극단은 연극뿐 아니라 영상, 텍스트가 어우러진 총체극을 선보인다.
창작집단 상상두목과 서울문화재단 남산예술센터가 공동제작한 최 작가의 신작 '어쩌나, 어쩌다, 어쩌나'는 그의 장기가 도드라지는 작품이다. 11월4일까지 남산예술센터 드라마센터에서 공연하는데, 시대의 딜레마 속에 던져진 인간들에 대한 이야기다. '용감한 시민상' 때문에 엮인 두 남자의 사연이 최 작가 특유의 블랙코미디와 독특한 극작술로 버무려졌다. 최 작가가 연출까지 맡았다.
연극 시작의 배경은 군사정권 시절인 1980년. 소시민 '김두관'에게 '용감한 시민상'을 주기 위해 강도 누명을 쓰게 된 '이오구'는 감옥에 간다. 상을 받은 김두관은 유명세를 얻는다. 그러나 같은 시절 만들어진 효도왕, 세금왕, 친절봉사왕 등처럼 정권 홍보를 위해 이용될 뿐이다.
최 작가는 "사건과 사실이 아니라, 이면에 담겨진 의미와 사람이 궁금했어요"라고 말했다. 이번 희곡은 영화 일도 겸하는 그가 10년 전 쓴 시나리오가 원안이다. "의도하지 않게 '용감한 시민상'을 받은 사람과, 역시 자신의 의도와는 다르게 강도로 찍혀 교도소에 간 사람이 만난다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칼을 든 사람이 스스로는 자해라고 하는데 옆에서 봤을 때는 위험해보였고, 그것을 얼떨결에 제압한 사람이 있고. 현상과 달리 그 안에 들어가서 의미를 따져보면 복잡할 것 같았죠."
작가란 이런 '세밀한 부분에 집중하는 사람'이라고 그는 여긴다. "만약에 정말 감옥에 간 사람에게 억울한 일이라면 문제가 달라지잖아요."
김두관과 이오구의 악연은 30년을 넘어 최근 촛불집회로까지 이어진다. 달라진 세상에 적응하지 못한 두 사람의 모습은 페이소스가 짙다. 제목 '어쩌나, 어쩌다, 어쩌나'는 주인공 2명의 삶을 지켜보는 관객이 내뱉는 감탄사라고 한다. '군사정권의 정당성을 포장하려는 국가 권력이 만들어 낸 소용돌이 속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두 주인공은 용기를 내지만, 그럴수록 수렁에 빠지는 모습'이 이 감탄사를 연발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사람은 주변 환경이 어떻게 변하든 외롭다고 생각해요. 무엇인가를 찾아도 해결되는 것은 아니죠. 관객들이 얼마나 웃을 지 모르겠지만 작품은 확실히 블랙 코미디입니다. 인물이 처한 과한 상황을 보면서 지난 힘든 시절을 정치, 이념이 아니라 어떻게 몸부림치며 뚫고 왔는지를 보여주고 싶었어요."
이번 연극에서 특기할 점은 극의 시작과 끝을 영화가 열고 닫는다는 것이다. 일종의 프롤로그와 에필로그다. "연극과 영화의 차이는 기록이에요. 영화는 다시 되돌려볼 수 있지만, 현장성이 강한 연극은 지나가버리죠. 즉, 구조적으로 영화는 지나간 시대 기록의 기록, 지금을 살아가는 것은 연극에 가깝죠."
'구조주의 극작술'이라는 창작법을 개진한 최 작가의 희곡에는 층위가 여러 개 겹쳐있다. 플롯이 복잡하다. 예컨대, 3년 전 남산예술센터에서 김승철 연출로 공연한 연극 '소뿔자르고주인오기전에도망가선생'은 극중극, 2중 구조를 넘어 연극 속 연극의 바깥까지 다루는 3중 구조를 선보였다.

"희곡이 현장을 만나면 텍스트에 내재한 팽팽한 긴장감이 느슨해져요. 배우를 만나면 일상화가 됩니다. 그래서 희곡의 언어 자체를 지키는 방법을 찾게 됐어요. 언어를 구조화해서 그것에서 벗어나지 않게 만드는 거죠. 예를 들어 희곡 안에서 같은 언어들이 여러 번 써서 곳곳에서 걸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 언어를 생각할 수밖에, 쓸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죠."
언어의 그물이라고나 할까, 다른 작가들이 낚싯대로 텍스트에서 강렬하고 중요한 단어를 낚아챈다면, 최 작가의 글은 그물로 전체를 건져내려 한다.
"저랑 많이 작업한 이성열 연출님도 그러더라고요. 언어를 하나 들어내면 구조가 망가진다고요. 퍼즐처럼 짜여져 있다는 거예요. 제 글은 선이 아닌 면으로 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한줄 한줄 읽으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가도 전체를 다 읽어보면 들어오는 거죠. 일종의 '면쓰기'라고 할까요."
출판사 걷는사람의 복간 시집 시리즈 '다시'를 통해 기존의 시집 '설탕은 모든 것을 치료할 수 있다'를 다시 낸 최 작가는 신작 시집 '북에서 온 긴 코털의 사내'를 펴낸다. 다양한 영역에서 전방위 글쓰기를 보여준 그가 아직 쓰지 않은 장르의 글이 있을까. 아직 발표를 하지 않아서 그렇지 청소년 소설, 동화도 이미 써놓았다.
"지금은 실험적인 것을 쓰는 것보다, 산문집을 내고 싶어요"라고 했다. "그간 장르 안에서 규칙을 가지고 글을 썼는데 산문은 자유로운 고백이 매력이잖아요. 제가 아직은 자기 고백에 서투네요"라며 웃었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