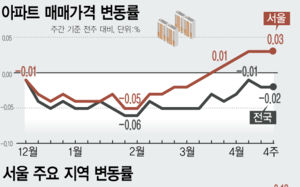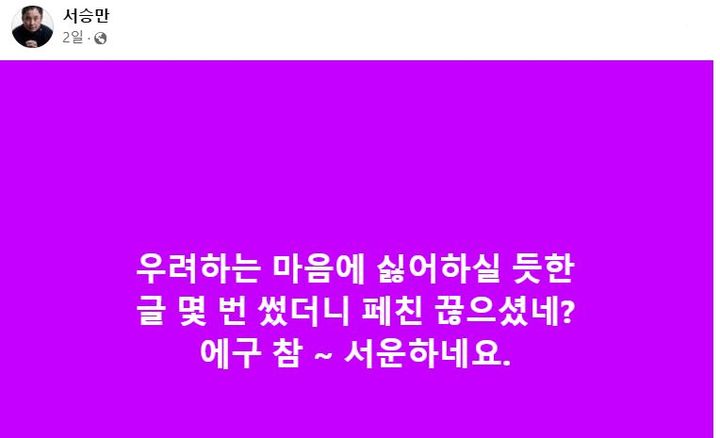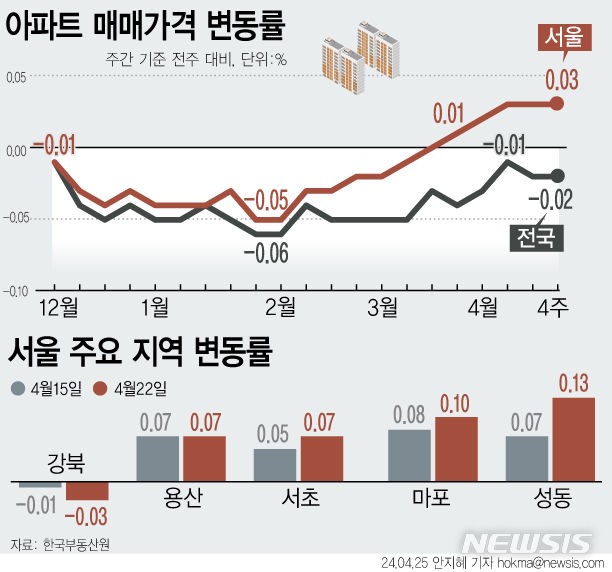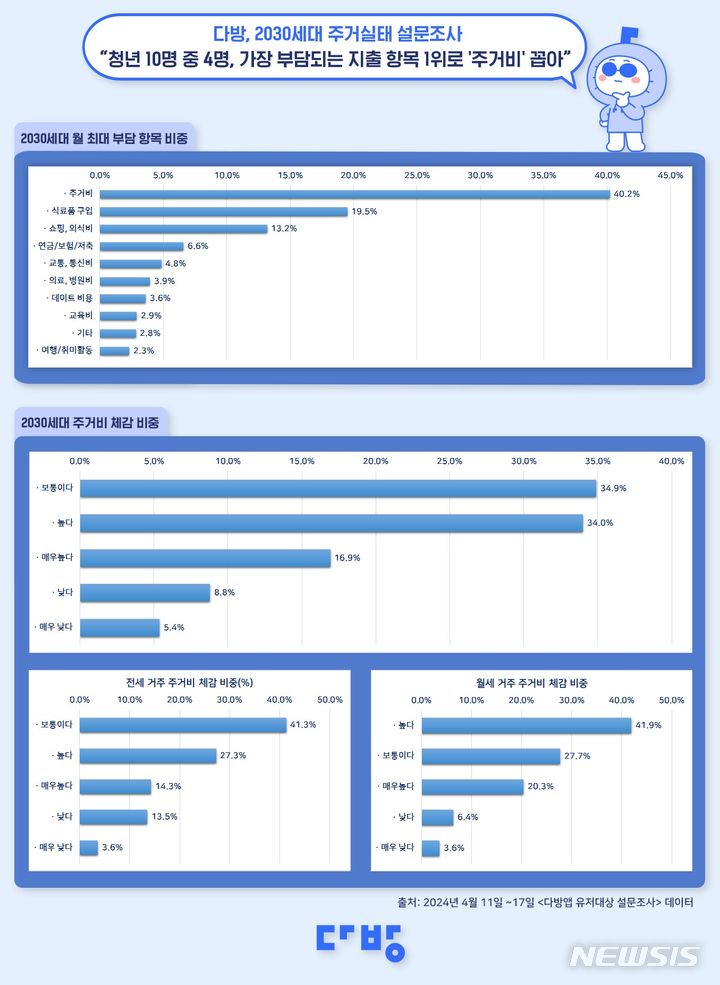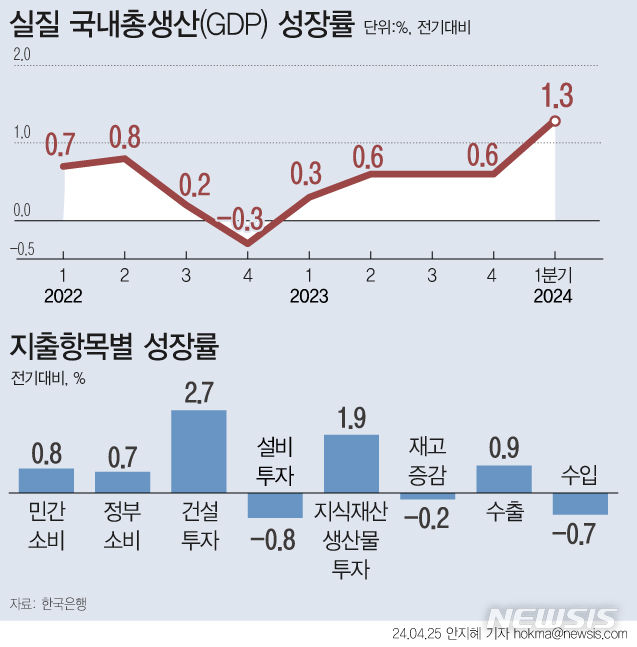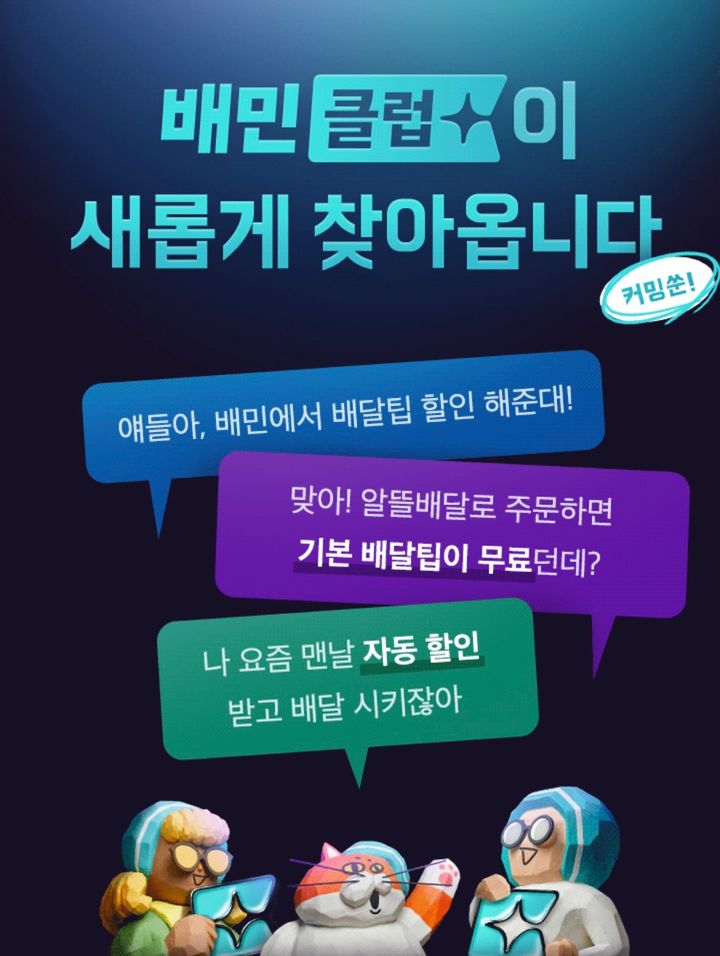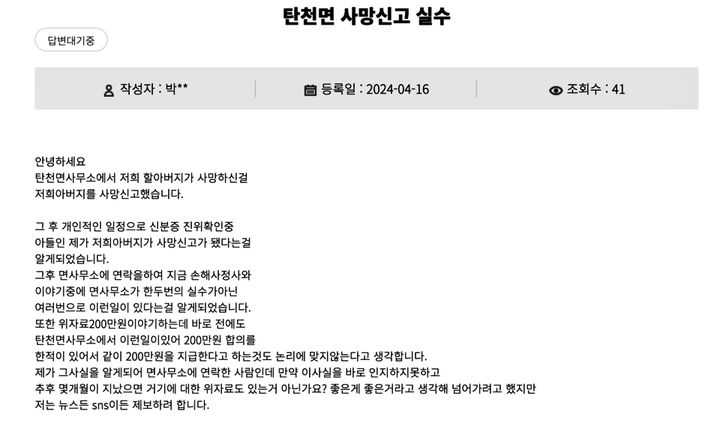[기고]하늘에서 지키는 바다

【서울=뉴시스】 류춘열 해양경찰청 차장
【서울=뉴시스】 70년 전 서울과 부산을 오가는 민항기가 처음으로 우리나라 상공을 비행했다. 그리고 이날을 기념하기 위해 10월30일을 항공의 날로 지정했다. 항공 종사자로서 지녀야 할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마련한 것이다.
오늘도 우리나라 하늘에는 군용기, 여객기, 닥터헬기 등 다양한 종류의 항공기가 비행하고 있다. 바다를 지키는 해양경찰에도 항공기가 있다. 지금 이 순간도 99명의 조종사와 200명의 항공구조사 등이 비행기 6대와 헬리콥터 18대를 조종하며 해양영토를 수호하고 바다 위의 선박이나 섬마을에서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인명을 구조하는 임무를 수행중이다.
필자는 매년 항공의 날 즈음이 되면 항공조종사들의 노력과 헌신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되새긴다.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힘쓰던 해양경찰 항공대원 몇몇이 우리 곁을 떠났기 때문이다.
2015년 3월13일 외딴 섬마을 응급환자를 구하기 위해 칠흑 같은 어둠을 헤치고 출동한 헬기가 추락하면서 조종사 등 3명이 사망하고 응급구조사 1명은 실종됐다.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다. 필자는 이 사고를 통해 야간출동, 악천후, 해상비행의 특수성 등 세가지 조건 때문에 생기는 ‘공간정위상실’이 사고의 원인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
공간정위상실(SD, Spatial Disorientation)은 소위 비행착각(Vertigo)이라고 불린다. 구름 속이나 야간처럼 시각적 목표물이 없는 상태에서 인체 평형기관이 감각 오류로 인해 항공기 자세, 고도, 속도 등을 잘못 인지하거나 인지했더라도 조치할 수 없는 상황을 말한다. 이는 조종사들이 공간정위상실에 빠질 수밖에 없는 야간에 해상에서 비행하는 환경의 특수성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
전문가가 아니라면 아무런 장애물이 없는 해상을 비행하는 것이 육지에서 비행하는 것보다 안전하다고 말할 수도 있다. 수평선이 훤히 보이는 대낮이라면 단편적으로 맞는 말일 수 있지만 칠흑같이 어두운 야간에는 사정이 달라진다. 해상에 아무런 장애물이 없다는 것은 곧 고도, 거리와 방향을 가늠하는데 도움이 되는 시각적 목표물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뜻하는 것. 이것은 조종사가 계기에만 의존하는 비행을 해야 하고 이러한 계기비행상태는 우리 헬기조종사들이 공간정위상실에 빠질 수 있는 환경에 상시 노출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간정위상실의 위험에 노출된 채 조종해야만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불굴의 의지와 비행기술, 교육훈련 등이 뒷받침이 돼야 가능하다. 해양경찰 헬기조종사들은 최악의 조건속에서도 회피가 아닌 ‘해야 한다면 즐기자’라는 각오로 모든 비행임무에 수행하고 있다. 불철주야 안전 비행과 국민의 생명 수호, 이 두 가지 모두를 완벽하게 달성하는 것을 이들은 숙명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해양경찰 내부에서도 공간정위상실에 의한 일시적 고도감 상실에 대한 훈련을 강화하는 등 자체적인 노력에도 힘쓰고 있다. 공간정위상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성능을 가진 헬기들이 해양경찰에 많이 도입된다면 조종사들의 안전을 확보해 해양주권을 수호하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데 더욱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악천후 속에서 야간에 바다 위를 비행하는 것, 그리고 체공하면서 임무까지 수행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 감히 말해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양경찰 헬기조종사는 오늘도 하늘에서 바다를 지키고자 프로펠러를 돌린다. 외딴 섬마을 환자를 위해, 해상에서 구조를 기다리는 선원을 위해, 바다에서 국민의 안전을 위해!
류춘열 해양경찰청 차장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