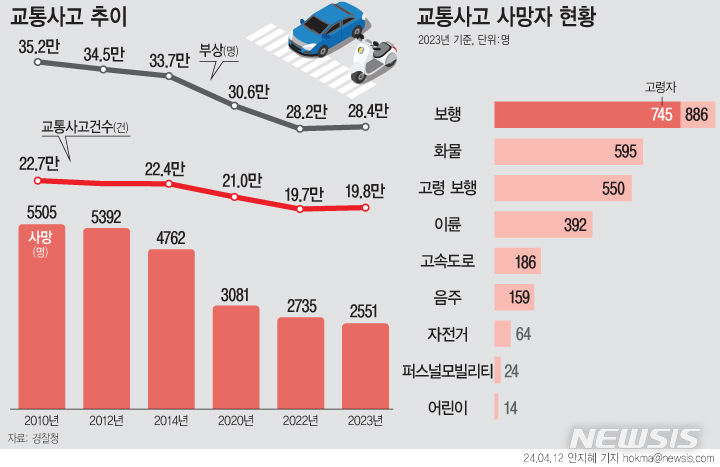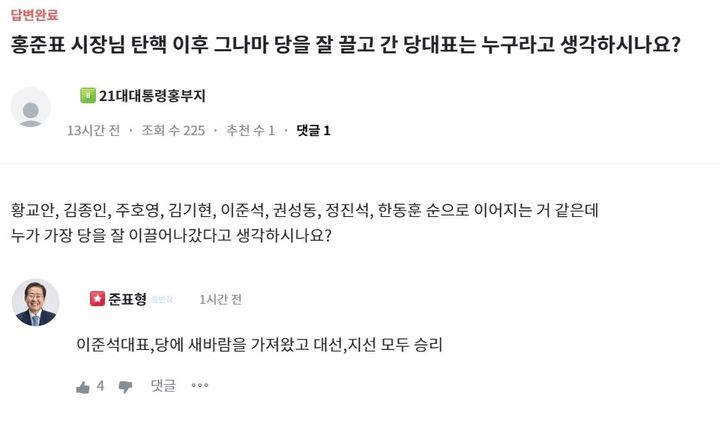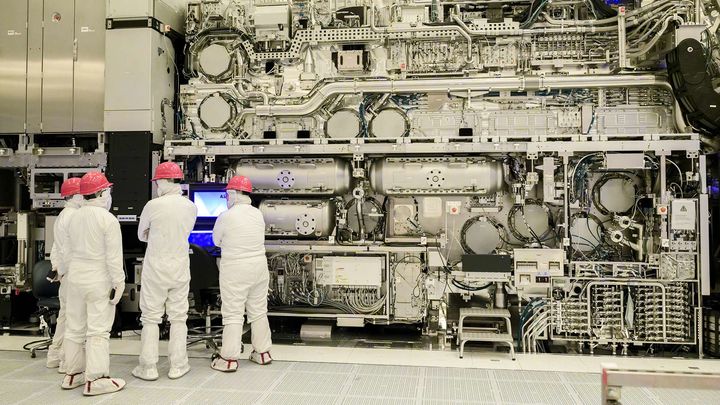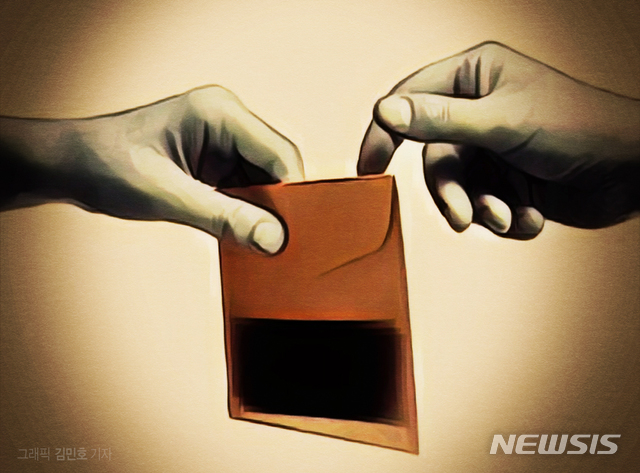[인터뷰]손미 감독 "장애극복보다는 음악에 방점찍고 싶었다"

손미 감독
손미(36) 감독은 18일 개봉한 영화 '뷰티플 마인드'를 이렇게 소개했다. "오케스트라를 주인공으로 하면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스토리가 있다. 처음에는 호흡이 잘 안 맞고 힘든 일이 있다. 이를 극복하고 공연을 성공적으로 해낸다는 결말로 나아간다. 그로부터 최대한 멀리 가고 싶었다."
'뷰티플 마인드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장애를 딛고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내는 이야기다. 10세부터 30세, 천재부터 노력파, 장애인부터 비장애인까지, 실력도 개성도 제각각인 뮤지션들이 '서로의 차이'에 귀 기울이며 오케스트라 앙상블을 맞추어간다.
![[인터뷰]손미 감독 "장애극복보다는 음악에 방점찍고 싶었다"](http://image.newsis.com/2019/04/19/NISI20190419_0000312490_web.jpg?rnd=20190419173301)
지난 2월 53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난 류장하 감독의 유작이다. 뷰티플 마인드 오케스트라의 공연을 우연히 보게 된 조성우 음악감독이 류 감독에게 아이템을 먼저 제안했다. 공연을 본 류 감독은 손 감독에게 공동연출을 제안했다. "당시에 내가 오케스트라가 나오는 미드에 빠져있을 때다. 재미있겠다 싶어서 흔쾌히 공동연출 제안을 수락했다."
류 감독에 대해 "영화를 좋아하고 영화를 찍는 현장을 정말 좋아했던 사람이다. 항상 영화로 사람 사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했다"고 전했다.
"몸이 안 좋다는 것은 알고 있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촬영 현장에서 아픈 기색을 보이지 않으려고 노력한 것 같다. 나와 계속 시나리오 작업을 하고 있었다. 마음의 빚처럼 갖고 있는 이야기가 있다. 영화 '순정만화'(2008) 외에 다른 것도 썼는데 영화화되지 못했다. 영화감독은 작품에 자기 모습이 남는 일이 별로 없다. 하지만 마지막 작품이 다큐멘터리가 되는 바람에 류 감독의 모습이 많이 담겼다. 슬프면서 반가운 마음도 든다. 복합적인 감정이다."
![[인터뷰]손미 감독 "장애극복보다는 음악에 방점찍고 싶었다"](http://image.newsis.com/2019/04/19/NISI20190419_0000312493_web.jpg?rnd=20190419173333)
"카메라 3대를 돌렸다. 찍어놓은 게 많아서 편집할 때 힘들었다. 류 감독과 나는 당시에 촬영이 끝난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뭘해도 그들이 사랑스러워보이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편집 기사와 많이 소통하면서 작업을 했다. 편집 기사는 현장에 오지 않고, 촬영 영상만 보니까 좀 더 객관적으로 관객처럼 판단하기가 좋다. 아이들 각자의 행적을 따라가다 보면 한 지점, 뷰티플마인드 앙상블 오케스트라로 모이게 된다."
![[인터뷰]손미 감독 "장애극복보다는 음악에 방점찍고 싶었다"](http://image.newsis.com/2019/04/19/NISI20190419_0000312506_web.jpg?rnd=20190421005621)
"음악이든 뭐가 됐든 자신이 즐거워하는 일이 있다. 그 때는 시간이 가는 줄 모르지 않나. 좋아하는 무언가에 대한 순수한 마음을 엿볼 수 있는 작품이다. 영화를 본 주변 사람들이 '친구들이 어떻게 지내냐'고 많이들 물었다. 영화는 끝났지만, 이 안에 나온 사람들의 삶은 계속된다. 관객들이 영화를 보는 시간은 잠깐이지만, 그 순간만이라도 이들의 앞날을 응원해주면 좋겠다"고 청했다.
![[인터뷰]손미 감독 "장애극복보다는 음악에 방점찍고 싶었다"](http://image.newsis.com/2019/04/19/NISI20190419_0000312500_web.jpg?rnd=20190421005650)
"어릴 적부터 영화를 좋아했고, 음악적 재능이 없다고 생각했다. 엄마의 제안으로 피아노학원을 다녀야만 했다. 이 경험을 토대로 단편영화를 만들었다. 영화감독이 될 줄은 몰랐다. 흘러가는대로 살자는 주의다. 이번 다큐멘터리 같은 경우도 결말을 향해 나아가는 이야기가 아니라 순간순간에 집중한다. 앞으로 감독으로서도 그렇게 살려고 한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