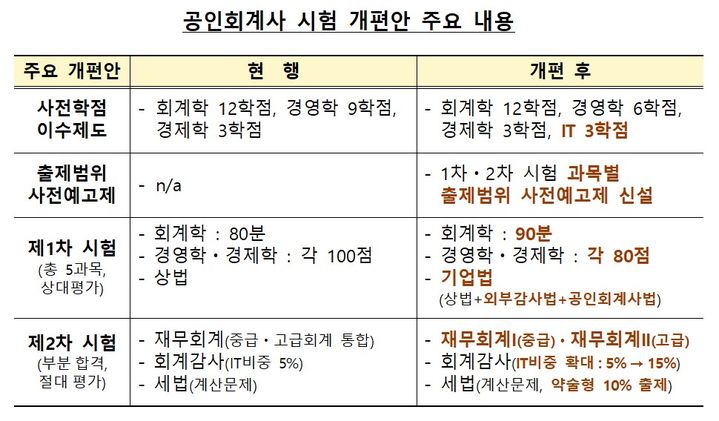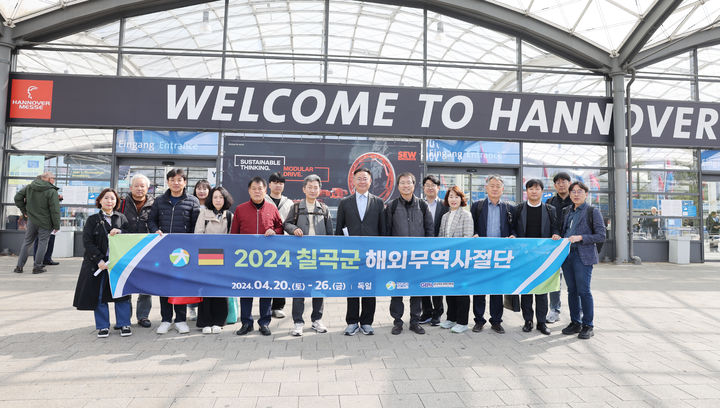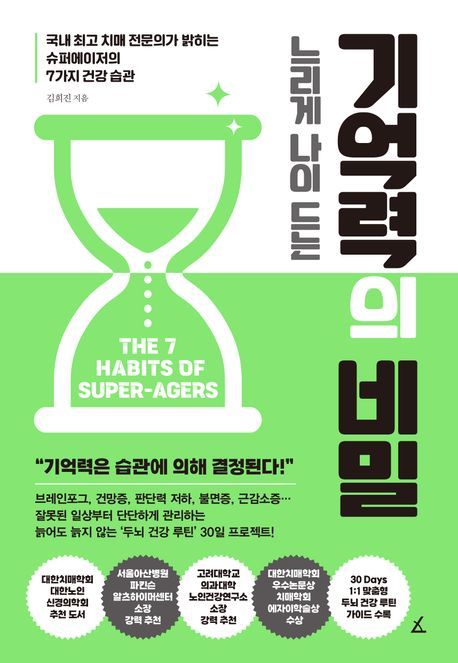노태악 후보자 "법원 향한 국민 시선 차갑다…책임 통감"
노태악 대법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
노태악 "법관이 다루는 건 사람의 인생"
"다양한 이해관계 공존 가치기준 정립"
3월 퇴임하는 조희대 대법관 후임 지명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노태악 대법관 후보자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0.02.19. bluesoda@newsis.com](http://image.newsis.com/2020/02/19/NISI20200219_0016095345_web.jpg?rnd=20200219110830)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노태악 대법관 후보자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0.02.19. [email protected]
노 후보자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노 후보자는 "법관으로 임관된 이래 겸손하고 열린 자세로 당사자의 주장을 경청하고, 구체적 사안에 적합한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외국법원의 파산 절차상 결정의 효력이 국내에서 인정되기 위한 요건 등 관련 법리와 실무를 발전시키는 데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는 보람도 느낄 수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법관은 매일 다양한 사건을 마주하지만, 저는 법관이 다루는 것은 단지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이라고 생각한다"며 "제 판단이 법과 양심에 맞는지, 다른 의견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성찰했는지, 온갖 불이익을 감수하더라도 추구하는 정의를 지켜낼 용기가 있는지에 대해 자문해보고 이를 지켜내겠다고 다짐해 왔다"고 강조했다.
노 후보자는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소수자 보호'가 전제돼야 한다고 밝히며 "사법부의 존재 가치는 다수에 의해 소수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보호하는 데 있다는 신념으로 재판에 임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법부가 처한 현재 상황이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의문에서 시작된 이상 그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 역시 재판 절차를 통해 찾아야 할 것"이라며 "사법부 구성원 모두가 재판의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가슴 깊이 새기고, 이를 침해하려는 내·외부의 시도를 과감하게 배척해 공정하고 충실한 심리에 근거한, 예측 가능하고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결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노태악 대법관 후보자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에서 시작 전 물을 마시고 있다. 2020.02.19. bluesoda@newsis.com](http://image.newsis.com/2020/02/19/NISI20200219_0016095334_web.jpg?rnd=20200219110830)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노태악 대법관 후보자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에서 시작 전 물을 마시고 있다. 2020.02.19. [email protected]
노 후보자는 경남 창녕 출신으로 한양대 법대를 나와 1990년 수원지법 성남지원 판사로 임관했다. 대구지법, 대구고법, 서울지법, 서울고법 판사와 대전지법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서울북부지법원장 등을 지내며 민사·형사·형법 등 다양한 분야를 거쳤다.
노 후보자는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부터 '나쁜 사람'으로 지목돼 좌천 인사 조치됐던 노태강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의 동생이기도 하다.
앞서 지난달 20일 김명수 대법원장은 노 후보자를 오는 3월 퇴임하는 조희대 대법관의 후임으로 임명 제청했다. 법률전문가 및 사법행정가의 면모를 두루 갖추고, 사회적 약자의 기본권 증진에 힘써왔다는 등의 이유에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