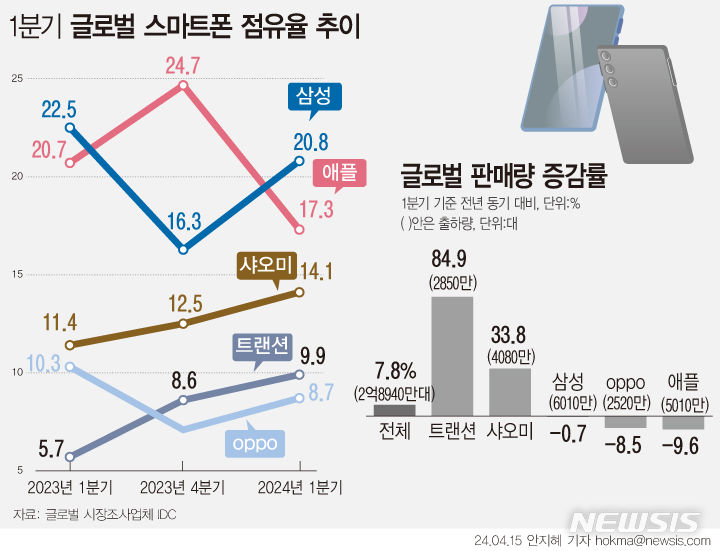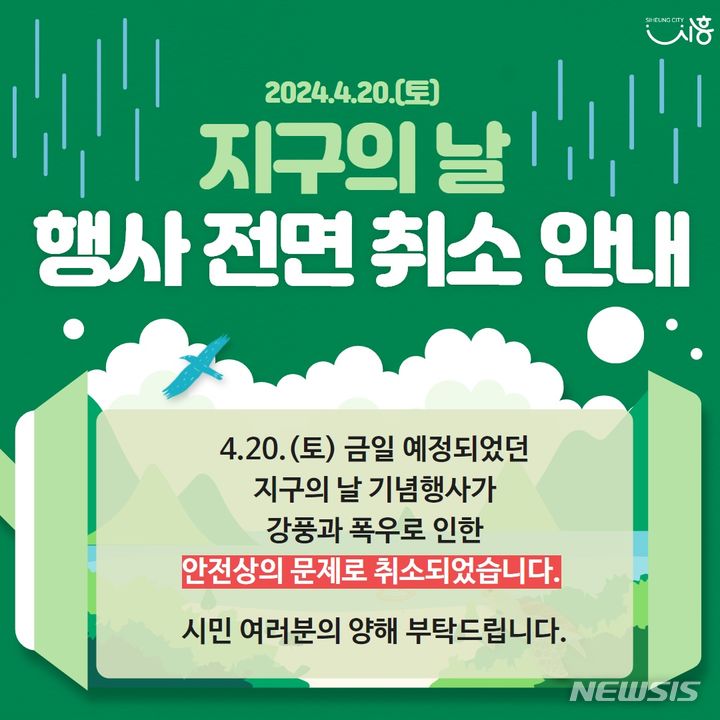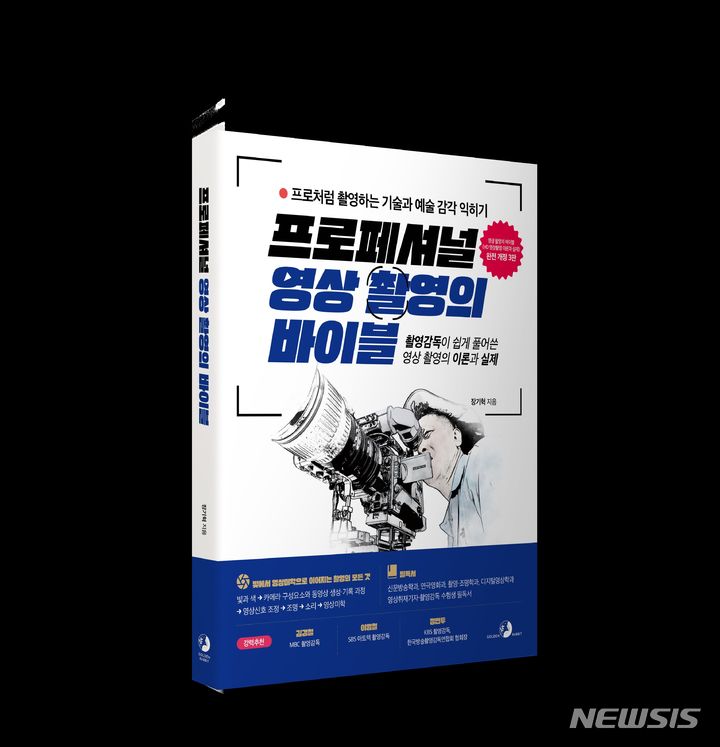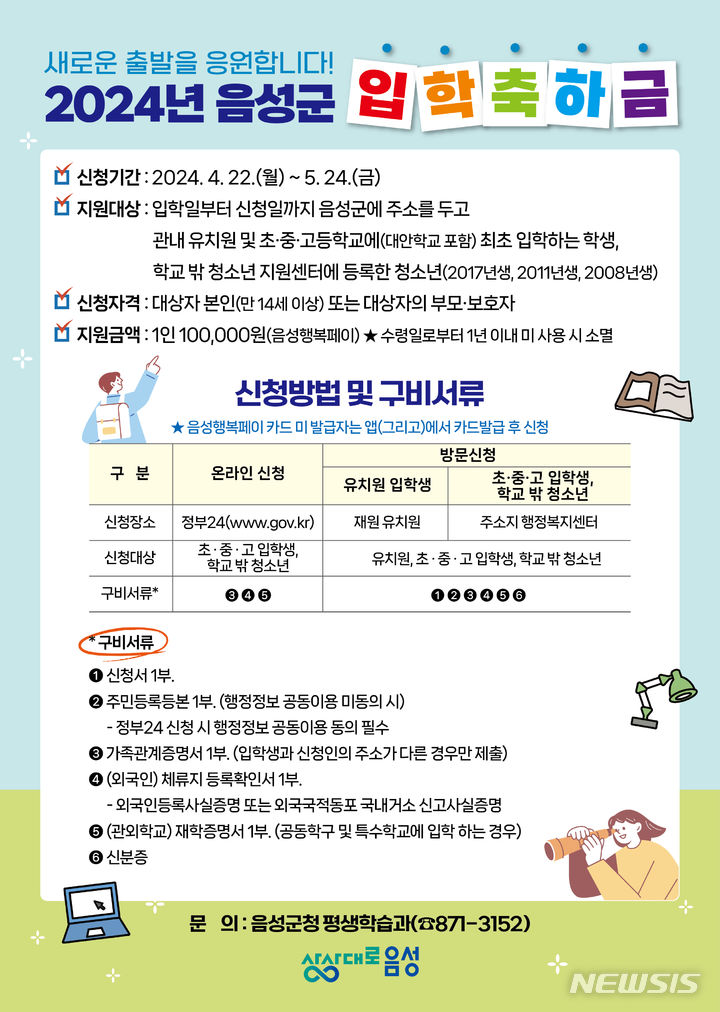[기자수첩]'생사람' 잡는 디지털교도소…이젠 멈출때다
![[기자수첩]'생사람' 잡는 디지털교도소…이젠 멈출때다](http://image.newsis.com/2018/11/07/NISI20181107_0000225992_web.jpg?rnd=20181107161002)
성범죄자 등 흉악범들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사이트 '디지털교도소'. 공개는 찰나의 순간이면 충분하다. 그러나 억울함이 밝혀져도 '일상 복귀'는 얼마의 시간이 걸릴지 모른다. 격투기 선수 출신 김도윤(30)씨 이야기다.
디지털교도소는 지난 7월 김씨를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의 공범으로 지목하고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제보를 받았다는 것이 디지털교도소의 설명이었지만, 당사자인 김씨를 통한 사실 확인은 없었다.
김씨는 즉각 문제를 제기했고, 디지털교도소는 "확실한 확인 없이 업로드가 됐다"며 잘못을 인정하고 정보를 삭제했다.
그런데 삭제된 건 김씨의 이름과 사진일뿐이다. 그를 향한 비난의 화살은 그대로였다. 삭제 이후 한 달이 넘는 시간이 흘렀지만 그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등에는 아직도 악성 댓글들이 달리고 있다.
'마른 하늘에 날벼락'을 맞은 이는 김씨말고도 또 있다.
디지털교도소가 'n번방'의 자료를 요구했다고 지목한 채정호 가톨릭대 의대 교수에게도, '지인 능욕'을 요청했다고 주장한 고려대 재학생 A(21)씨에게도 성범죄자 낙인이 찍혔다.
A씨는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A씨가 생전 억울함을 호소하자, 디지털교도소는 "무죄를 입증하라"고 했다. 갓 성인의 길에 올라선 학생이 감당하기에는 쉽지 않은 일이다.
채 교수는 직접 디지털교도소를 경찰에 고소했다. 자발적인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 경찰로부터 "텔레그램 채팅을 한 인물은 채 교수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는 결과를 받았다. 경찰은 채 교수의 메시지 9만9962건, 브라우저 기록 5만3979건, 멀티미디어 8720건을 살펴본 뒤 이같은 판단을 내렸다.
채 교수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직접 겪어보니 저도 너무 힘들었는데, 젊은 사람에게는 더 쉽지 않았을 것 같다"며 "본인은 좋은 취지로 한다고 해도, 이로 인해 한 생명까지 잃게 되면 아무리 좋은 의도라고 해도 의미가 없다"고 했다.
경찰의 추적 끝에 최근 디지털교도소 1기 운영자가 검거됐지만 사이트는 버젓이 운영되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사이트 전면 차단 조치에도 2기 운영자는 새로운 주소를 통해 디지털교도소를 여전히 운영하고 있다.
디지털교도소는 "범죄자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처벌인 신상공개를 통해 사회적 심판을 받게 하겠다"며 처음 등장했다.
성범죄자 등에 대한 대한민국 법원의 처벌 수위가 약한 점에 분노했고, 그 감정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이해를 하는 것과 옳고 그름은 다른 문제다. 분노의 감정이 '사적 제재'의 이유가 될 순 없다.
헌법이 보장하는 '무죄추정의 원칙', '의심스러울 땐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형사 대원칙.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9명의 범죄자를 처벌하는 것보다 억울하게 처벌 받는 1명의 피해자가 안 나오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법치주의 사회에서 사적 제재가 엄격히 금지되는 근거다.
'사회적 심판'이란 것은 용납될 수 없다. 법원의 처벌이 불만이라면 각 범죄의 법정형을 높일 수 있는 '사회적 운동'에 나서는 것이 법치주의 사회 시민의 자세다. 디지털교도소는 스스로 멈춰야 할 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