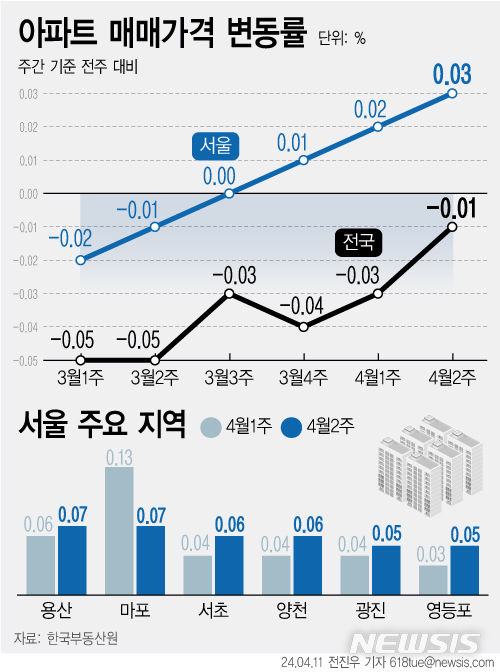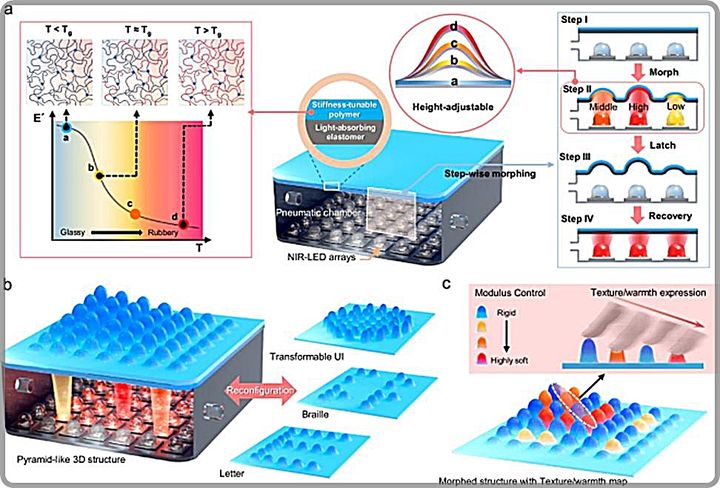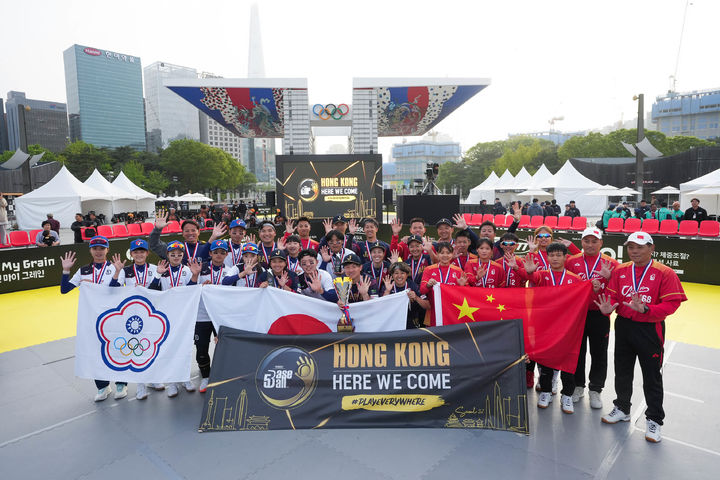"美, 규제비용관리제 폐지에 규제 수·비용 3배 증가"
전경련, 미국 규제비용관리제 운영성과 분석
"제도 시행한 트럼프, 규제비용·수 감축"
"바이든, 해당 제도 폐지…규제비용·수 급증"
![[테네시=AP/뉴시스]지난 6월17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테네시주 내슈빌에서 열린 로드 투 매저리티 콘퍼런스에서 연설하고 있다. 2022.08.16.](http://image.newsis.com/2022/08/14/NISI20220814_0019135396_web.jpg?rnd=20220816060344)
[테네시=AP/뉴시스]지난 6월17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테네시주 내슈빌에서 열린 로드 투 매저리티 콘퍼런스에서 연설하고 있다. 2022.08.16.
[서울=뉴시스]이현주 기자 = 미국의 사례를 볼 때 우리 정부가 도입한 '규제비용관리제'가 제대로 작동하고 지속성을 갖기 위해서는 시행근거를 법률로 상향하고 목표를 세워 규제 비용과 규제 수를 동시에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규제비용관리제는 기업에 대한 규제를 신설할 때 발생하는 비용만큼 기존 규제를 폐지해 규제비용 총량이 늘지 않도록 제한하는 제도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 시절 시행한 규제비용관리제가 뚜렷한 성과를 거뒀지만 행정명령에 근거한 결과 차기 정부에서 폐지된 이후 규제비용과 규제 수가 급증했다고 29일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출범 직후 대통령 행정명령 13771호를 통해 규제를 신설할 경우 기존규제 2개 이상을 폐지하고 신설된 규제로 인한 비용은 폐지되는 규제의 비용으로 상쇄토록 하는 이른바 '투포원룰(2-for-1-rule)'을 도입했다.
부처별로 규제비용 절감목표를 할당해 이를 초과하면 규제신설을 불허하고, 목표달성 불가시 목표 미달 이유와 규모, 목표달성 일정 및 방법 등을 제출토록 하는 등 강력하게 관리했다. 매년 규제비용 감축 목표와 실적도 투명하게 공표했다.
시행 결과 4년간 감축된 규제비용은 총 1986억 달러로 사전에 공표한 목표의 2.5배를 달성했다. 신설규제 1개당 기존 규제 5.5개를 폐지해 규제수 감축 목표도 넘었다.
지난해 출범한 바이든 행정부는 이전 정부와 달리 규제강화 정책을 추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코로나, 경제회복, 기후변화 등 대응을 위해 각 부처가 규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 능력을 제한하는 해로운 정책을 없애기 위해 관련 행정명령을 폐지한다'는 내용의 행정명령 13992호를 발표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규제비용관리제 시행근거인 행정명령 13771호도 폐지되는 행정명령에 포함됐다.
규제비용관리제 폐지 후 1년간 규제비용와 규제 수는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총 규제비용은 2015억 달러로 트럼프 행정부 4년간 합계인 648억 달러의 3배에 달했다는 계산이다.
지난해 신설된 경제적 중요규제는 69개로 역대 행정부 1년차에 비해 1.4~3.1배 많았고, 2년차 신설 계획도 역대 행정부의 1.5~2.2배 수준이다.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도 2016년 7월부터 총리훈령을 근거로 '원인원아웃(one-in-one-out)' 수준의 규제비용관리제를 운영하고 있다.
규제개혁백서에 따르면 이 제도를 통해 6년간 1조3700억원의 순비용을 감축했다. 그러나 부처별 감축목표나 인센티브가 없어 부처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어렵고 규제비용만 관리했기 때문에 규제건수는 오히려 증가했다고 전경련은 지적했다.
현 정부는 지난 6월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원인투아웃(one-in-two-out)' 수준으로 규제비용관리제를 개편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유환익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우리나라 규제비용관리제는 총리 훈령에 근거해 지속가능성에 문제 발생 소지가 있으며, 감축 목표도 없고, 규제건수는 관리되지 않아 성과창출이 제한적"이라며 "규제비용관리제 개편시 제도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해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비용과 규제건수를 동시에 관리해야 한다. 또 부처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부처별 목표설정 및 인센티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