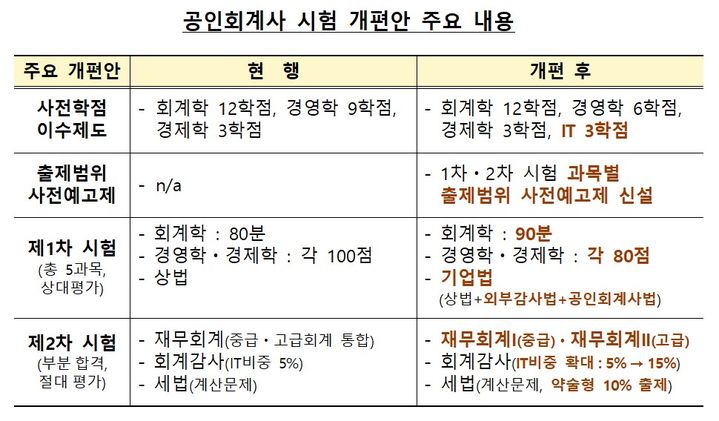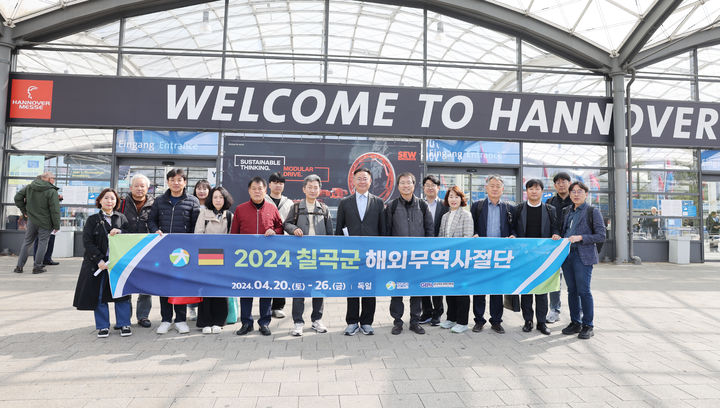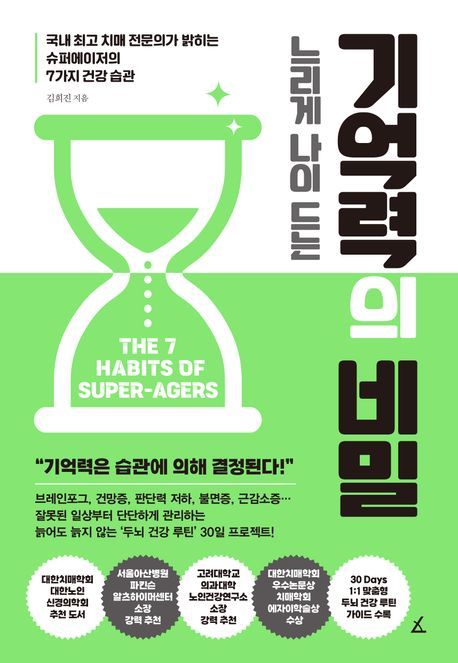[미래생각]복지국가는 조세와 복지의 양날개로 난다

【서울=뉴시스】이채정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
우리나라는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 ▲기본적 인권을 보장할 의무 ▲청원을 심사할 의무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을 위해 노력할 의무 ▲노인과 청소년을 위한 정책을 펼 의무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 등을 헌법에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국민이 '일'을 하여 내는 '세금'으로 '사회보장 및 사회복지의 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복지국가(welfare state)'이다.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복지국가는 '노동하는 인간'이 내는 '세금'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자주 등장하는 것이 영국의 「엘리자베스 구빈법(the Elizabethan poor law of 1601)」이다. 엘리자베스 구빈법의 여러 원칙은 오늘날까지도 사회부조(social assistance)의 작동원리에 적용되고 있다.
엘리자베스 구빈법은 빈곤층을 근로능력이 있는 자, 근로능력이 없는 자, 돌봐줄 사람이 없는 아동으로 구분하였다. 국가가 정한 빈곤선 미만에 해당하는지 판별하는 소득·자산조사(means-test)뿐만 아니라 근로능력을 파악하여 사회부조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일하여 국가에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들에게 일하여 세금을 내는 사람들보다는 낮은 수준으로 생계를 유지하도록 지원하는 열등처우의 원칙(principle of less eligibility)에 따라 사회부조가 제공된다. 이는 우리나라의 사회부조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도 마찬가지이다.
영국에서는 사회적 요구에 대한 국가적 혹은 사회적 대응이라 할 수 있는 사회정책(social policy)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영국 사회정책학회(Social Policy Association; SPA)는 7월8일부터 10일까지 더럼대학교(Durham University)에서 '미래 보장을 위한 사회정책의 도전(Securing the Future: the Challenge for Social Policy)'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SPA 학술대회의 핵심은 통합급여제도(Universal Credit)와 조세(taxation)였다. 발표 논문 중 상당수가 2013년 도입된 통합급여제도에 관한 것이었다. 영국은 근로세액공제, 아동세액공제, 주택급여, 소득보조, 실업수당 등 30여개에 이르는 복지급여를 통합하고 가구당 근로시간이 많을수록 지원액이 증가하도록 복지개혁(welfare reform)을 단행하였다.
영국은 일하지 않아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사회부조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저소득층의 노동시장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그리고 사회부조 제공 수단으로 조세제도에 바탕을 둔 세액공제(tax credit)를 활용하고 있다. 특히 버밍엄대학교의 메이(Margaret May) 박사는 '영국의 조세 및 근로 기반 급여(Taxation and Work-Based Benefits in the UK)'의 역사적 변천에 대한 논문을 통해 조세제도가 현금급여나 사회서비스만큼이나 복지국가의 중요한 정책수단임을 강조하였다.
영국의 저명한 사회정책학자 티트머스(Richard Titmuss, 1907~1973)는 복지체계를 사회복지(social welfare), 기업복지(occupational welfare), 재정복지(fiscal welfare)의 상호보완적인 것으로 정의하였다.
정부의 재정 지출 측면에서 보면 사회복지는 재정의 직접적인 지출인 이전지출(transfer expenditure)로 지원되는 것이며 재정복지는 조세체계 내의 세제혜택, 즉 조세지출(tax expenditure)로 지원되는 것이다. 사회복지와 재정복지는 지출방식은 다르지만 정부 재정과 수혜자들에게 미치는 영향 측면에서 유사한 효과를 가진다.
티트머스의 혜안은 조세를 정책수단으로 하는 '숨겨진 복지국가(hidden welfare state)'를 연구한 미국의 정책학자 하워드(Christopher Howard)로 이어진다. '보이는' 사회정책은 빈곤층을 대상으로 고안되었지만 '숨겨진' 사회정책은 종종 부유한 계층에게 이익을 제공하기도 한다. 따라서 어떤 국가의 복지체계가 사회적 형평을 달성하고 있는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전지출(복지)뿐만 아니라 조세지출(조세)을 통한 사회정책을 함께 살펴보아야 한다.
복지국가의 대전제, 노동하는 인간을 다시 불러내어 보자. 국가는 국민을 '일하지 않아 세금을 내지 못하는 사람'과 '일하여 세금을 내는 사람'으로 나누어 사회정책을 제공한다. 그렇다면 일할 능력은 있으나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사람이 늘어나는 '고용 없는 성장(jobless growth)' 시대의 복지국가는 어떻게 유지되어야 할까?
영국은 일하는 빈곤층에게 조세체계를 통해 더 많은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일하지 않는 혹은 못하는 가난한 사람이 일하도록 압박하는 동시에 장기적으로 이전지출과 조세지출을 비교·분석하여 사회정책을 설계하는 방향을 선택하였다.
우리나라도 일하지 않거나 일하지 못하여 가난한 사람들의 근로유인을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일하여 소득인정액이 빈곤선을 넘게 되면 모든 급여가 중단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2015년 생계, 의료, 주거 급여 등의 기준선을 개별화하는 맞춤형 급여체계를 도입하였다.
또한 저소득 가구에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한 근로장려금을 세금환급의 형태로 지급하는 근로장려세제(Earned Income Tax Credit; EITC)를 확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근로능력은 있으나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고용보험 미가입자를 대상으로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를 2020년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우리나라도 다양한 제도는 갖추고 있지만 제도들 사이의 연계가 부족하고, 연간 47.4조원(2019년 기준 정부 추산)의 조세지출이 발생하고 있지만 누구에게 얼마나 공평한 혜택이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은 부재하다.
한국 정부가 단행해야 할 복지개혁은 거창한 것이 아니다. 정부는 우리나라가 조세와 복지의 양날개로 순항하고 있는지, 혹시 일할 수 없어 가난한 사람보다 일하지 않는 부유층이 조세로 국가 재정에 기여한다는 이유로 더 많은 혜택을 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리하여 복지제도와 조세제도의 부정합에 의한 불평등이 심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낱낱이 살펴봐 주기를 바란다. 이것이 앞으로 백년을 대비하는 복지개혁의 첫단추가 될 것이다.
이채정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