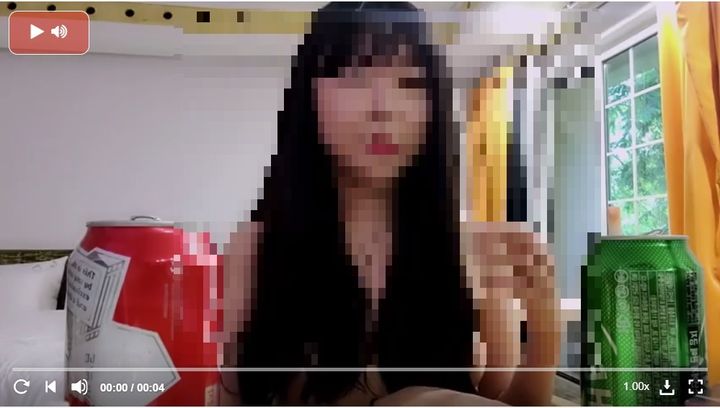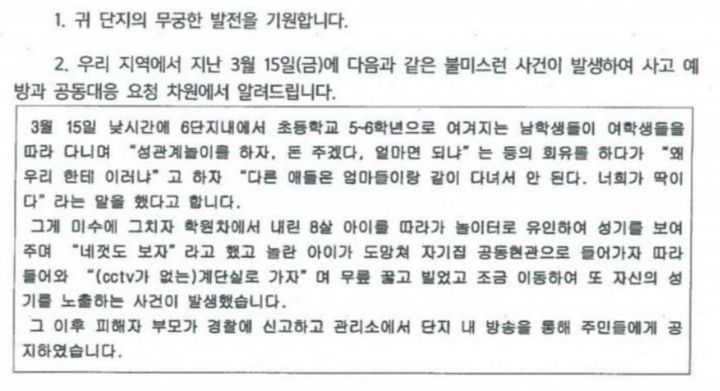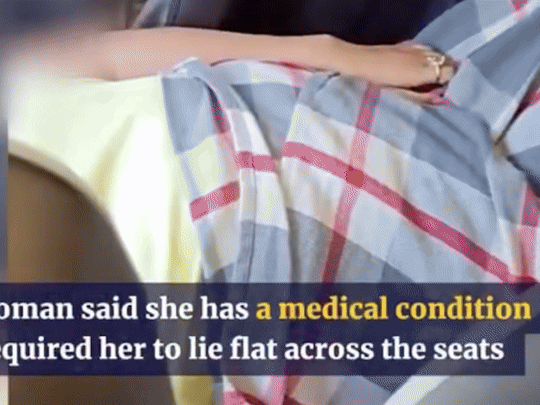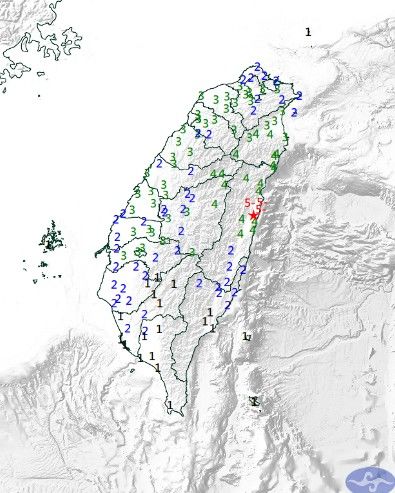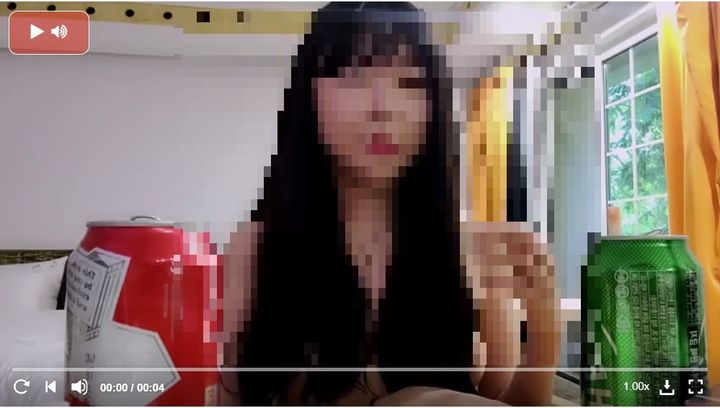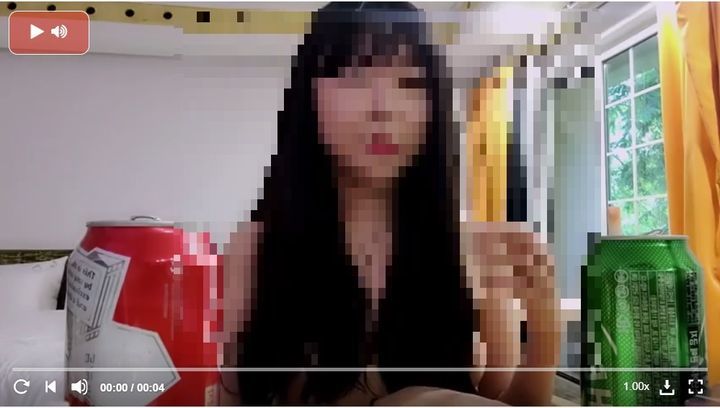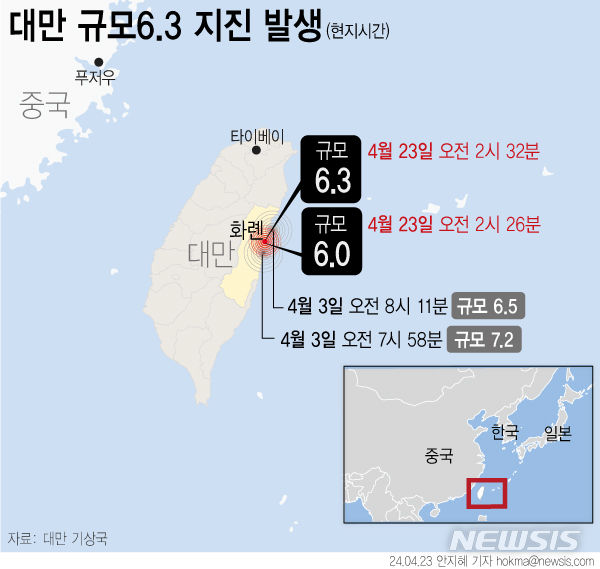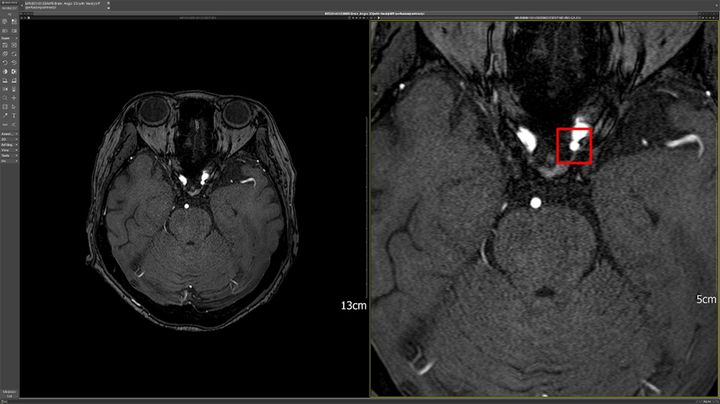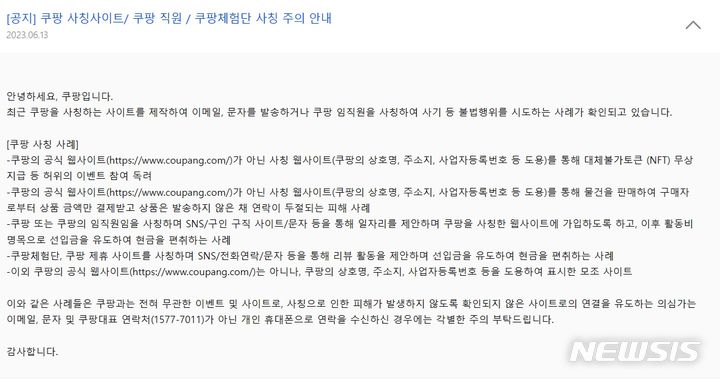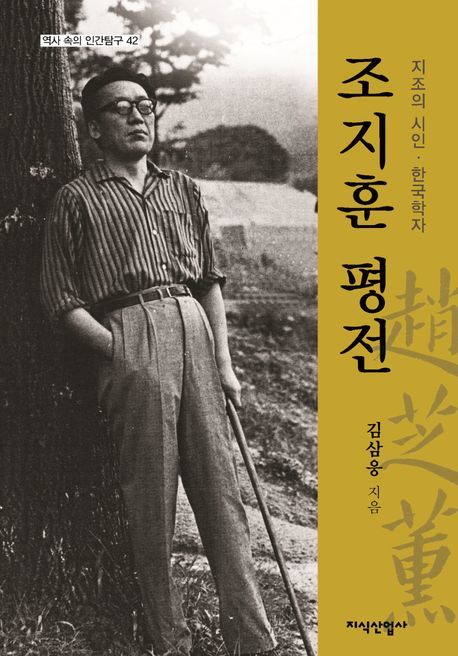'추미애 감찰폭탄' 결국 윤석열 조준…터지나, 불발되나
추미애, 최근 '윤석열 저격' 감찰 3차례 지시
일부 의혹 당사자들은 반발…"사실과 다르다"
법조계 "총장 망신주기…감찰 남발" 우려도
![[서울=뉴시스]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자료=뉴시스DB).](http://image.newsis.com/2020/07/09/NISI20200709_0000560383_web.jpg?rnd=20201028131818)
[서울=뉴시스]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자료=뉴시스DB).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추 장관은 지난 16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옥중서신' 폭로 이후 전날까지 모두 3차례에 걸쳐 감찰 지시를 했다.
추 장관은 먼저 폭로 당일 제기된 의혹에 대한 감찰을 즉각 지시했다. 김 회장이 주장하는 바대로 검사 및 수사관에 대한 로비가 있었는지, 야당 정치인 등의 금품수수 의혹을 제보받고도 이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는지 등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라는 취지다.
22일에는 관련 내용에 대해 추가 감찰을 지시하기도 했다. 윤 총장이 이날 대검 국감에서 해당 의혹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는 취지로 답하자, 이러한 발언에 대한 진위를 파악하라며 추가 감찰 지시를 내린 것이다. 2차 감찰 지시는 사실상 윤 총장을 직접 겨냥한 지시로 풀이됐다.
지난해 서울중앙지검에서 '옵티머스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전날 감찰 지시를 했다. 서울중앙지검에서 이른바 '봐주기' 수사를 한 것은 아닌지, 이 사건 변호인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윤 총장과 긴밀한 관계에 있다는 점을 들어 사건 처리 보고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여부가 감찰 대상이다.
일단 의혹에 연루된 당사자들은 반발하고 있다. 사건 무혐의 과정에 역할이 의심된다고 지목된 '전관 변호사'는 "대표 변호사라 선임계에 이름이 나오기 때문에 관여했을 거라고 추측할 텐데 아무런 관계도 없고, 무혐의 처분된 것도 몰랐다"며 "부장검사는 일면식도 없을 뿐더러, 그 당시 관심도 없던 사건이라 윤 총장에게 전화해서 로비할 사건도 아니었다"라고 해명했다.
당시 수사팀 부장검사였던 김유철 원주지청장도 전날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려 일각에서 제기된 부실·축소수사 및 전관 변호사 역할 논란 등을 해명했다. 김 지청장은 "저나 주임검사가 위 변호인과 접견, 통화, 사적 접촉을 한 사실은 전혀 없고, 이 사건에 관해 당시 검사장이나 1차장검사에게 보고하거나 지시받은 사실이 없다"고 했다.
아울러 로비를 통해 사건을 무마한 의혹을 받는 '전직 검찰총장'으로 거론된 채동욱 전 검찰총장 측도 전날 "어떠한 관여나 역할을 한 것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추 장관의 감찰 지시에 따라 법무부는 대검찰청 감찰부와 함께 합동으로 관련 의혹 감찰에 나설 예정이다. 감찰 결과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윤 총장 입지는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의혹이 사실과 다르다고 결론 날 경우 추 장관 역시 감찰권을 남용했다는 비판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법조계에서는 일련의 감찰 지시 모두가 윤 총장을 겨냥하고 있다는 점을 거론하며 추 장관이 감찰을 고리로 윤 총장 사퇴 압박을 하고 있다는 해석들이 많다. 검찰 안팎에서는 감찰권이 남발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지금의 감찰은 '모욕주기', '망신주기'에 불과하다"라며 "국민 여론으로 내쫓겠다는 건데 총장이 명백히 수사를 축소했다거나 뇌물을 받았다는 정황이 드러나지 않는 이상 현 단계에서 감찰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환우(43·사법연수원 39기) 제주지검 검사는 이날 검찰 내부망을 통해 "목적과 속내를 감추지 않은 채 인사권, 지휘권, 감찰권이 남발되고 있다고 느끼고 있다"며 "먼 훗날 부당한 권력이 검찰 장악을 시도하면서, 2020년 법무부장관이 행했던 그 많은 선례를 교묘히 들먹이지 않을지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