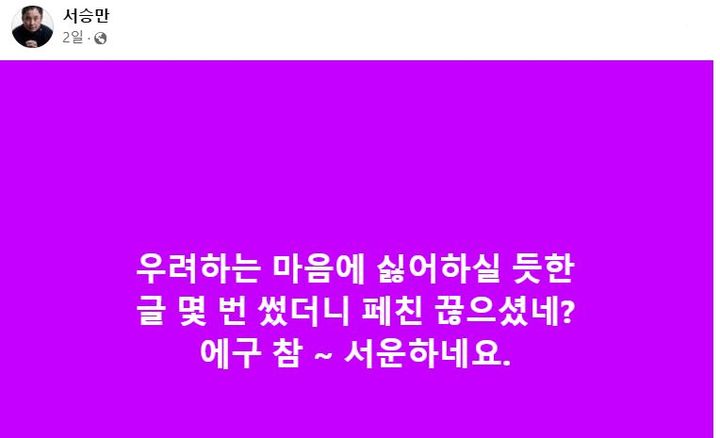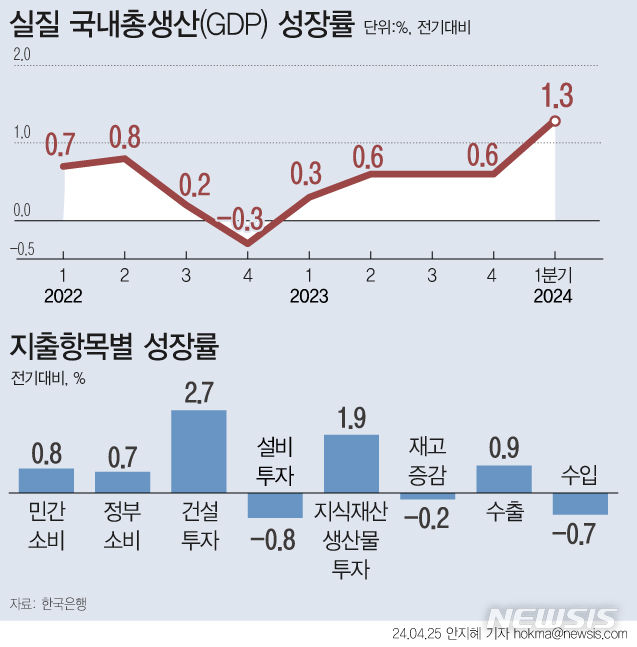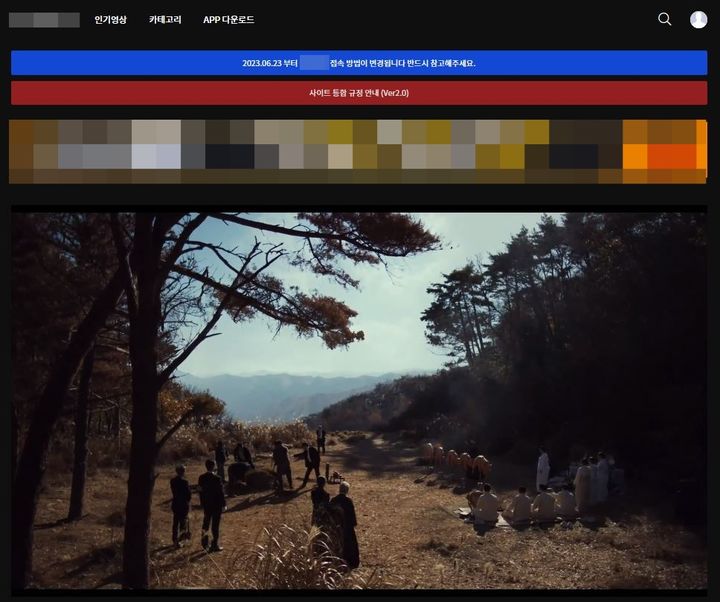유우성 "檢은 '간첩 조작' 관련자 다 불기소"…공수처에 고소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 뒤 '보복기소' 의혹
유씨 측 "檢, 수사하는 척 하다 불기소 처분"
"정직 처분 받은 이시원, 사임하고 사과해야"
"책임·사과없이 공직 발탁은 허용 않을 것"
![[과천=뉴시스] 조성우 기자 =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 씨가 17일 오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민원실 앞에서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보복기소' 의혹 공수처 고소인 조사 출석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05.17. xconfind@newsis.com](http://image.newsis.com/2022/05/17/NISI20220517_0018812719_web.jpg?rnd=20220517144959)
[과천=뉴시스] 조성우 기자 =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 씨가 17일 오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민원실 앞에서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보복기소' 의혹 공수처 고소인 조사 출석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05.17. [email protected]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씨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보복기소' 의혹 관련 고소인 조사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유씨 측 변호인 등은 지난해 11월24일 유씨를 불법 대북송금 혐의로 기소했던 '사건담당 검사'와 '부장·차장 등 지휘검사'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소했다.
고소 대상은 이두봉 인천지검장(당시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 안동완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장(당시 담당검사), 신유철 전 서울서부지검장(당시 서울중앙지검 1차장), 김수남 전 검찰총장(당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알려졌다.
유씨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간첩 조작에 가담한 검사들을 두 차례에 걸쳐 고소·고발했지만 다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며 "검찰은 자기 식구 감싸느라 언론에서 관심을 가질 때 수사하는 척 하다가 슬그머니 불기소처분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시원 전 검사가 공직기강비서관이 된 것은 도저히 피해자로서 받아들이기 너무 힘들고 지금이라도 자리에서 사임하고 사과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보복기소 사건은 이 비서관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계속 (지명)철회를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복)기소 과정에서 이 비서관 등이 어떻게 불법행위를 했는지에 대해 좀 더 진술하려 한다"며 "공수처가 실질적인 조사를 통해 그런 부분을 밝혀줬으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피고소인 중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 거론되는 이두봉 지검장에 대해선 "범죄자를 또다시 어떤 공직에 세우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법을 누구보다 잘 지켜야 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진 범죄에 대해선 책임지지도 않고 사과도 없이 또다른 공직에 발탁되는 건 결코 국민들이 그걸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서울시에서 계약직 공무원으로 일하던 유씨는 지난 2013년 탈북민 정보를 북한에 넘겼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국가정보원의 증거 조작이 드러나면서 무죄를 선고 받았고, 사건을 담당한 검사들은 징계를 받았다. 그 중 한 명이 이 비서관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검찰은 2014년 5월 유씨가 불법으로 북한에 돈을 보내고(외국환거래법 위반) 탈북자를 가장해 서울시 공무원에 임용됐다며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별건 기소했다.
그런데 검찰은 2010년 3월 유씨의 불법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해 기소유예 처분한 바 있었다. 이에 유씨에 대해 검찰이 '보복 기소'를 했다는 논란이 빚어졌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유씨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만 인정하고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공소권 남용을 이유로 공소를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이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인정한 첫 사례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