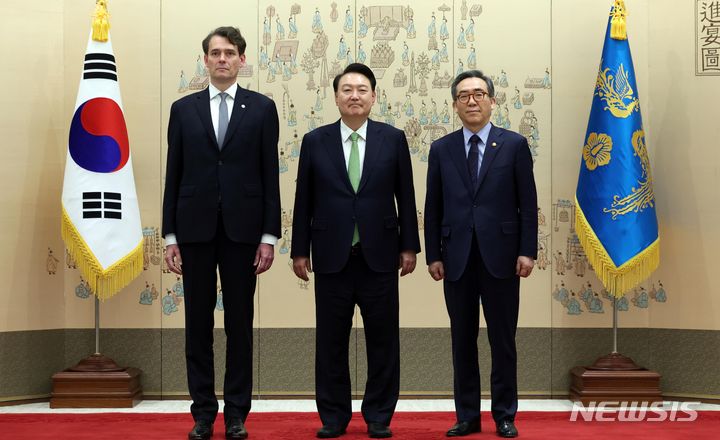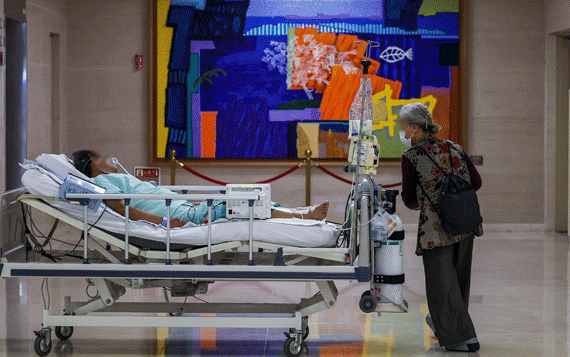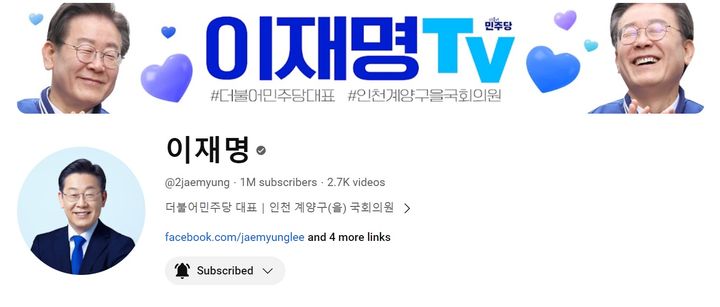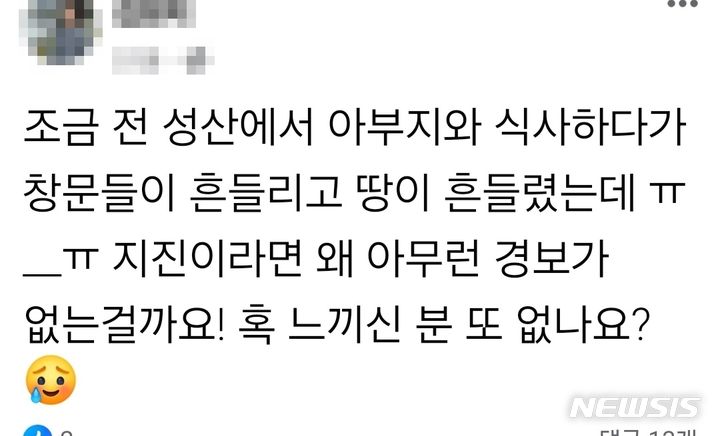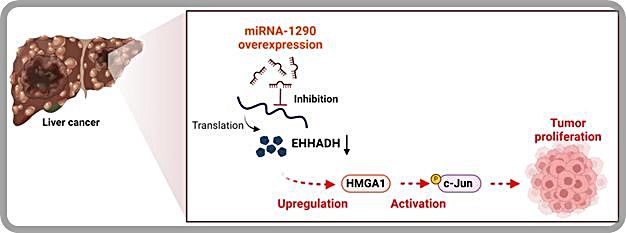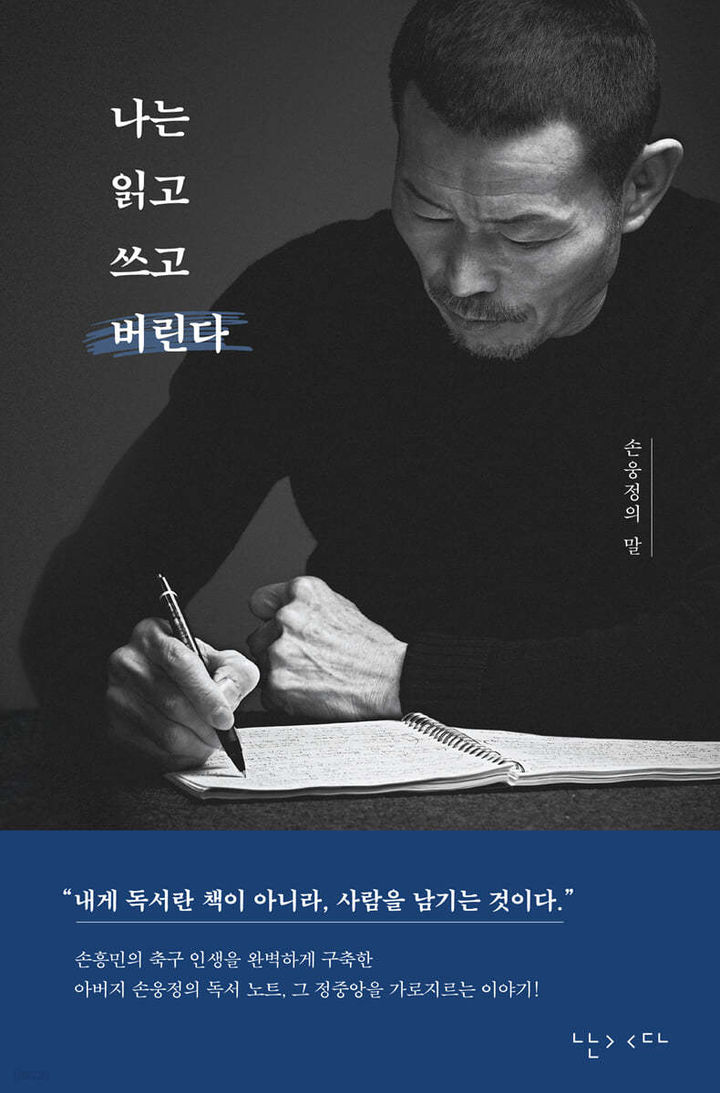[자본확충펀드 출범 한달①]'딱한' 자본확충펀드…실효성 의문에 폐지 주장까지

【서울=뉴시스】정필재 기자 = 국책은행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자본확충펀드가 공식 출범한지 한달이 됐다.
4월 총선 이후 정부와 한국은행의 입장 차이로 올 상반기 최대 이슈로 부각됐던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 문제는 6월 8일 ‘관계기관합동’ 명의로 설립 계획이 발표됐다. 이어 7월1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이를 의결함으로써 공식적으로 첫발을 내딛게 됐다.
하지만 한달이 지난 지금 자본확충펀드는 무용지물이 되는 분위기이다. 국책은행의 자본확충은 추가경정예산에 이미 반영된 터라 펀드에 손 벌릴 일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게다가 시중이자보다 더 높은 이자가 책정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책은행들도 급할 게 없다는 입장이다.
결국 자본확충 펀드는 실효성 문제에 직면하면서 써 보지도 않은 채 금융권과 정치권을 중심으로 폐기 주장이 나오는 딱한 처지를 맞고 있다. 그토록 난리치면서 왜 만들었는지 의문이 제기되는 형국이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책은행의 구조조정 지원을 위해 조성된 자본확충 펀드가 실제 사용될 확률은 매우 낮아졌다.
산은은 현대상선과 한진해운이 최악의 경우를 맞이해도 이를 떠안을 여력이 있다고 자신하고 있다. 해외 신용평가사도 같은 시각이다.
수은의 경우 올해 정부로부터 2조원의 출자와 함께 산은에게 5000억원을 수혈 받으며 건전성을 끌어 올렸다.
정부와 지원을 놓고 대립각을 세웠던 한국은행은 자본확충펀드가 구조조정 지원이 아닌 국책은행이 자본 부족으로 생길 국민경제와 금융 시스템 불안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한 안전판이라는 입장이다.

한은은 또 국책은행의 도덕적 해이와 국책은행의 시장을 통한 자본확충 노력을 선행하고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시장 실세금리 이상의 이자를 적용할 방침이다.
또 정부가 충분한 규모의 국책은행 출자와 펀드 보유자산의 처분 등을 통해 한은의 대출금이 조기회수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은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금융안정 역할에 참여하는 것"이라며 "산은과 수은의 경영상황에 초점이 맞춰졌지만 정부 출자가 이뤄져 실제 펀드가 현실화 될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국책은행 관계자는 "펀드 조성 전 부터 실효성에 대한 의문은 나왔다"며 "이자도 높고 이용할 경우 국민들의 시선까지 모아질 텐데 선뜻 펀드를 선택하기 부담스러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쯤 되니 정치권에서도 국책은행 자본확충 펀드에 대한 폐기 주장이 나오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주현 의원(국민의당)은 지난 27일 본회의 연설에서 "자본확충 펀드가 조성된 뒤 국책은행 자본확충을 위한 추경이 편성됐다"며 "추경 예산안 심의에서 국책은행 자본확충 펀드 폐기의견을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민병두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IMF 외환위기 당시 국민들은 국가와 대기업의 실패를 금모으기 운동으로 메워줬지만 이제 그러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구조조정 대책으로 마련한 자본확충 펀드는 은행법 등 위법성이 있어 보인다"며 "부실 대기업에 지원에 치중한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