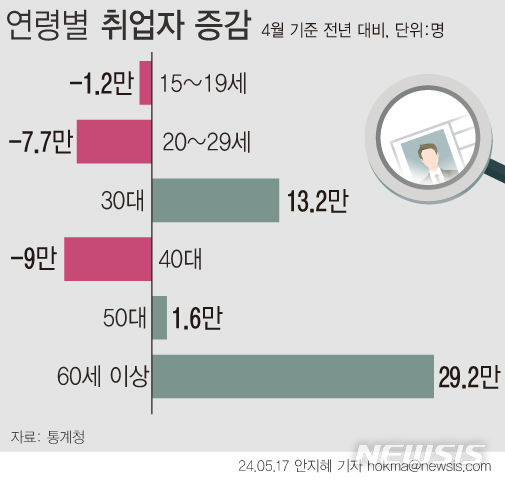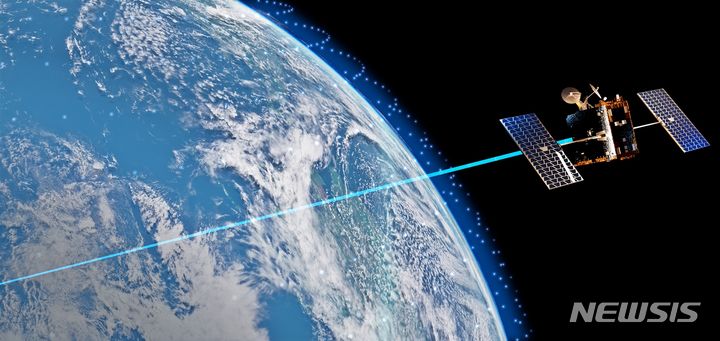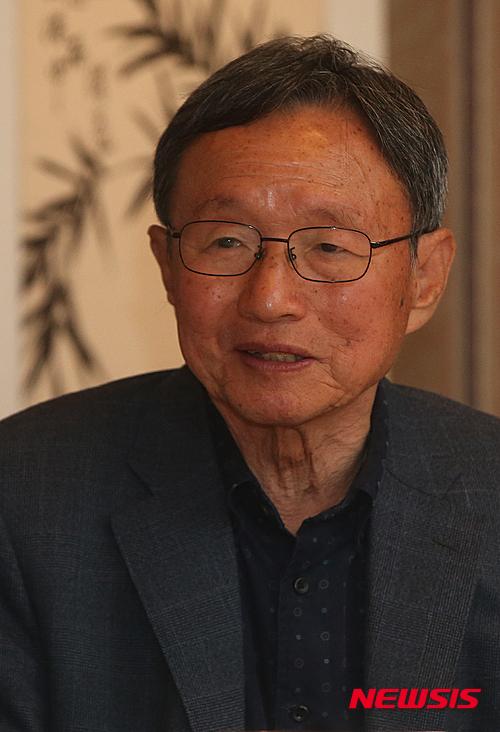北신문 "南, 개성·금강산 입도 벙긋 못해…남북합의 휴지장"
"한미워킹그룹 덥석 받고 사사건건 백악관에 바쳐"
"굴종적인 상대와 더 이상 민족 미래 논할 수 없어"
![[서울=뉴시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8일 "남조선 당국과 탈북자들의 반공화국 적대행위를 규탄하는 노동계급과 직맹원들의 항의군중집회가 7일 개성시 문화회관 앞마당에서 진행됐다"고 밝혔다. 2020.06.08. (사진=노동신문 캡처) photo@newsis.com](http://image.newsis.com/2020/06/08/NISI20200608_0000540695_web.jpg?rnd=20200608085732)
[서울=뉴시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8일 "남조선 당국과 탈북자들의 반공화국 적대행위를 규탄하는 노동계급과 직맹원들의 항의군중집회가 7일 개성시 문화회관 앞마당에서 진행됐다"고 밝혔다. 2020.06.08. (사진=노동신문 캡처) [email protected]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2일 '고질적인 사대와 굴종의 필연적 산물'이라는 제목의 정세론해설을 신문 6면에 게재하고 "최악의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현 북남관계와 관련해 남쪽에서 참으로 괴이하기 짝이 없는 소리들이 연일 울려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남조선 당국자들은 미국의 결단이 '적대관계 해결의 열쇠'라느니, 미국의 설득이 필요하다느니 하는 따위의 엉뚱한 나발을 늘어놓고 있다"며 "며칠 전에는 북남합의를 운운하던 끝에 국제사회의 동의를 얻어가는 노력을 꾸준히 하겠다는 황당한 소리까지 쏟아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아무리 상전(미국)의 눈치를 보면서 오금저리게 살아가는 가련한 처지이기로서니 북남관계가 오늘과 같은 파국에 이른 마당에 와서까지 제 집을 난도질한 강도에게 구걸의 손길을 내민단 말인가"라며 "그야말로 사대와 굴종에 쩌들대로 쩌든 자들만이 벌려놓을 수 있는 망동이 아닐 수 없다"고 했다.
아울러 신문은 "벼랑 끝에 몰린 현 북남관계는 남조선당국의 고질적인 사대와 굴종의 필연적 산물"이라며 "북남관계 문제의 당사자는 어디까지나 우리 민족이다. 민족자주의 입장을 고수해나가는 데 북남관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나갈 수 있는 근본비결이 있다"고 강조했다.
신문은 특히 "남조선당국은 친미사대의 올가미를 스스로 제 목에 걸어놓았다"며 "상전이 강박하는 '한미 실무그룹(워킹그룹)'이라는 것을 덥석 받아물고 사사건건 북남관계의 모든 문제를 백악관에 섬겨 바쳤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시스] 북한이 대남전단 제작하는 모습. 2020.06.20. (사진=노동신문 캡처)](http://image.newsis.com/2020/06/20/NISI20200620_0000548493_web.jpg?rnd=20200620081052)
[서울=뉴시스] 북한이 대남전단 제작하는 모습. 2020.06.20. (사진=노동신문 캡처)
그러면서 "남조선 당국자들도 저들의 미련한 행동이 북남합의에 대한 난폭한 위반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모를리 없었을 것"이라며 "그러나 북남합의보다 '동맹'이 우선이고 '동맹'의 힘이 평화를 가져온다는 맹신과 비굴한 추종이 남조선을 지속적인 굴종과 파렴치한 배신의 길로 이끌었다"고 했다.
또 신문은 "미국과 보수패당의 눈치만 살피며 주견을 세우지 못한 남조선당국의 우유부단하고 온당치 못한 태도로 하여 그토록 훌륭했던 북남합의들이 한걸음도 이행의 빛을 보지 못하고 휴지장이나 다름없이 되어버렸다"며 "그것은 오늘의 참혹한 후과로 되돌아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토록 비굴하고 굴종적인 상대와 더이상 민족의 운명과 미래가 걸린 북남관계를 논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가 다시금 내리게 되는 결론"이라며 "하늘이 만든 화는 피할 수 있어도 제가 만든 화는 피할 수 없다는 말이 있다. 동족을 배반하고 사대와 굴종의 길로 줄달음치는 배반자, 역적무리에게는 비참한 종말밖에 차례질 것이 없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