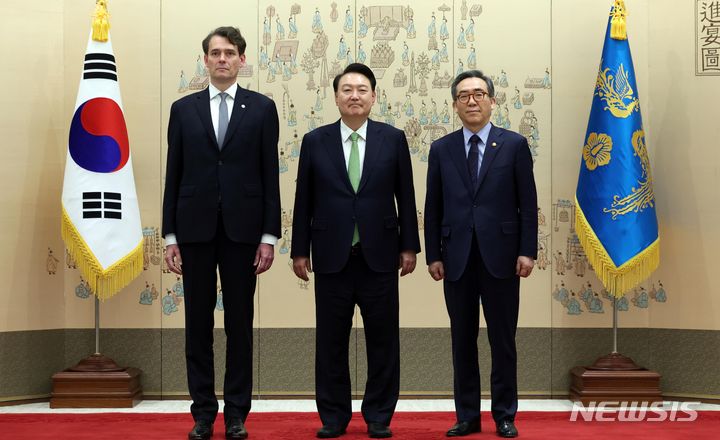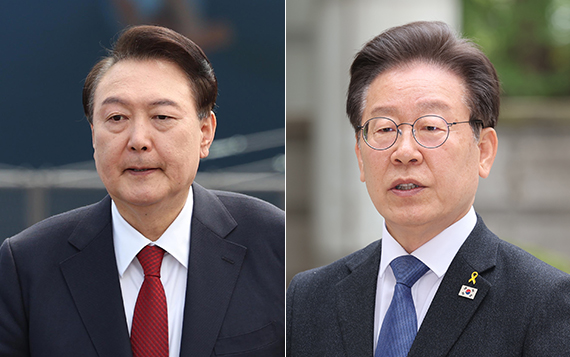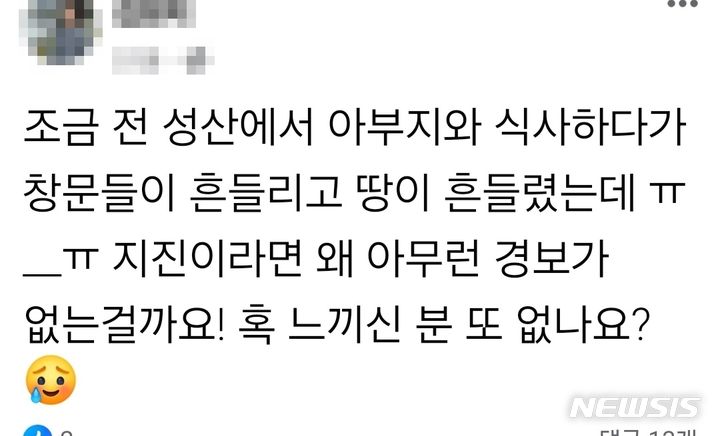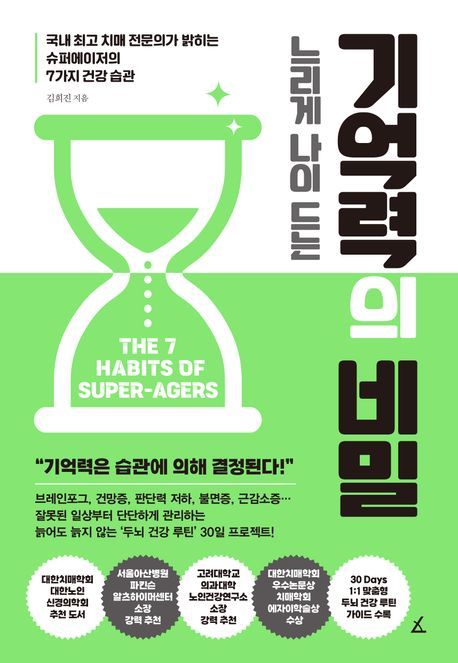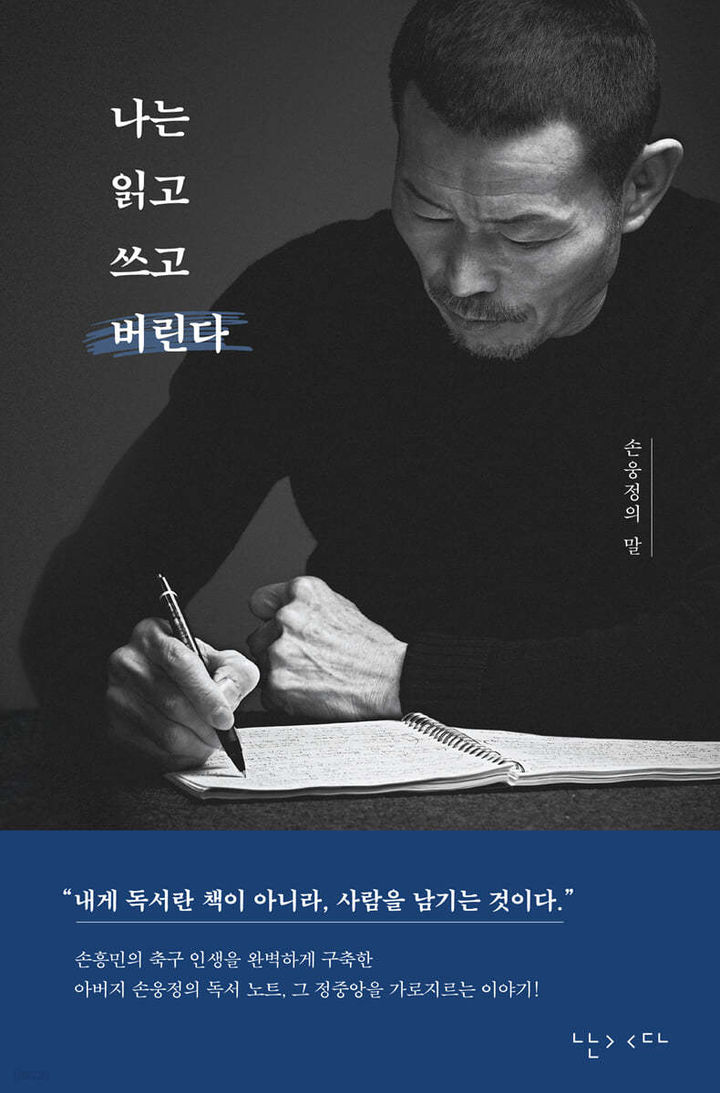[기자수첩] ‘떠나가는 배' 처럼 떠난 박종철 열사 父子

【부산=뉴시스】허상천 기자 = 자료사진. [email protected]
공권력의 고문으로 1987년 1월 14일 아들을 하늘나라로 먼저 보낸 이후 30여년을 민주화를 위한 삶을 살아 온 그의 빈소에는 '참회의 조문객'이 줄을 이었다. 장례는 민주시민장으로 치러져 경기도 남양주시 마석 모란공원 민주열사 묘역의 아들 곁에 안장했다.
그는 생전에 가슴에 묻은 아들이 너무 보고 싶을 때는 ‘떠나가는 배’(정태춘 노래)를 불렀다. 아들 종철이 고등학교를 다닐 때부터 썩 잘 다루던 기타를 치면서 즐겨 부르던 노래다. 하도 자주 들어서 그도 귀에 익은 가락이지만 "그 노래를 부르면 자꾸 눈물이 나서 가슴으로 응얼거리다 만다"고 기자에게 말한 적이 있다.
노래 가사처럼 박종철 열사는 ‘겨울비 젖은 돛에 가들 찬바람 안고서 언제 다시 오마는 허튼 맹세도 없이’ 먼저 갔다.
그리고 30여년 후 그의 아버지도 노랫말 처럼 ‘남기고 가져 갈 것 없는 저 무욕의 땅을 찾아 가는 배여, 언제 우리 다시 만날까’라며 따라갔다.
박종철 열사 사망사고 사흘만에 귀신에 홀린 듯이 서둘러 아들의 장례를 치른 뒤 심야 열차를 타고 부산에 도착한 그날 17일 기자는 박정기씨를 첫 대면했다. 입술을 깨물고 망연자실한 채 침묵하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하다.
아들이 억울한 죽음을 당했지만 서슬 퍼렇던 군사정권은 오히려 시국사범으로 몰아붙여 함구령까지 내리는 바람에 한 마디 하소연조차 할 수 없었던 것이다. 부산시 수도국의 영도 청학양수장 주임이던 그는 사망 원인도 알지 못한 채 죄인인양 울분을 삭여야만 했다.
당시 경찰은 박종철 열사의 흔적을 깡그리 지우려 했다. 박 열사 사망 후 치안본부 대공수사관들이 부산의 집에 들이닥쳐 시국사건 관련 증거물을 찾는다며 집안을 샅샅이 뒤지고, 사진 등 손때 묻은 유품을 모두 압수해갔다. 이 때문에 가족들도 박종철 열사의 대학 시절 사진이나 유품이 거의 없다.
고문으로 숨진 다음날 15일 오전 9시께 기자가 청학양수장으로 전화를 걸어 그의 누이 은숙씨로부터 ‘치안본부 대공분실에서 14일 숨진 학생이 박종철’이라는 사실을 최종 확인, 첫 보도한 그 때도 수사관들이 집안을 뒤지고 있었다.
경찰은 “책상을 ‘탁’ 치니 ‘억’ 하고 죽었다”며 단순 쇼크사로 위장하려 했으나 ‘물고문' 사실이 들통나면서 정권 규탄 시위를 촉발하며 6월 민주화 항쟁의 직접적인 도화선이 됐다. 이 사건은 영화 '1987'을 계기로 재조명되면서 주목을 받고 있다.
이제 ‘떠나가는 배’의 노랫가사처럼 ‘봄날 꿈같이 따사로운 저 평화의 하늘나라’에서 부자가 만나 잘못된 역사가 할킨 상처를 치유하고 따뜻한 가슴으로 보듬어 주는 극적인 상봉을 기대해 본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