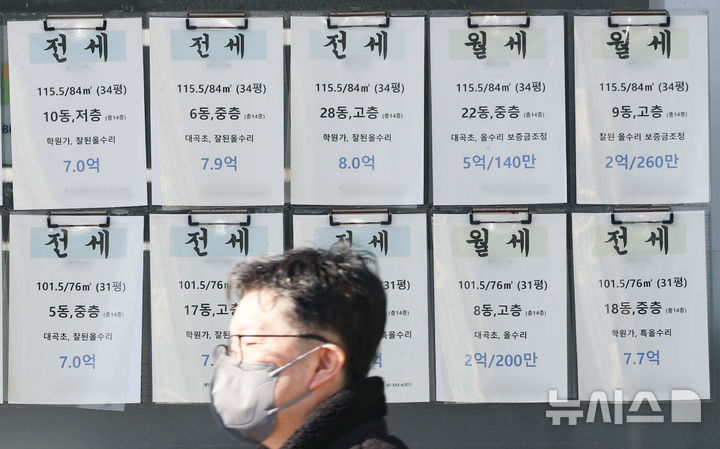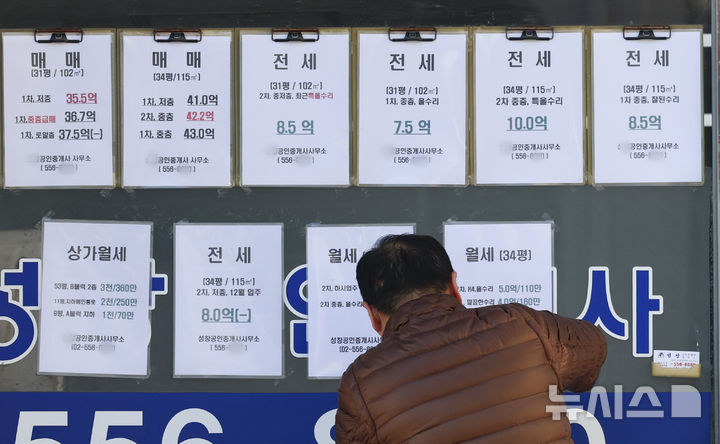미 임산부 살해후 뱃속 아기 탈취한 공범 남성에 종신형
여친 살인에 동조, 이웃 산모 시신 강에 버려
노스 다코타 경찰에 '늑장수사' 비난

【파고( 미 노스 다코타주) = AP/뉴시스】 올 9월 27일 재판에서 증언하고 있는 임산부 살해 태아 탈취 공범자 윌리엄 호엔(33). 그는 여자친구가 범행하는 것을 돕고 경찰에 거짓말을 한 혐의로 10월 29일 법정 최고형인 종신형을 선고 받았다.
그는 산모를 죽이고 아기를 자궁에서 잘라내는 것을 돕고 경찰에 거짓말을 한 죄로 기소됐으며, 법정에서는 피살자의 어머니가 절대로 그를 감옥에서 나오지 못하게 해달라고 호소하는 증언을 했다.
피살된 사바나 그레이윈드 (22)의 어머니 노베르타 그레이윈드는 용의자 윌리엄 호엔(33)에게 종신형을 내려 달라며 "그는 우리 가족을 배신하고 우리 딸이 자기 아파트에서 죽어 있는데도 뻔뻔하게 우리와 얼굴과 시선을 마주 대하고 있었다. 제발 이 자를 다시 감옥에서 나올 수 없게 해 달라"고 울부짖었다.
지난해 8월에 저지른 살인 공모 및 방조죄에 대해 호엔은 지난 달 무죄 판결을 받았다. 그의 동거녀인 브루크 크루스는 자기가 그레이윈드의 뱃속에 든 아기를 잘라낸 사실을 시인해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 받고 현재 복역중이다.
호엔은 크루스가 그레이윈드를 죽이고 아기를 탈취하는 것을 전혀 몰랐다고 부인했지만 여자친구는 그가 아파트에 들어와서 아직 피를 흘리며 살아 있는 그레이윈드를 보고 목을 밧줄로 졸라 숨을 끊었다고 증언했다. 검시관은 이 산모의 사인이 질식사인지 출혈과다인지 판정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호엔은 재판에서 자신의 행동은 "정당화하기 불가능한 행위였다"고 사과하면서 "그런 참극을 미리 막을 수도 있었는데, 오히려 도움을 주어 사태를 악화시켰다"고 시인했다. 그는 여자친구 크루스가 자신과 헤어지기 싫어서 거짓 임신한체 한 것을 알아냈고, 그렇다면 아기를 진짜로 낳으라고 명령했다고 말했다. 이에 다급해진 크루스가 극단적인 수단을 생각해낸 것이라고 했다.
호엔은 애초에 공모혐의와 거짓 진술을 이유로 21년 형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하지만 톰 올슨 재판장은 29일 재판에서 호엔이 위험한 범죄자라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가석방을 허용하는 종신형으로 형량을 결정했다.
징역 7년을 요구했던 그의 변호사는 언론과 연락이 되지 않고 있다.
피살된 산부의 어머니는 피해자 진술에서 " 우리 딸은 착한 딸이었고 좋은 엄마가 될 예정이었다. 이 남자가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짓을 해서 우리 가족을 파괴했다. 매일 매일의 삶이 지옥같다"고 말했다.
한 편 현지 경찰은 세 번이나 범인들의 아파트를 수색했지만 엄마의 시신과 아기를 찾지 못했고 나중에야 아기를 찾아서 아기 아빠에게 인계했다. 시신은 비닐에 싸여 레드리버 강에 버려졌다가 며칠 뒤 카약을 타던 사람들에 의해서 발견되었다.
이로 인해 유가족과 주민들은 경찰의 늑장 수사에 분노하고 있고 검사도 재판 후 법원 앞에서 " 어떻게 경찰이 그렇게 늦게 사바나의 시신과 아기를 찾아 냈는지, 이 것은 정말 답변이 필요한 문제이다"라고 경찰을 비난했다.
이에 대해 파고 경찰서 데이비드 토드 서장은 애초에 경찰은 숨겨진 시신이 아니라 실종자를 찾는 수사를 했기 때문이라면서, 이후 경찰은 수십명의 경찰관과 항공기, 보트, 경찰견등을 동원해서 수색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