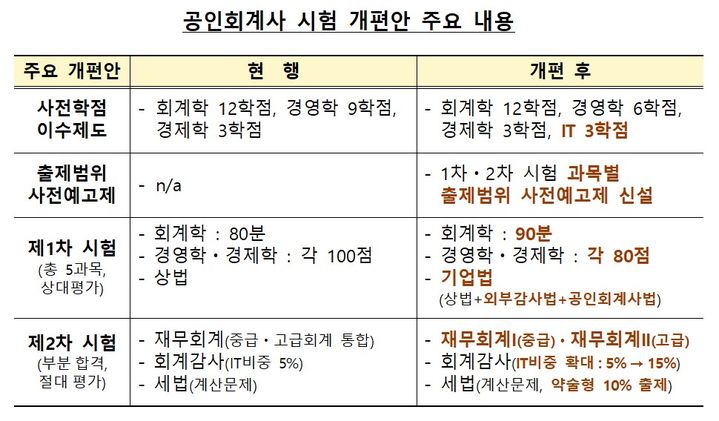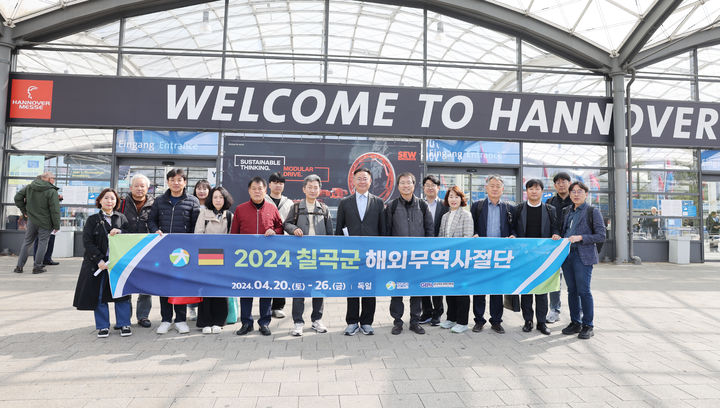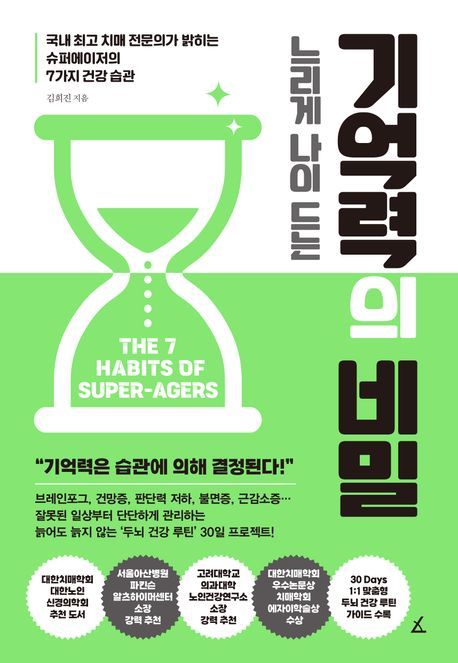검·경, 이번엔 '사망자 휴대폰' 갈등…역대 충돌 사례는
'靑특감반원 유품' 경찰 신청 영장 기각
신경전 표면화…실력 행사 국면 가능성
과거 충돌 빈번…영장관련 문제 수두룩
집단 지휘거부 등 사례도…현수사 주목

5일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검은 서울 서초경찰서가 신청한 전 특감반원 A씨 휴대전화와 이미지 파일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은 전날 오후 검찰에 있는 고인의 휴대전화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신청했다. 이는 앞서 검찰이 서초서에서 확보한 압수물 등으로, 경찰이 수사 중이었던 변사 사건 당사자 유품에 해당하기도 한다.
즉, 검찰이 경찰 상대 압수수색을 통해 변사자 유품을 압수하고 다시 경찰이 그 대상물에 대해 검찰 상대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검찰이 무산시킨 장면이 연출된 것이다.
검찰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의혹 규명을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는 입장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검·경이 서로를 상대로 강제력을 동원하려는 상황을 두고 신경전이 표면화한 것으로 해석하는 견해도 적지 않다.
특히 수사권 구조 조정 관련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 현실화가 목전이라는 예상이 있는 가운데 기관 간 대립이 실력 행사 국면으로까지 번질 가능성을 내다보는 시선도 있다.
이 사건 이전에도 수사권 구조 조정 등과 맞물려 검·경이 갈등한 경우는 다수 있었다. 주로 경찰이 신청한 영장 청구 여부에 대한 신경전 형태였다.
울산에서 있었던 '고래고기 환부사건'은 비교적 최근에 발생한 검·경 마찰의 대명사격으로,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인 지난해 김 전 시장 측근 비리 의혹 사건 수사 또한 주요 갈등 사례로 꼽힌다.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와 서지현 수원지검 성남지청 부부장검사 등이 경찰에 김수남(60·16기) 전 검찰총장 등 전·현직 검찰 간부를 고발한 사건에서도 부산지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신청은 연이어 제동이 걸렸다.
아울러 지난해 4월 대림산업 하도급 갑질 사건 증거 조작 문제, 6월 원영이 사건과 관련한 진실 공방 등도 검·경이 신경전을 벌였던 지점이었고 '드루킹 사건' 경찰 단계 수사에서도 영장 기각 문제를 두고 대립 국면이 형성됐다.

이 또한 수사권 구조 조정 국면에서 이뤄진 것으로, 당시 경찰은 검찰 접수 내사·진정 사건에 대한 접수를 거부할 수 있다는 등 17개 조항으로 구성된 수사실무지침을 일선에 배포했다.
검·경 갈등이 상당했던 2005년에도 수사 현장에서 충돌이 있었는데, 경찰관이 긴급체포된 피의자에 대한 대면조사를 위한 인치명령을 거부한 사례 등이 있었다.
이와 관련해 법원은 검찰 손을 들어줬는데, 일각에선 해당 판결이 검·경 지휘를 상하관계 구조로 봤던 당시 검찰청법에 배경한 것으로 2011년 법 개정 이후에는 대등관계가 됐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한편 갈등이 표면화되면서 현재 검·경이 진행 중인 상대 기관 조직 또는 전현직 수뇌부 등 관련 수사 방향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미 검찰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정치개입 및 불법 사찰 사건 등을 다루면서 경찰청을 압수수색하고 강신명 전 경찰청장을 구속하는 등 전현직 수뇌부 상대 수사를 전개했다.
최근 논란인 울산시장 측근비리 의혹 수사와 관련해서도 첩보 이첩 및 보고 등 경위 파악 과정에서 경찰 상대 강제수사 가능성이 상당한 것으로 점쳐진다.
반면 경찰은 임 부장검사 등이 제기한 전현직 검찰 수뇌부 대상 수사,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 관련 윤석열 검찰총장 상대 고발 사건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