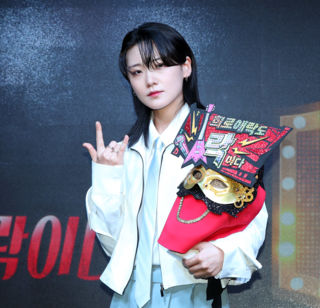신동빈 "직접 청탁할 이유 없다"…뇌물 혐의 무죄 주장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결심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7.12.14. [email protected]
검찰 "현안 청탁" 징역 4년·추징금 70억 구형
【서울=뉴시스】강진아 이혜원 기자 = '국정농단 실세'인 최순실(61)씨와 함께 기소된 신동빈(62) 롯데그룹 회장이 14일 최후진술에서 "부디 억울한 점이 없도록 잘 살펴달라"고 말했다.
신 회장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자신의 뇌물공여 혐의 결심공판에서 최후진술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신 회장은 "공정한 재판 진행을 통해 충분히 변론할 기회를 주고 경청해주신 재판장과 두분 판사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부디 억울한 점 없도록 잘 살펴달라"고 요청했다.
신 회장 측은 검찰이 롯데를 강요죄 피해자라면서 면세점 특허 취득과 관련해 70억원의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신 회장 변호인은 "롯데가 월드타워 면세점 특허권 취득을 위해 대통령에게 청탁하고 그 대가로 70억원을 지원했다는 뇌물죄와 청와대 강요로 어쩔 수 없이 줬다는 것이 과연 양립할 수 있는 건지 변호인으로선 납득하기 어렵다"며 "공익적 차원으로 어쩔 수 없이 지원했을 뿐 면세점 관련 대가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해 3월14일 대통령 면담 당시 면세점 특허수 확대 정책은 이미 관세청과 기획재정부, 청와대 협의로 사실상 정해진 상태로 신 회장이 굳이 직접 나서서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에게 특허수를 추가해달라고 별도 요청할 사항은 아니었다"며 "청탁의 절실함이 있다는 검찰 주장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신 회장과 박 전 대통령 면담 당시 안 전 수석은 대통령에게 면세점 청탁 관련 얘기를 들은 바 없고 수첩에 기재되지도 않았다"며 "신 회장이 면담하기 며칠 전 면세점 청탁을 했다는 안 전 수석 진술은 일관성이 없어 신뢰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안 전 수석은 롯데와 관련해선 기소 대상에서 혼자 제외됐다"며 "이 역시 진술의 신빙성에 상당한 의미를 갖는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결심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7.12.14. [email protected]
아울러 "롯데는 5대 거점 지원 사업을 다른 기업과 같이 하는 것으로 알았고 면세점 대가라고 인식하고 지원한 것이 아니다"며 "청와대 주도로 공익 목적을 위해서라고 생각해 할 수 없이 지원했다"고 덧붙였다.
신 회장은 최씨와 공모한 박 전 대통령에게 지난해 롯데 면세점 신규 특허취득 등 경영 현안을 청탁하고 K스포츠재단에 하남 체육시설 건립비용 명목으로 70억원의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날 "신 회장은 롯데 경영 지배권 확보를 위해 면세점 등 현안을 청탁하고 대통령 요구에 막대한 자금을 뇌물로 제공했다"며 징역 4년에 추징금 70억원을 구형했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