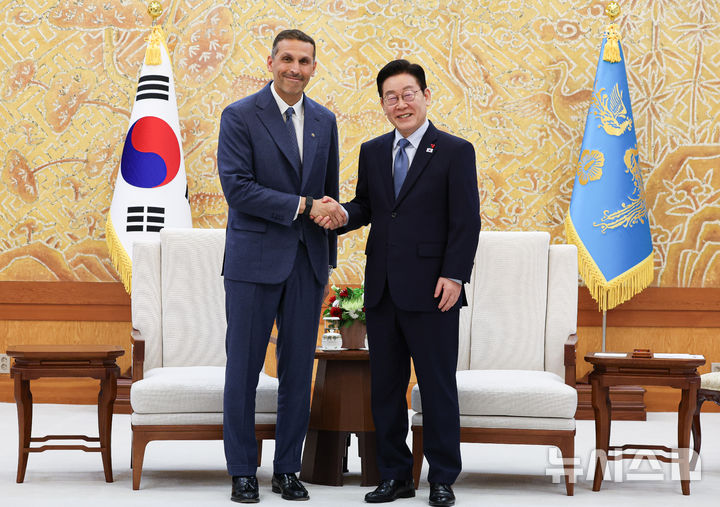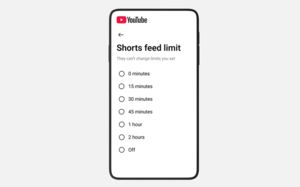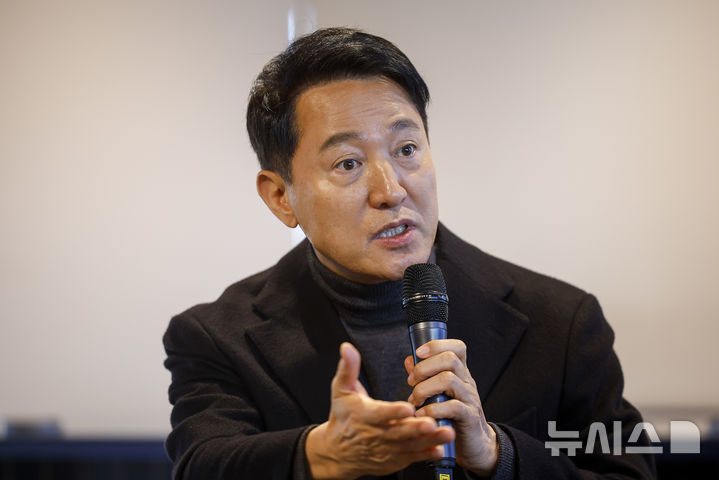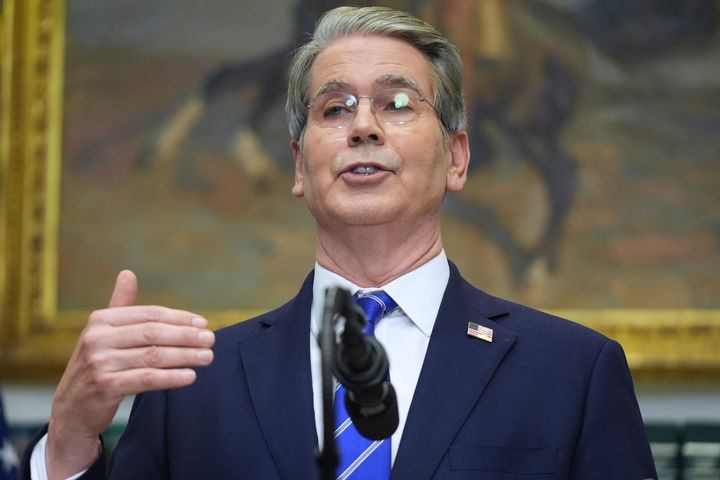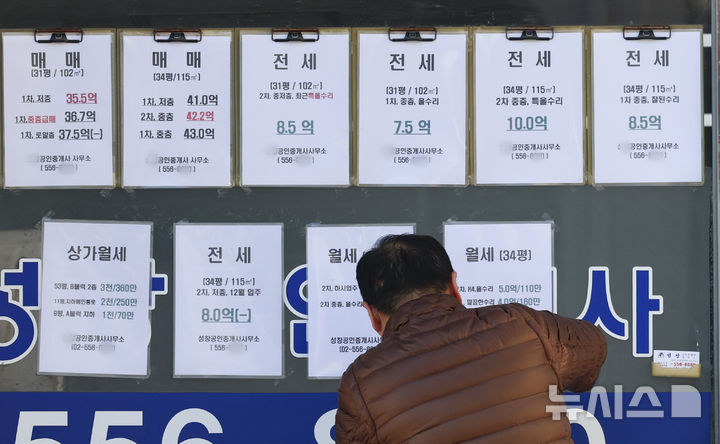세계 소멸과 존재 몰락, 시인 안희연 '너의 슬픔이 끼어들 때'

'아침에 네가 가장 사랑하는 시간/ 커다란 여행가방 안에 짐을 꾸리며/ 모닝 글로리 풀은 세상에서 가장 황홀한 호수/ 사람이 빠지면 곧바로 녹아버린대/ 호주머니에 고이 접어둔 사진을 두번 세번 들여다보며 가지 않는다.' ('너의 명랑' 중)
제12회 창비신인시인상으로 2012년 등단한 안희연(29)이 첫 시집 '너의 슬픔이 끼어들 때'를 냈다. 소멸해가는 세계와 존재의 실상을 섬세한 관찰력으로 투시하면서 삶과 현실의 고통을 노래했다.
문학평론가 김수이는 "안희연의 시는 세계의 소멸과 존재의 몰락이 한꺼번에 진행되는 가장 어두운 세계의 흐릿한 삶 속에서 탄생한다"며 "가장 어두운 세계랑 폭력, 불의, 비양심 등의 윤리적 차원의 부정성이나 지배 논리, 구조적 모순 등의 사회·역사적 차원의 부정성을 초과하는 더 근원적인 부정성에 휩싸인 세계를 뜻한다"고 읽었다.
"여기서 부정되는 것은 세계의 당위적 모습이나 존재의 존엄성 등이 아니다. 가장 본질적인 의미에서의 세계와 존재 자체이다. 안희연의 시는 삶 자체의 실종, 삶 자체의 불가능성이라고 말해도 좋을 이 사태를 하루하루, 한 호흡 한 호흡씩 살아내야 하는 자의 통증에 관해 쓴다. 더불어 이 통증의 힘으로 쓰인다. 기묘하게도 안희연이 앓는 통증의 구체적인 증상은 무감각과 무력감이다."
'아이들이 양으로 돌아왔다/ 흰나비를 잡으러 간 소년이 흰나비로 날아와 앉듯/ 뼛속까지 죄가 없다는 얼굴로/ 나를 안아보세요 그것이 사월 바다의 체온이에요/ 추워요 추워요 몸을 떤다.' ('검은 낮을 지나 흰 밤에' 중)
'장갑은 손처럼 생겼지만 손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 나에게는 없는 손을 장갑 속에서 발견한다면/ 얼마나 부끄러워질 것인가/ 접시와 접시 사이에는 또다른 접시가 있고/ 식탁 위에는 이인분의 음식이 차려져 있지만/ 나는 내가 한 사람이라는 것을 믿는다.' ('하나 그리고 둘' 중)
안희연은 "돌이켜 보면 모두가 가엾다"며 "눈앞에 없는 사람만 사랑하고 핏방울만이 진짜라고 믿었던 시간들. 내 삶에 불쑥불쑥 끼어들던, 내 것이자 내 것 아닌 슬픔들. 간신히 안간힘으로 흘러왔다. 그러니까 당신도 오래오래 아팠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그 먹먹함의 힘으로 다시 씩씩하게 걸어가주기만 한다면, 서늘했던 당신의 눈빛이 사랑으로 기울 수만 있다면 나는 얼마든 아파도 좋다. 더 허물어질 수 있다"는 마음이다. 160쪽, 8000원, 창비.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