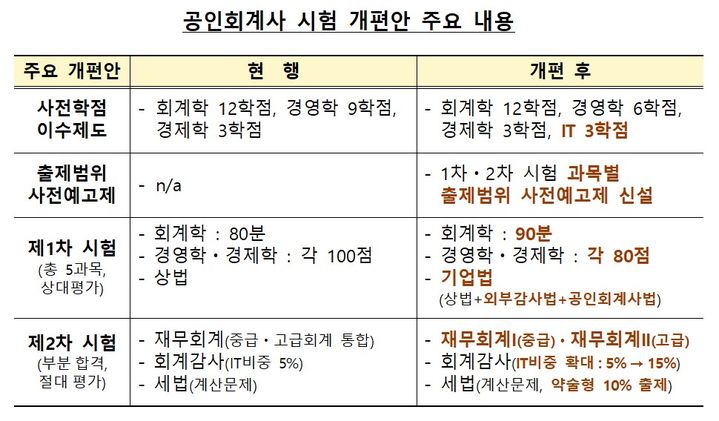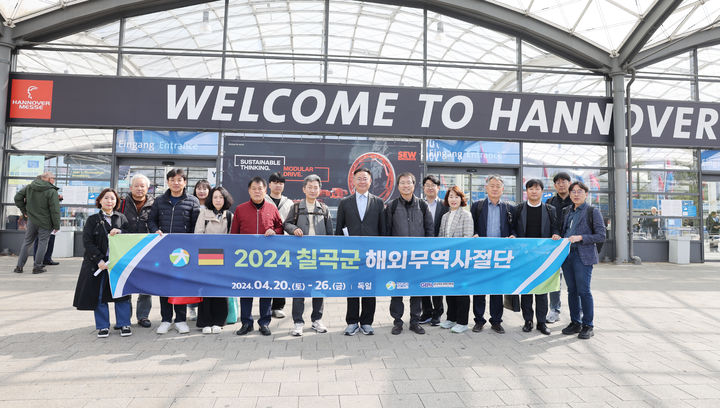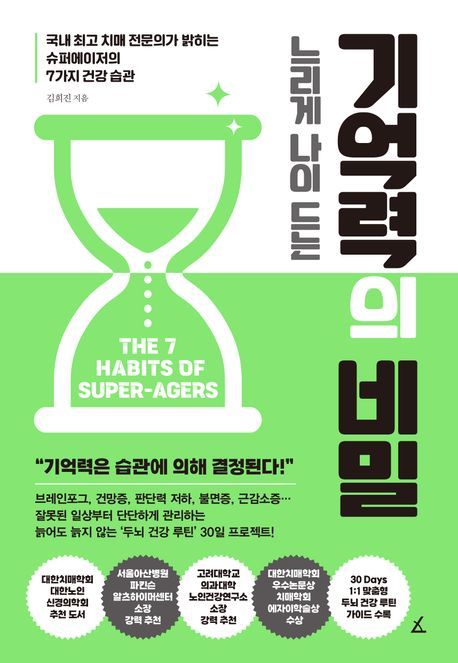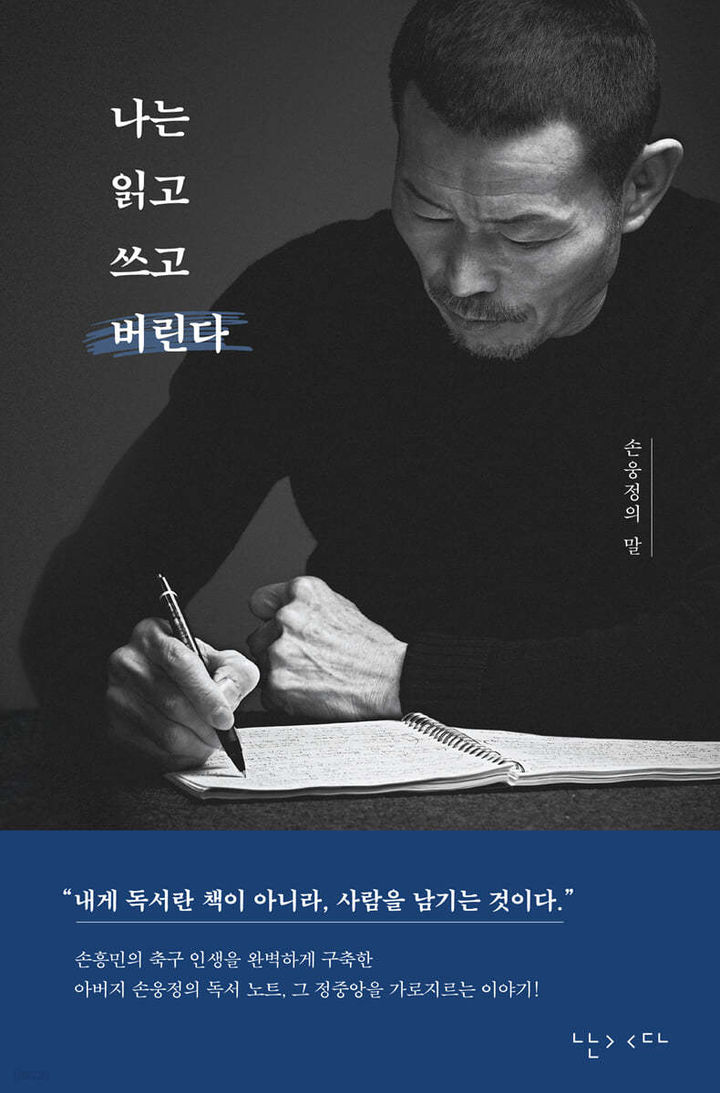[데스크 창]'파리 협정'과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37% 감축

산업 발전에 따라 인류의 삶의 터전인 지구의 기후는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다. 특히 온난화로 지구는 계속 황폐화하고, 현대에 들어와 잦아진 각종 기상이변과 자연재해도 이러한 인위적 변화가 큰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이 계속 실증되고 있다.
위기의식을 느낀 인류는 1997년 12월에 교토의정서를 체결했다. 그러나 교토의정서는 전형적인 다자간 협정이다 보니 어려움을 겪었다. 중국, 러시아, 인도처럼 강대국이지만, 개발도상국에 속하는 나라들의 참여가 미온적일 뿐만 아니라 미국 또한 세계 1, 2위를 다투는 온실가스 배출국가면서도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교토의정서 협약에서 탈퇴해 알맹이 없는 교토의정서가 돼 버렸다.
그 뒤 10년 동안 세계 각국은 지구온난화로 심각한 피해를 인식하게 돼 2007년 12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제13차 당사국 총회에서는 2012년 이후 선진국은 물론 개발도상국까지 온실가스 감축에 참여해야 한다는 ‘발리 로드맵’이 채택되기에 이르렀다.
이른바 ‘포스트 교토 체제’를 위한 세계 각국 간 협정을 다시 맺고, 선진국은 물론 한국을 포함한 개발도상국까지 2013년부터 온실가스 의무 감축을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지만, 이 또한 지지부진하다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유엔 기후변화협약 이 지난 12일(현지 시각) 지구온난화에 대응하기 위해 전 세계가 참여하는 보편적 기후변화 ‘파리 협정’이 진통 끝에 최종 채택됐다.
‘파리협정’은 기본적으로 지구온난화 억제 목표 온도를 2도로 설정하고 그 이하인 1.5도로 낮추는 데도 노력하겠다는 내용이 삽입됐다. 1.5도는 몇 달 전까지도 알려지지 않은 목표 치 이기 때문에 이번 파리 UN기후변화당사국 총회 최대 성과로 기록될 전망이다.
그러나 '1.5 억제안'에 대한 회의론도 있다. 파리 협정서에는 이 목표가 달성되지 않을 경우 취할 강제적 조치 내용이 없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우리나라는 이미 기후변화 대응 체제에서의 국제적 위상을 고려, 국제사회에 ‘2030년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 대비 37% 감축’이라는 강도 높은 목표를 제시했다.
그 개념을 아는 모든 이들은 고개를 갸우뚱거린다. 현재 국내 사정을 이해한다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이 관계자의 전언이다.
물론 정부는 '파리 협정' 타결이 우리나라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진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도 "올해 2030년 온실가스 37% 감축 목표를 INDC로 제시했는데, 국제사회에서 이를 두고 능동적, 적극적이라며 호평을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렇다고 정부가 외국의 호평에 도취해서는 안 될 일이다. 계획대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려면 국내 500여 개 배출권거래제 참여기업은 1사당 연평균 15억원, 배출량 상위 10대 기업은 연간 4800억원 등 적잖은 감축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된다.
한 발전회사 관계자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37% 감축하려면 아마도 국내 화력발전소를 단 1기도 운영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단언했다.
우리나라 발전소는 정부의 에너지 다원화 정책에 따라 원자력, 화력, 수력 발전 등으로 구분되고, 신재생 에너지로는 풍력, 태양광이 전부다. 풍력은 우리나라의 전기 생산에 적합한 풍량, 풍향 조건이 해당하는 지역이 제한적이고, 태양광의 경우 투자 대비 수입이 여의치 않아 관련 업계마저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좋지 않은 신재생에너지 조건 등으로 온실가스 37% 감축은 보여주기 위한, 어쩌면 숫자놀음에 불과할지도 모른다.
이 때문에 이번 ‘파리 협정’이 아직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것이 우리에게는 다행일 수도 있다. 따라서 우리는 강대국들이 하는 것을 봐 가며 실행에 옮기는 것도 지혜일 것이다.
염희선 위클리 뉴시스 편집장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