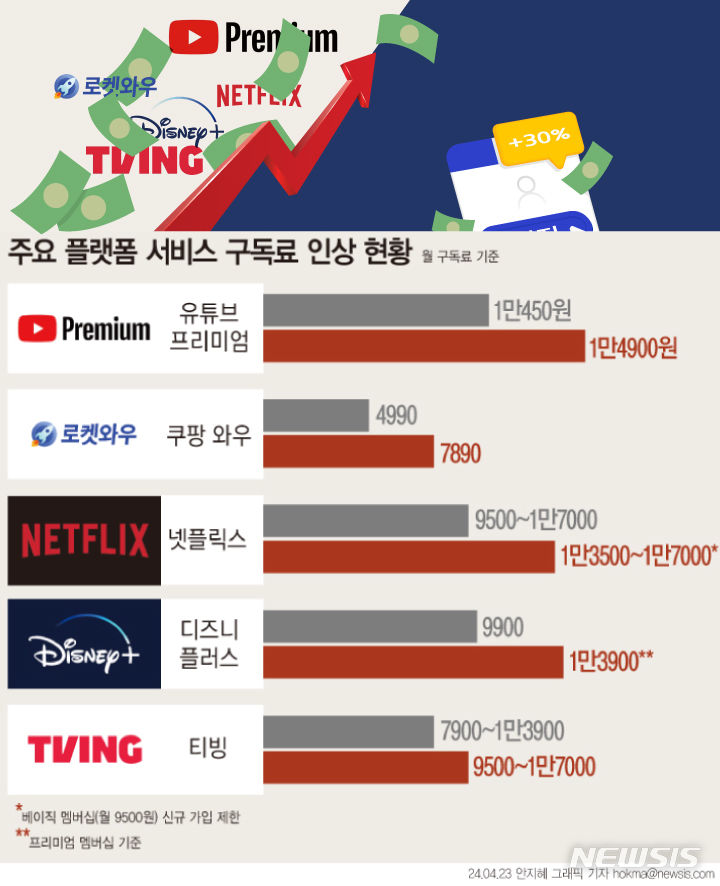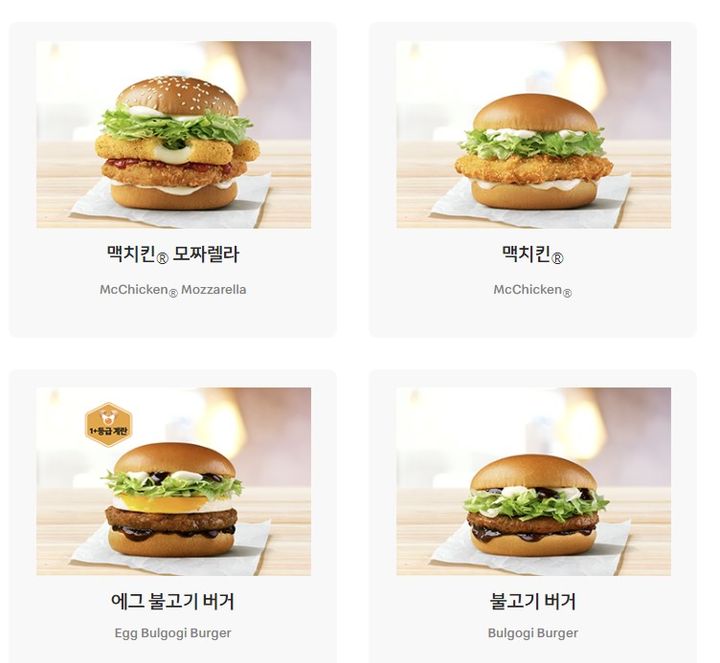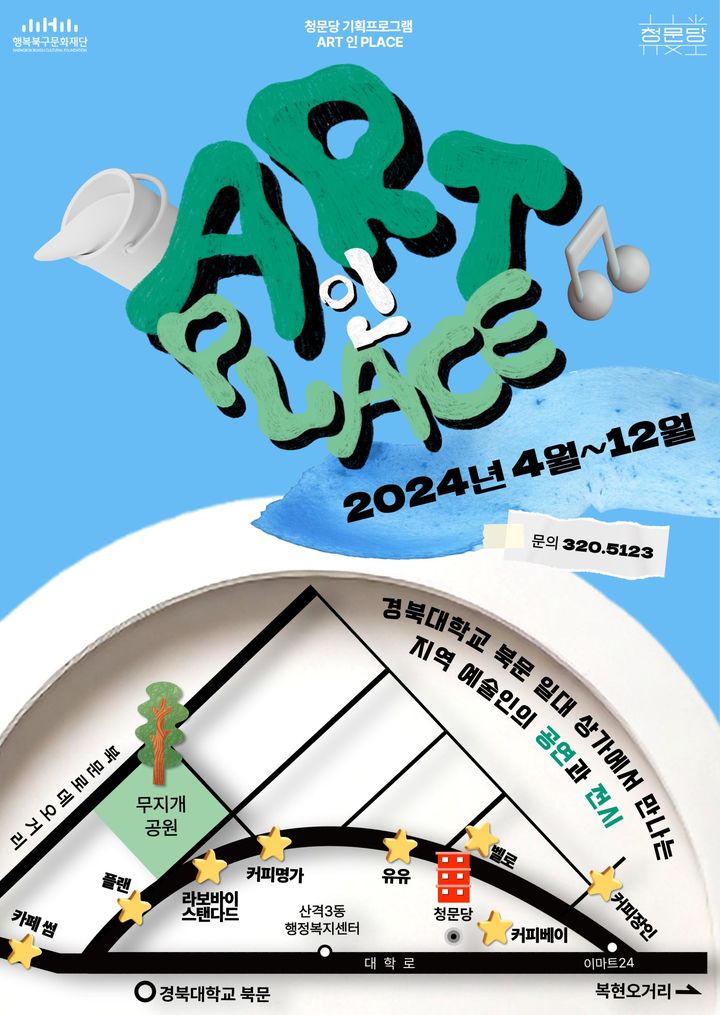동북아 대기전문가들 "韓中日 기후·대기질 정책 통합관리" 한목소리
13일 '기후변화, 대기질 통합관리 공편익 국제회의' 열려
![[서울=뉴시스] 13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A에서 열린 '기후변화, 대기질 통합관리의 공편익 국제워크숍'에서 안병옥 국가기후환경회의 운영위원장(아래 왼쪽에서 다섯번째)을 비롯한 토론회 참석자들이 토론회 시작 전 자세를 취하고 있다. 2020.01.13 .jungsw@newsis.com](http://image.newsis.com/2020/01/13/NISI20200113_0000461853_web.jpg?rnd=20200113174246)
[서울=뉴시스] 13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A에서 열린 '기후변화, 대기질 통합관리의 공편익 국제워크숍'에서 안병옥 국가기후환경회의 운영위원장(아래 왼쪽에서 다섯번째)을 비롯한 토론회 참석자들이 토론회 시작 전 자세를 취하고 있다. 2020.01.13
[email protected]
이들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미세먼지 범부처 프로젝트 사업단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의 주최로 열린 '기후변화, 대기질 통합관리의 공편익 국제토론회'에 참석해 이 같이 지적했다.
이들이 말하는 공편익은 한·중·일이 각각 실시하고 있는 환경 정책들의 편익과 비용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계산해 공동의 이익을 추구한다는 것이다. 경제학에서의 '편익'과 '비용' 개념을 응용한 것으로, 동북아의 기후변화 및 대기질 문제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공동의 편익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계산해봐야 한다는 내용이다.
전호철 KEI 부연구위원은 공편익에 대해 "단편적인 편익만 볼 게 아니라 좀 더 큰 차원에서 편익을 바라봐야 한다"면서 "전기자동차의 경우 (탄소) 제로 배출로 볼 수 있느냐란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의 경우 2018년에만 총 전력 생산량 중 40%가 석탄을 이용해 전력을 생산했다"면서 "이런 사실을 대입해 전기자동차에 필요한 전기 생산에 탄소 배출이 크다는 걸 고려하면, 에너지 정책 편익을 더 크게 고려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모인 대기 전문가들은 공편익을 위해서 삼국의 기후 정책과 대기질 정책을 통합해서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리 리핑(Li Liping) 중국환경정책연구소(PRCC) 연구원은 "공편익은 통합관리 기반"이라면서 "공편익 자체도 통합관리의 방안과 법안 규제를 위한 명분을 제공한다"며 공편익과 통합관리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리 연구원은 또 "중국에서는 오염관리 정책과 탄소거래 시스템 2개가 혼용해 이뤄지고 있다"면서 "관련 법안들을 통합해 탄소 또는 오염물질을 불법으로 배출했을 때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면서 발전소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시하고 탄소 데이터베이스를 볼 수 있다"는 예시를 들었다.
후 타오(Hu Tao) 레이크스톤 지속가능발전연구소 연구원은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 유발 물질은 연소에서 나오는 동일한 물질"이라면서 "오염물질 배출과 온실가스 감축을 동일화해 통합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동북아가 실질적으로 공편익을 추구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해 채여라 KEI 선임연구위원은 "한·중·일 공동으로 '정책 라이브러리' 추진을 기획하고 있다"면서 "한·중·일 정책 중에서 각각 대책이 어떠하고 온실가스 및 대기오염물질 저감량 비용은 얼마이며 편익은 어떠한지 등을 보고, 각국의 기준을 동일하게 해 지역적 편익과 글로벌 편익까지 고려하고 이를 공유함으로써 같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올해 추진 중인 건 석탄 및 LNG 발전소를 태양에너지 발전소로 바꿀 경우 비용과 편익이 얼마나 들고, 제한점이 무엇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이 결과를 곧 공개할 예정"이라면서 "한국의 KEI, 일본의 글로벌환경전략연구소(IGES), 중국의 PRCC와 베이징사범대학 등이 참여해 정책 라이브러리를 만들고 자료를 공유해서 윈윈할 수 있는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