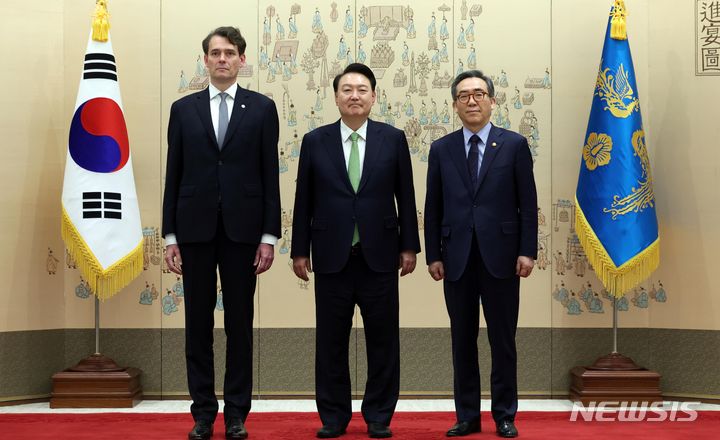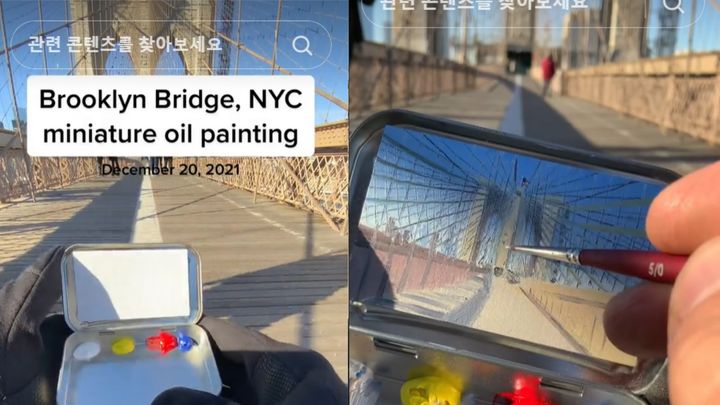[시집]박일환 '등 뒤의 시간'·박소란 '한 사람의 닫힌 문'
![[시집]박일환 '등 뒤의 시간'·박소란 '한 사람의 닫힌 문'](http://image.newsis.com/2019/01/31/NISI20190131_0000269102_web.jpg?rnd=20190131200531)
◇등 뒤의 시간
1997년 '내일을 여는 작가'로 등단한 박일환의 시집이다.
'그녀의 발꿈치에 반했다는 말/ 거짓이 아닐 거라고 믿는다// 늘씬한 여자를 좋아하거나/ 애교 넘치는 여자를 좋아하거나/ 지적인 여자를 좋아하는 남자들이 있지만/ 남자들은 천성이 바람둥이라서/ 그리 믿을 만한 존재가 못 된다// 그러니, 당신에게 반했어요/ 라고 말하는 남자들은/ 더 늘씬하고, 더 애교 넘치고, 더 지적인 여자를 만나면/ 태연하게 똑같은 말을 늘어놓을 것이다'('슬픈 현대사' 중)
'미황사 배롱나무 아래서 비를 그었다/ 긋지 않아도 될 만큼 살살 뿌렸지만/ 굳이 배롱나무 아래서 그었다/ 배롱나무 붉은 꽃이 나 대신 빗방울을 영접했다/ 미황사가 고맙고 배롱나무가 고마웠다// 내려주신 비가 고마웠다는 얘기는 덤이다'('덤' 전문)
박 시인은 "시를 쓰면서 늘 생각하는 비유란 결국 결합이다"고 한다. "이것과 저것, 여기와 저기를 접붙여 새로운 의미의 세계로 들어서는 것 그런 게 시의 기초라고 배웠다. 길을 가다 음식점 간판에 붙은 '포장 판매' 네 글자를 만났다. 포장과 판매의 결합 거기서 새로운 의미, 예전에 없던 상품이 탄생했다. 당신에게 가는 이 시집도 그렇다. 그래서 나는 생각한다. 내가 앞으로 계속 시를 쓴다면 결합이 아니라 분리에 집중해야 한다고. 그동안 너무 많이 붙어먹었다는 것부터 고백해야 한다고." 184쪽, 9000원, 반걸음
![[시집]박일환 '등 뒤의 시간'·박소란 '한 사람의 닫힌 문'](http://image.newsis.com/2019/01/31/NISI20190131_0000269101_web.jpg?rnd=20190131200531)
2009년 '문학수첩'으로 등단한 박소란의 시집이다. 우리 주변의 슬픔을 이야기한다. 이는 곧 시인 자신의 슬픔이기도 하다. 체념이 더 익숙해진 삶의 불행 속에서 아름다움을 찾는다.
'저 작고 무른 것을/ 사람들은 어떻게 기르나 어떻게/ 사랑하나// 저 알 수 없는 것을/ 자꾸만 꼬물꼬물 숨 쉬는 것을// 부둥켜안고 어디로 달려가나/ 순백의 울음소리가 병원 복도를 번쩍이며 스칠 때/ 더운 가슴팍을 할퀼 때// 사람들은 아프고/ 잇따라 울고// 또 어떻게 웃을 수 있나'('아기' 중)
'걷어차면 소리가 난다/ 울음보다 웃음에 가까운// 소리는 그럴듯하다 어디에서나 들을 법한 소리/ 어디에서나 마주칠 법한 표정// 지금껏 궁리해왔다 아주 사소한 무언가를('깡통' 중)
박 시인은 "'아름답다'를 대신할 말이 없었다"며 "''울음'이나 '웃음'과 같이 '나'는 지우려 해도 자꾸만 되살아났다"고 한다.
"스스로도 감지하지 못한 사이 거듭 '문'을 열었고 그 사실을 끝내 들키고 싶었다. 문을 열면, 닫힌 문을 열면 거기 누군가 '있다'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다. 보이지 않는 '사람'을 더 깊이 '사랑'한다." 168쪽, 9000원, 창비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