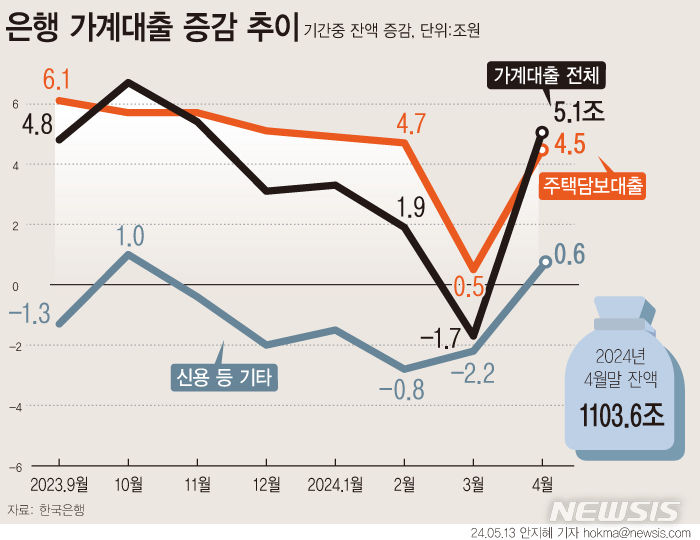'의대 갈등' 해법 못 찾는 전남도-순천시 …"정치적 결단 필요"
대학추천 공모 두고 전남도-순천 평행선 갈등…5자 회동도 불투명
지역특화형, 한 지붕 두 캠퍼스, 의대 따로 병원 따로 방안 등 제시

[무안=뉴시스] 송창헌 기자 = 국립 의과대학 신설을 위한 대학추천 공모를 두고 전남도와 순천시가 평행선 대립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의대 유치전에 나선 지역 내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가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이해당사자 간 첫 5자 회동마저 불투명해지면서 제로섬이 아닌 상생의 윈윈전략과 전국에서 가장 열악한 '의료 사각(死角)지대'에 대한 정치적 결단이 시급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8일 전남도 등에 따르면 지난 3월 대통령 민생토론회와 총리 담화문을 통해 '전남 의대 신설'과 '정부 차원의 신속한 추진'이 공식화됐으나 추천대학 공모를 둘러싸고 이견이 첨예하게 맞서면서 공모 절차는 5월 들어서도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대통령과 총리의 약속, 열악한 의료현실, 대입 전형 일정 등을 담보로 도는 추천대학 공모를 최선책으로 보고 관련 절차를 진행중에 있으나, 순천시와 순천대 등은 '전남도 주도 공모는 법적권한이 없다'며 공모 불참을 거듭 밝히며 독자노선을 고수하고 있다.
오는 12일로 예정된 첫 5자 회동도 성사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에 지역 내 갈등과 분열, 반목을 털고 동·서부권 갈라치기를 차단하기 위한 통합의 정신과 사회적 합의가 절실하다는 여론이 이 때문에 높아지고 있다.
전남이 17개 시·도 중 유일하게 국·공·사립 의대가 단 한 곳도 없고, 의대 신설이 34년째 숙원인 점, 노인·장애인 비율 전국 1위, 의사 없는 유인도 전국 최다, 1인당 의료비 전국 1위, 중증응급·외상환자 유출률 전국 최고 등 전국 최하위 지표가 넘치는 점도 의대 신설에 시급성을 더하고 있다.
정부의 잇단 공적약속이 나온 마당에 집안 싸움으로 절호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된다는 공감대고 확산되고 있다.
지역 정·관가와 전문가 집단 사이에서는 도가 제시한 '2026학년도 의대 신설 및 정원 200명 배정'를 1차 목표로 하되 의정 갈등을 감안해 신설 의대 정원은 100∼150명으로 줄이는 대신 목포대와 순천대에 50%씩 배정하고 추후 국립대간 통합 과정에서 단일 의대로 합치는 방안도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또 캠퍼스(의대)와 병원으로 양분하거나 1캠퍼스 복수 협력병원 체제로 가는 방안, 학년이나 전공을 분리, 예컨대 2+4체제로 운영하는 방안도 상생의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동·서부권의 뚜렷한 특성을 감안, '특화형 의대'가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서남권(목포대)에는 노인 인구와 일반 응급환자가 많은 특성을 감안, 노인과도서, 농어촌 특화 의대를, 대규모 산업단지와 생산기지가 밀집한 동부권(순천대)에는 산업 재해 특성화 의대를 만들는 게 윈윈 전략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다.
교육계 한 관계자는 "하나의 의대에서 넘쳐나는 의료수요를 모두 커버하기엔 무리가 있다"며 "규모가 다소 적더라도 지역 실정에 맞는 특화형 의대를 만드는 게 가장 합리적이고, 대통령실이나 정부 차원의 특별한 결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비슷한 처지의 경북에서 국립 안동 의대는 지역인재 육성, 포스텍은 연구중심 의대를 신설하는 방안을 동시 추진중인 점도 참조할 대목이다.
단일 의대 아래 1000㎞ 거리의 동, 서부 2개의 캠퍼스를 운영 중인 캐나다 노던 온타리오 대학을 롤 모델로 목포와 순천에 2개의 '미니 의대'를 운영하되 세부운영계획은 디테일하게 짜는 것도 고민해 볼 문제다.
한 의료복지 전문가는 "전남은 최악의 의료시스템 속에 동, 서부권의 특성이 매우 뚜렷하다"며 "정부가 신설을 약속한 만큼, 최대 난제인 지역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정원과 규모를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양 지역에 미니의대와 병원을 두거나 한 쪽엔 의대, 다른 한 쪽엔 병원을 신설하는 방안이 가장 합리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