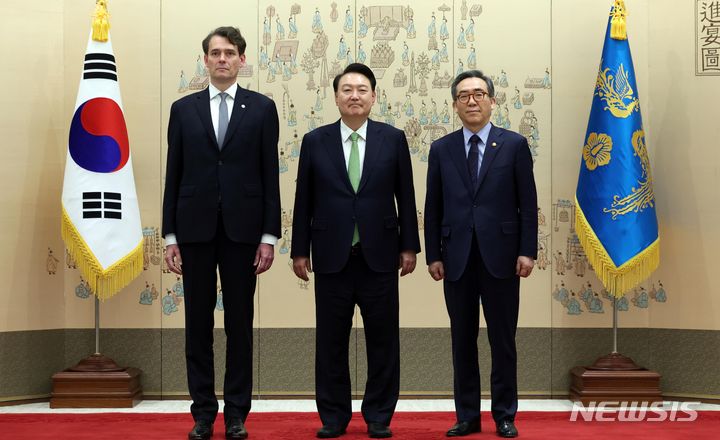[메르스 종식]⑤두려움과 맞선 의료진 사투…메르스 이긴 '큰 힘'

【서울=뉴시스】김희준 강진아 기자 =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가 더 이상 커지지 않고 사실상 종식 선언을 할 수 있었던 데에는 사명감을 안고 사투를 벌인 의료진의 희생이 큰 힘이 됐다.
움직이기도 버거운 방호복을 착용한채 환자들을 치료하느라 탈진 증세까지 예사로 겪었다. 이런 상황에서도 사명감으로 버텨내며 메르스 최전방에서 싸워 이겨냈다.
메르스에 대한 지식과 인력 부족, 안전조치 미흡 등으로 인한 두려움 속에서도 메르스를 잠재우기 위해 온 힘을 쏟아 부은 것이다.
◇부족한 인력·갑갑한 방호복…격무에 시달린 의료진
"자기 일에 다른 일까지 더 해야하니 당연히 피로 누적이 있을 수 밖에 없어요. 6월 초에는 거의 하루에 20시간 이상 근무를 했죠."
황원민(41) 건양대병원 신장내과 교수의 말이다. 대전 건양대병원은 감염 환자가 다수 발생한 탓에 집중관리병원이었을 뿐 아니라 음압병실을 갖추고 메르스를 전담 치료하는 '치료 병원'이기도 했다.
건양대는 메르스에 대한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의료진이 무방비로 노출되는 바람에 호흡기내과에 배속된 4명의 전공의 중에 3명이 격리돼 다른 내과 전공의 5명이 투입, 6명의 전공의가 메르스를 전담했다. 음압 병실은 낮에 전공의 1명이, 밤에 당직 2명이 계속 돌아가는 체제로 근무했다.
환자의 상태, 외부 지침에 따라 변경되는 것들에 대해 대책을 세워 프로토콜을 만들어야해 매일 6시간씩 회의를 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환자들을 돌봤다.
황 교수의 말에 따르면 격리되지 않은 호흡기 내과 교수는 과로 탓에 디스크가 심해져 다리를 절면서 회진을 돌아야했다.
방호복을 입고 환자를 돌보는 것은 피로감을 더하게 만들었다.

치료 병원인 서울대병원 내과계 중환자실에서 일하다 자원해 6월초부터 메르스 격리병동에서 일하고 있는 김민지(24) 간호사는 "땀이 금방 차서 달라붙고, 무게도 많이 나간다. 체감으로 느끼는 무게가 10㎏ 정도"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동호흡기가 달린 방호복을 입었는데 전동호흡기를 작동시키는 배터리가 4~8시간 간다. 한 번 방호복을 입으면 4시간 정도 계속 격리병실에서 일한다"며 "방호복을 입고 일한지 두 달 정도 됐는데 허리, 어깨에 계속해서 통증이 느껴진다"고 말했다.
황 교수는 "5~10분 정도 지나면 땀이 줄줄 흐르고 고글에 김이 서린다. 10분이면 주사 놓을 것도 30~40분이 걸린다"고 덧붙였다.
한 번 나가려면 보호구를 모두 벗었다가 다시 밖에서 입고 들어오는 과정을 반복해야하기 때문에 화장실에 가기도 여의치 않은 것이 현실이었다.
김 간호사는 "보호구를 모두 벗었다가 입어야 하기 때문에 중간에 화장실이라도 가려면 누군가 교대를 해줘야한다. 그러다보니 커피, 물 한잔을 먹는데도 조심스러웠다"고 전했다.
◇두려움·심리적 압박감도 견뎌내
격무 만큼 힘든 것은 두려움과 심리적인 압박감이었다. 초기에는 메르스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 두려움을 느껴야했고, 이후에도 작은 실수로 감염될 수 있다는 사실에 살얼음판 같은 하루하루를 보내야했다.
황 교수는 "잘 모른다는 것에 대한 무서움이 있었다. 메르스가 어떻게 감염될지 모르고 하루하루 어떻게 될지 모르니 두려움이 있었다"고 고백했다.
김 간호사는 "의료진이 방호복을 입고도 감염이 된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부딪혀서 '뚜둑'하는 소리가 나면 혹시 구멍이 생기지는 않았을까 걱정이 됐다"며 "또 기침을 조금이라도 하면 걱정이 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일반 중환자실은 옆에 다른 선생님이 있어서 응급 상황일 때 서로 도울 수 있지만 격리실은 혼자 있다. 그래서 응급 상황에 대한 걱정이 많았다"며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금방 오기 힘들고, 그 때까지 버텨야하니 그런 것에 대한 심리적 압박감도 상당했다"고 전했다.

황 교수는 "예전에 집에 가면 바로 샤워하지 않았다. 하지만 나 뿐만 아니라 가족들을 보호하기 위해 요즘에는 바로 한다"며 "가족들이 오해를 받을까 걱정이 되기도 했다"고 말했다.
김 간호사는 "조심스러워 주변에 지인들을 만나기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다. 처음에 메르스 병동에서 일하기 시작했을 때에는 어떤 일을 하는지 말도 하지 못했다. 아버지께도 말하지 않았다"며 "함께 살고 있는 어머니께 전염될까봐 매일 아침, 저녁으로 체온을 같이 잰다. 나는 몸이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방에만 있는다"고 설명했다.
◇"사명감·팀워크·주변 격려로 이겨냈죠"
의료진이 이런 상황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아니면 안된다'는 사명감이었다.
황 교수는 "처음에 메르스 병동에서 일할 인력을 요청하는데 자원할 사람이 없을까봐 걱정했다. 하지만 서로 진료를 하겠다고 해서 고마웠다"며 흐뭇함을 드러냈다.
메르스 병동에서 일하겠다고 자원한 김 간호사는 "처음에 무척 걱정했고 어머니도 말리셨지만 중환자실에서 일했던 만큼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다"며 "이후 병원에 붙은 '살려야한다'는 문구를 보고 의료진들이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가 피부에 와닿았다. 어설픈 사명감일지 몰라도 마음 속에 강하게 울려퍼진 말이었다"고 했다.
메르스 병동에서 같은 의료진이 동고동락하면서 생긴 팀워크도 서로를 지탱해주는 힘이 됐다.
김 간호사는 "일종의 동지애가 생겼다. 중환자실에 있을 때보다 더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일했다. 일은 힘들지만 잘 헤쳐나가자는 분위기가 지배적이었다. 서로 격려해준 덕에 버틸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황 교수는 국민들이 보내주는 격려에 힘을 얻었다면서 "질책보다 응원을 많이 해주셔서 우리 사회가 성숙했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환자들도 오면 고생 많았다고 인사를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보람을 느낀다. 외래 환자 분이 나에 대한 걱정을 해줬다고 해서 뭉클했다"고 고마움을 내비쳤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