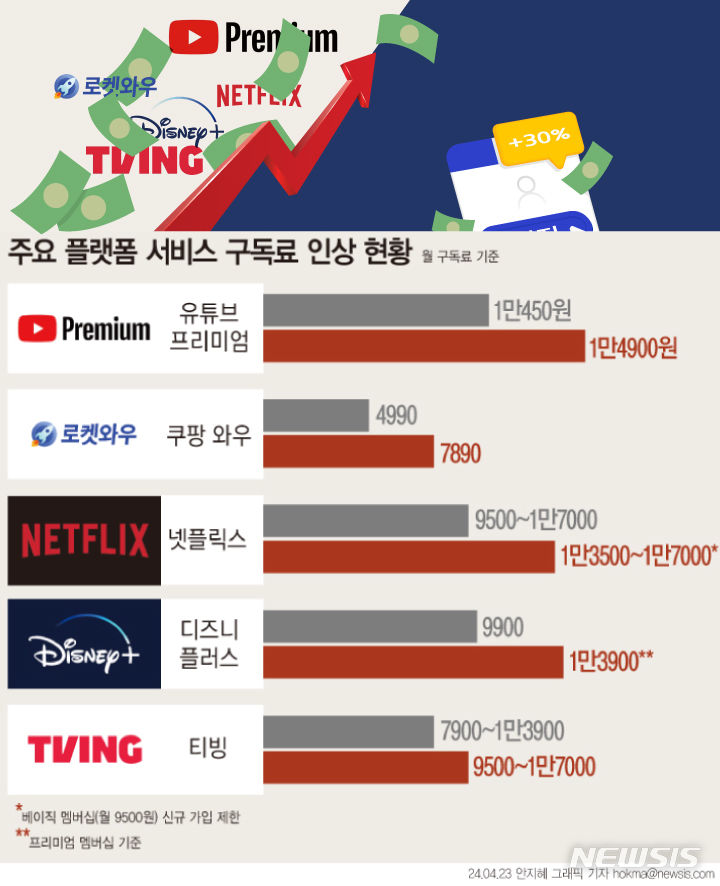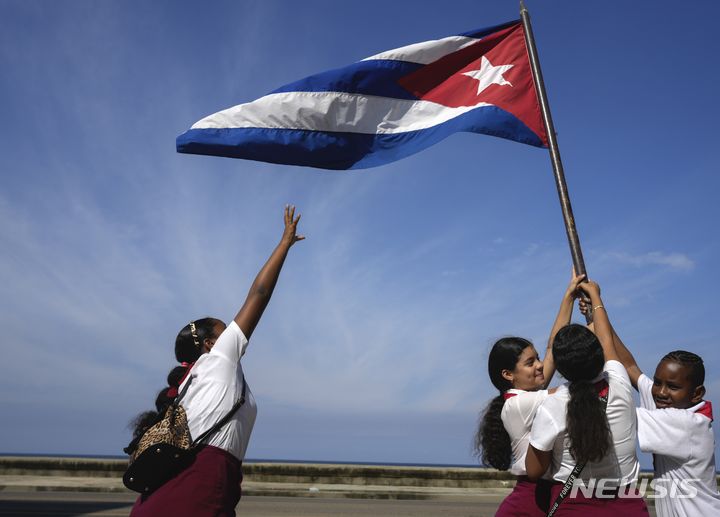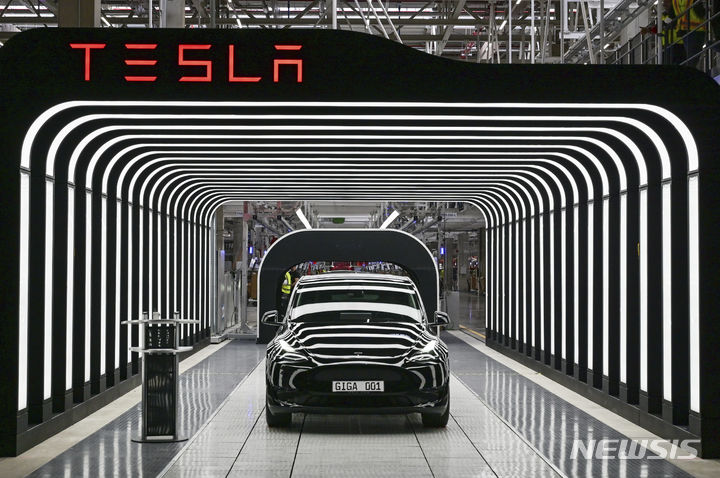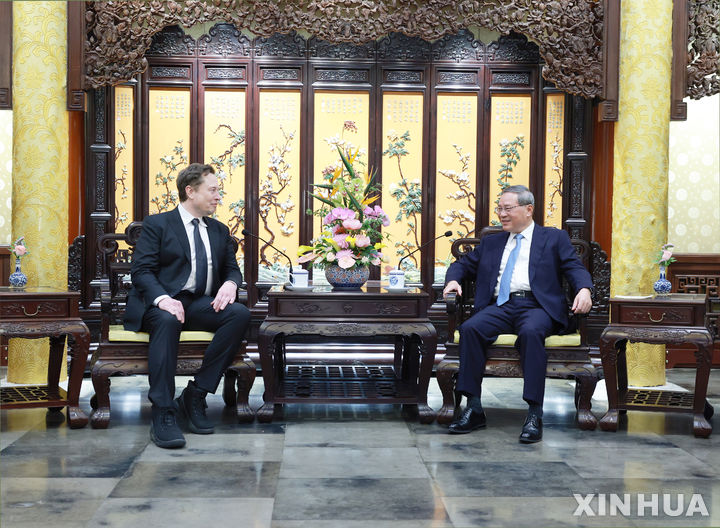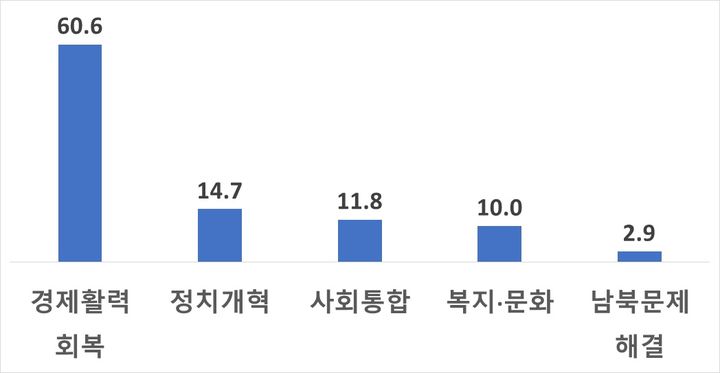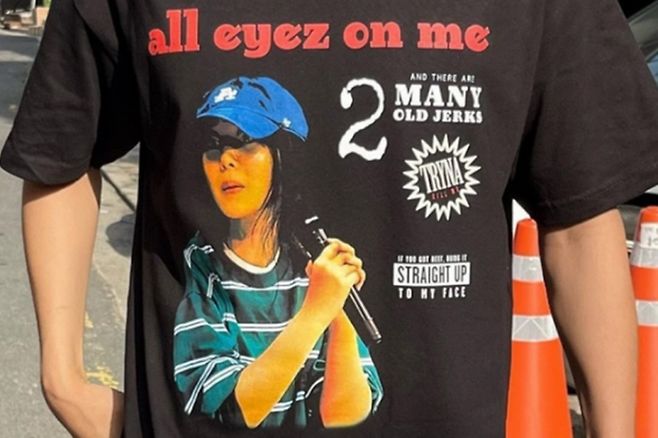조현범, 故 조석래 회장 빈소 조문…"마음 많이 아프다"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
부친인 조양래 회장과 빈소 찾아
1시간 이상 머물며 유족 위로
![[사진=뉴시스] 30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신촌세브란스병원에 마련된 고 조석래 효성 명예회장의 빈소를 떠나는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그룹 회장(가운데)과 조양래 한국앤컴퍼니그룹 명예회장(오른쪽). 조양래 명예회장은 조석래 회장의 친동생이다. (사진=공동취재단) 2024.03.3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image.newsis.com/2024/03/30/NISI20240330_0001514941_web.jpg?rnd=20240330154021)
[사진=뉴시스] 30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신촌세브란스병원에 마련된 고 조석래 효성 명예회장의 빈소를 떠나는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그룹 회장(가운데)과 조양래 한국앤컴퍼니그룹 명예회장(오른쪽). 조양래 명예회장은 조석래 회장의 친동생이다. (사진=공동취재단) 2024.03.3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유희석 기자 = "저희 큰아버님(조석래 명예회장)이 90(세)이신데 호상은 아니라서 마음이 굉장히 아픕니다. 또 막바지에 정신적으로나 몸적으로 많이 고생을 하셔서 마음이 (아픕니다). 좋은 곳에서 편하게 쉬시기를 바랍니다."
30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신촌세브란스병원에 마련된 고(故) 조석래 효성 명예회장의 빈소를 찾은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은 조문을 마친 뒤 이같이 말했다.
이날 부친인 조양래 한국앤컴퍼니그룹 명예회장과 함께 빈소를 찾은 조현범 회장은 "아버님이 귀가 잘 들리시지 않지만 굉장히 슬퍼하고 계신다"며 "특히 막바지에 형님(조석래 회장) 얼굴을 못 보셔 엄청나게 아쉬워하신다"고 했다.
이날 오후 1시 20분께 빈소를 찾은 조현범 회장과 조양래 명예회장은 2시 35분쯤 빈소를 떠났다. 조 회장은 "작은 아버님(조욱래 DSDL 회장)과 옛날 사진들 보면서 고등학교 때 일화 등을 회상했다"며 "큰어머니(송광자 여사) 위로해 드리면서 옆에서 지켜드렸다"고 전했다.
조현범 회장이 빈소를 지킬 때 조석래 명예회장의 둘째 아들인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도 빈소를 찾았다. 조 전 부사장은 별다른 말 없이 조문하고, 5분 만에 떠났다.
조 전 부사장은 한때 효성 경영에 참여했으나, 부친 및 형제들과 마찰을 빚다 지분을 모두 처분하고 회사를 떠난 바 있다. 이후 싱가포르 등 해외에서 머물며 개인회사를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뉴시스] 30일 오후 고 조석래 효성 명예회장 빈소를 찾은 한덕수 국무총리. (사진=공동취재단) 2024.303.3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image.newsis.com/2024/03/30/NISI20240330_0001514948_web.jpg?rnd=20240330154259)
[사진=뉴시스] 30일 오후 고 조석래 효성 명예회장 빈소를 찾은 한덕수 국무총리. (사진=공동취재단) 2024.303.3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한편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도 이날 오후 2시쯤 모친인 홍라희 전 삼성미술관 리움관장과 함께 고인의 빈소를 찾아 조문했다. 이 회장은 조현준 회장과 어릴 때부터 친구 사이이며, 홍 전 관장은 송광자 여사와 서울대 미대 동창으로 오랜 기간 친분을 이어왔다.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최준경 전 지식경제부 장관, 김윤 삼양사 회장, 오세훈 서울시장 등 정·재계 인물들의 조문도 계속 이어졌다. 우태희 효성중공업 사장, 요코타 타케시 효성중공업 부사장, 정만기 효성중공업 사회이사, 안태완 효성 전 부회장 등 효성그룹 임직원들도 조문했다.
조석래 명예회장의 장례는 이홍구 전 국무총리가 명예장례위원장을, 이상운 효성 부회장이 장례위원장을 각각 맡아 효성그룹장으로 장례가 진행된다. 장례는 내달 2일까지 5일장으로 치러지며, 영결식은 내달 2일 오전 8시 열릴 예정이다.
빈소에는 윤석열 대통령 명의의 조화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보낸 조화가 양쪽에 나란히 놓였다.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 이웅렬 코오롱그룹 명예회장 등이 보낸 조화도 도착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