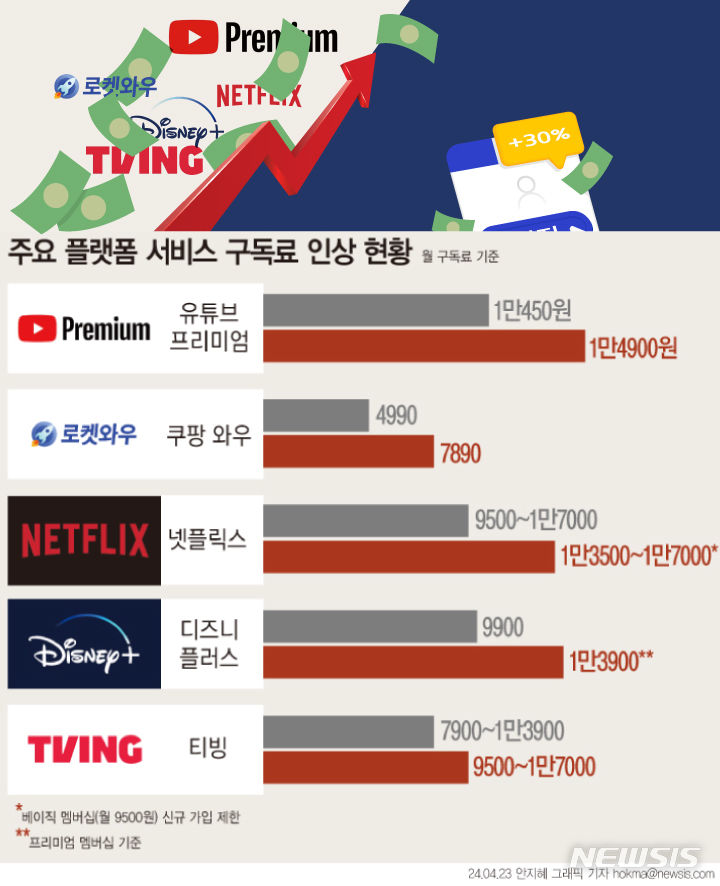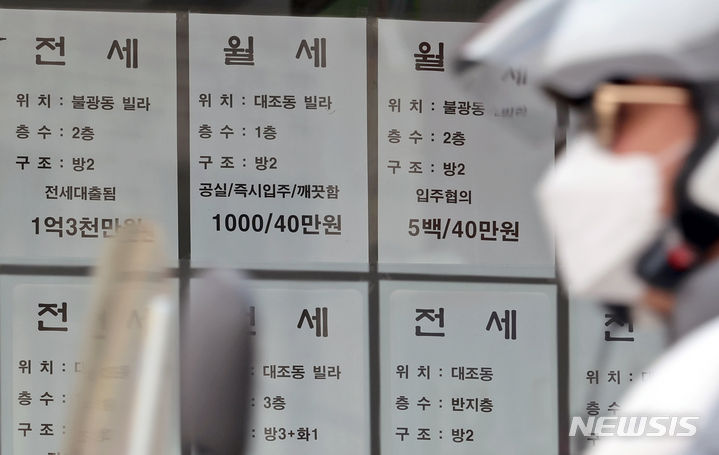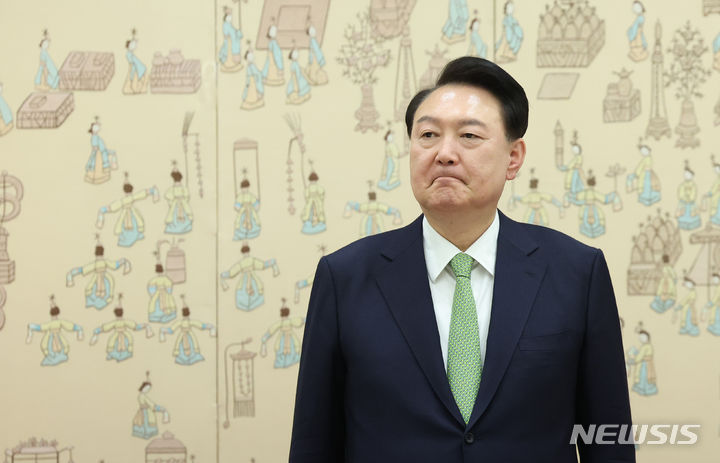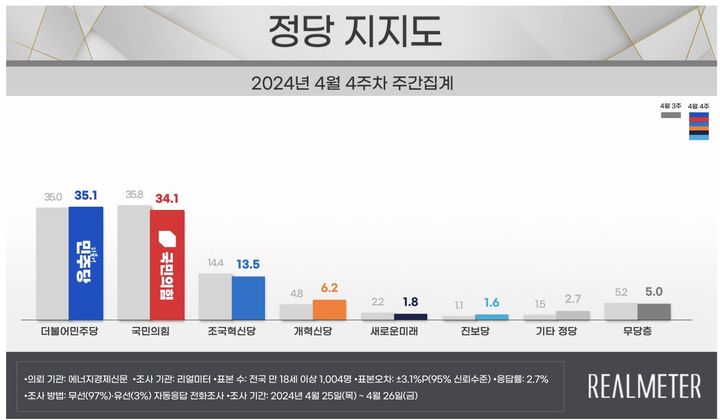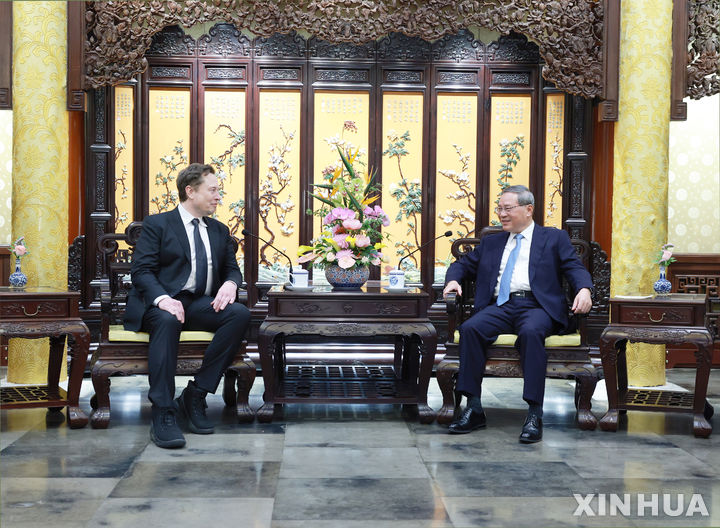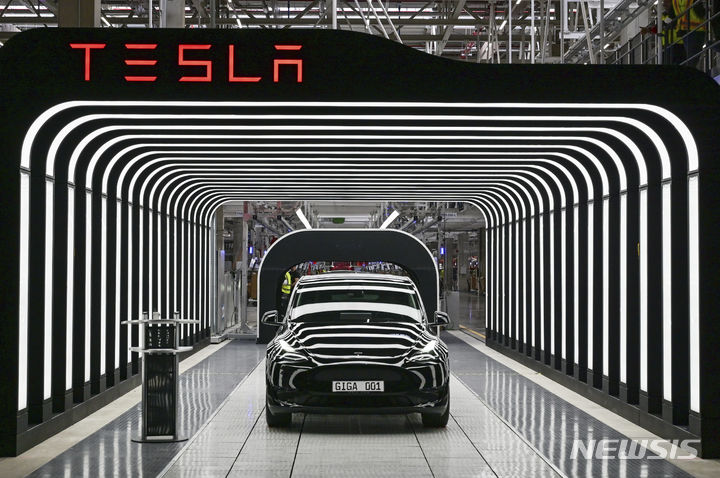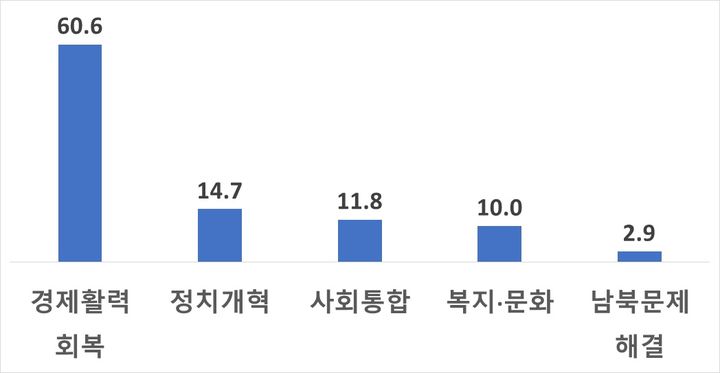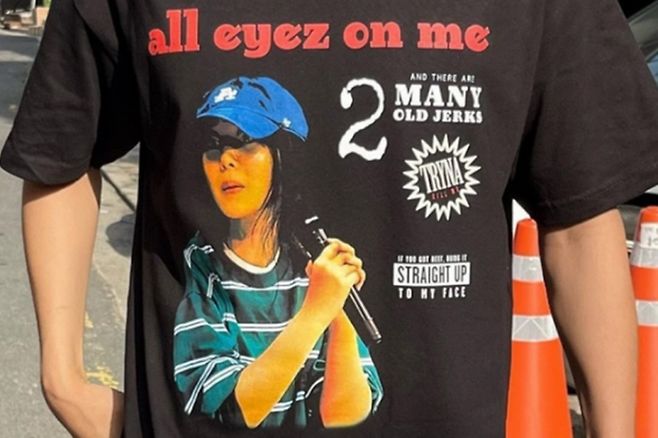3일만에 1100조원 증발한 美 증시…버블 붕괴 전조?

옐런 "주식과 상업용 부동산 가격이 높은 것은 사실"
NYT는 "경기 침체의 패턴 아냐"
【서울=뉴시스】 안호균 기자 = 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증시 폭락은 월가에서도 이례적인 사건으로 받아들여진다. 시장 위축을 유발할 수 있는 특별한 재료가 돌출되지 않고도 투매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날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175.21포인트(4.60%) 내린 2만4345.75에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지수와 나스닥 지수도 이날 각각 4.10%와 3.78%씩 급락했다.
지난달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는 1월에 5.8%와 5.6%씩 올라 '황소장'을 이끌었지만 2월 들어 3거래일 만에 1월 상승분을 모두 반납했다.
S&P 500 지수에서는 2월 들어 3 거래일 동안 1조 달러(약 1100조원)이 증발됐다.
CNBC는 이날 "다우지수가 장중 한때 1500포인트나 떨어지는 중에도 주요 지수 폭락을 유발할만한 특별한 뉴스는 없었다"며 "심리적 요인과 프로그램 매매만으로 주가 급락 사태가 나타났고, 월가는 기괴한 현기증을 겪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이번 미국의 증시 폭락이 '버블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글로벌 경제가 오랜 기간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는 속에서 자산 시장에 거품이 생기고 있다는 지적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이후 미국 증시가 40% 가까이 상승하면서 단기간에 시장이 너무 과열됐다는 인식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최근의 가상화폐 광풍과 같은 현상이 버블의 징후로 꼽히기도 했다.
앨런 그린스펀 전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 의장은 지난달 31일 블룸버그TV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우리는 주식시장의 버블과 채권시장의 버블이라는 두가지 버블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물러난 재닛 옐런 전 연준 의장도 "'버블'인지에 대해 말하기는 매우 어렵지만 주식과 상업용 부동산 가격이 높은 것은 사실"이라고 시인했다.
WSJ는 이번 미국의 증시 투매 현상이 다우지수, 국채가격, 유가가 동반 하락했던 2016년 2월의 시장 급락 때와 유사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당시 다우지수와 S&P500지수는 고점 대비 10% 가량 하락했고 유가는 배럴당 26달러까지 떨어졌다.
시장에서는 채권, 원자재 등 다른 자산 시장에서 동반 버블 붕괴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도이체방크에 따르면 석유, 주식, 채권, 유로화 등의 자산들 간 상관관계는 5년 반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하지만 아직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경제가 본격적으로 회복 국면에 진입하는 시점이어서 버블 붕괴를 논하기는 이르다는 반론도 있다.
뉴욕타임스(NYT)의 경제 담당 선임기자 닐 어윈은 "이번 폭락은 경기 침체의 패턴이 아니었다. 금요일(2일) 증시 폭락 때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급격히 상승했고, 이것은 미래 인플레이션에 대한 채권 시장의 측정치가 상승한 것이다. 월요일(5일) 매도세에서도 금리는 이전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어윈은 "이번 증시 급락은 경제 비관론을 반영한게 아니라 주식 시장에서 고용주가 더 많은 임금을 지불해야 하고, 물가상승률이 높아지면서 연준이 계획한 것보다 더 빨리 금리를 올릴 것이라는 견해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데이비드 켈리 JP모건 자산운용 수석 글로벌전략가는 파이낸셜타임스(FT)에 "주식시장과 채권시장 모두 안정된 2년을 지나 다소 늦은 조정을 맞고 있다는게 적절한 해석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주에는 다소 시장이 출렁거릴 수 있고, 극단적인 해석이 나올 수 있지만, 투자자들은 웹에서 읽은 것에 대한 회의론을 유지하면서 시장의 기초체력(펀더멘털), 평가, 포지셔닝 등 기본에 더 집중하게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