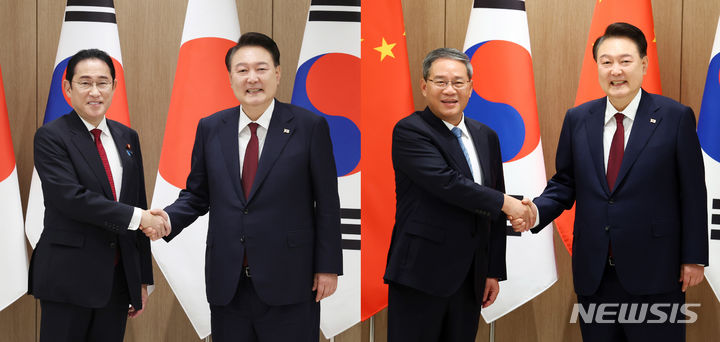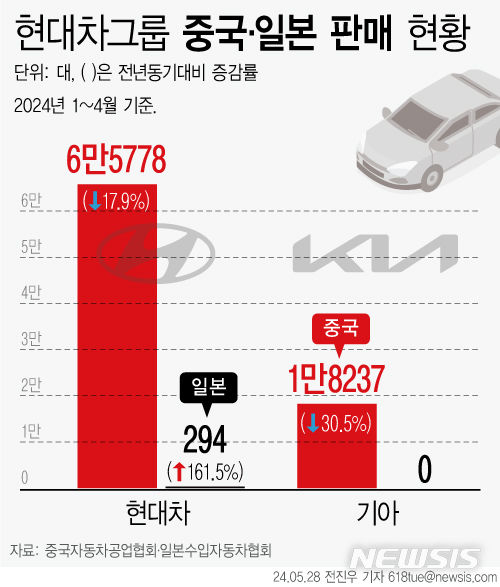美국무부 "한반도 상황 주시…도발 계속하면 결과도 계속"
"北문제, 한·일뿐만 아니라 中과도 논의…中, 北에 레버리지 있어"
![[서울=뉴시스] 지난 17일 북한 조선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김정은 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이 신형전술유도무기 시험 발사를 참관했다고 보도했다. (사진=노동신문 홈페이지 갈무리) 2022.04.17](https://image.newsis.com/2022/04/18/NISI20220418_0000976514_web.jpg?rnd=20220418082330)
[서울=뉴시스] 지난 17일 북한 조선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김정은 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이 신형전술유도무기 시험 발사를 참관했다고 보도했다. (사진=노동신문 홈페이지 갈무리) 2022.04.17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18일(현지시간) 정례브리핑에서 북한 도발 관련 질문에 장사정포 시스템(long range artillery system) 시험 발사를 언급한 자국 국방부 서면 답변을 언급한 후 "우리는 한반도 상황을 긴밀히 주시 중"이라고 답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아울러 "우리는 북한의 잠재적인 추가 도발 가능성을 경고해 왔다"라며 "이는 우리 대북특별대표가 지금 서울에 있는 동안 일어났다"라고 말했다. 이어 성 김 대북특별대표를 거론, "그는 이날 서울에서 일련의 회의를 했다"라며 이를 통해서도 입장이 나왔다고 강조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김 대표 방한 및 협의가 이 지역에 대한 굳건한 약속을 강조한다며 미국 및 동맹, 한·일 안보 수호 의지를 거론했다. 아울러 한반도 비핵화가 목표라는 점도 거듭 말했다.
김 대표뿐만 아니라 웬디 셔먼 부장관,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도 한국 및 일본과 양자, 또는 한·미·일 삼자 포맷으로 꾸준히 관여하고 있다는 게 프라이스 대변인의 설명이다. 그는 또 "외교의 문은 닫히지 않았다. 여전히 열려 있다"라고 대북 대화 기조도 재확인했다.
그는 다만 "북한은 불안정을 초래하는 행동을 중단하고 대신 관여의 길을 택해야 한다"라며 북한이 아직 그러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또 "우리는 북한의 전방위적 우려를 들을 의향이 있다"라면서도 "이는 오로지 대화로만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북한은 아직 대화에 열려 있다는 구체적인 암시를 주지 않았다"라며 "우리는 북한에 적의를 품지 않았다"라고 했다. 그는 또 "선제 조건 없이 대화에 관여할 의향이 있다"라며 "불행히도 북한은 우리 초대에 답하지 않고 대신 일련의 도발에 관여했다"라고 지적했다.
북한의 도발 사례로는 특히 지난달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꼽았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북한의 도발에 역내 동맹은 물론 그 이상과도 협력했다며 유엔을 거론했다. 그는 북한의 도발을 다수의 유엔 결의 위반이라고 거듭 지적했다.
그는 아울러 북한이 역내 평화는 물론 국제적 평화를 희생하고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우선시하고 있다며 "우리는 일련의 외교적, 경제적, 군사적 조치를 취했다"라고 강조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또 "우리 행동은 북한에 '긴장을 고조하는 행동은 결과가 있고, 이런 결과는 북한이 도발을 계속하는 한 계속될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그는 류샤오밍 중국 외교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추가 대북 제재에 반대하고 대화 재개를 촉구한 점과 관련, "이는 우리의 요점이기도 하다"라며 "우리는 외교의 문, 대화의 문이 열려 있다는 점을 매우 명확히 해 왔다"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공개적으로도, 비공개적으로도 이런 신호를 보냈지만 북한은 이런 제의에 관여하지 않았다"라고 했다. 그는 아울러 "우리는 긴밀한 동맹인 일본, 한국은 물론 다른 이해 당사자와도 관여해 왔다"라며 "당연히 중국은 중요한 역내 이해 당사자"라고 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우리는 중국 북한 대표와 회의를 했다"라며 중국의 대북 레버리지를 거론, "이 문제에 관해 중국 같은 파트너와 계속 관여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