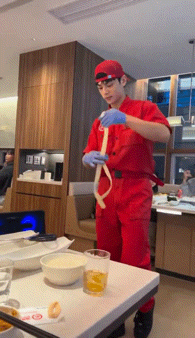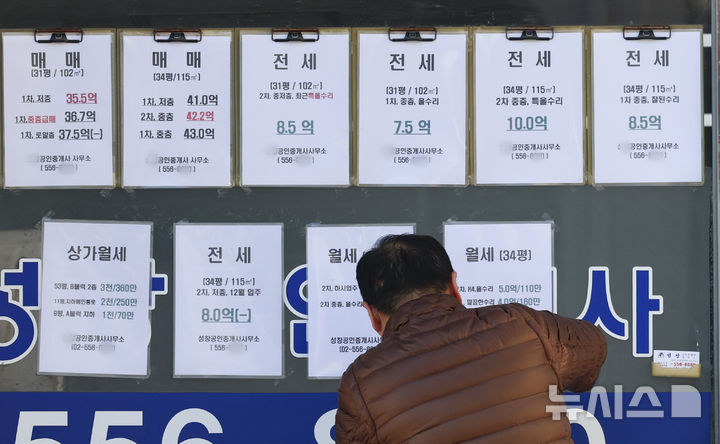진양곤 HLB그룹 회장 "FDA 본심사 진입…긴호흡으로 차분하게 가겠다"
리보세라닙 NDA 정식 허가심사 개시 통보
개장 전 유튜브 채널 통해 감사 인사 건네

진양곤 HLB그룹 회장. *재판매 및 DB 금지
진양곤 HLB그룹 회장은 17일 오전 회사 유튜브 채널을 통해 "최근의 주가 하락과 시장의 각종 루머, 우려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회사를 믿고 지지해준 주주들, 특히 HLB 주주연대인 '주가행'과 우리를 오랫동안 믿고 지지해주신 주주 여러분의 응원은 가장 큰 힘이 되고 있다.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HLB는 미국 자회사 엘레바가 FDA로부터 리보세라닙의 '정식 허가심사 게시(NDA Filing Acceptance)'를 통보 받았다"고 발표했다. 지난 2008년 리보세라닙 개발을 시작한 이래 15년 만에 항암신약 성공이라는 종점에 근접한 것이다.
HLB의 미국 자회사 엘레바(Elevar Therapeutics)는 리보세라닙과 캄렐리주맙을 병용요법으로 글로벌 3상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지난 5월16일 FDA에 간암 1차 치료제로 리보세라닙에 대한 신약허가신청서(NDA)를 제출한 바 있다. FDA가 표준심사로 NDA 심사를 시작함에 따라 늦어도 10개월 내인 내년 5월16일까지 신약 허가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진양곤 회장은 "FDA의 신약 본심사의 경우 우선심사 또는 표준심사, 둘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되는데, 두 가지 심사방식은 FDA의 행정 일정이 4개월 차이가 생기는 것일 뿐 허가 여부와는 무관하다"며 "FDA가 우선심사를 채택하는 경우는 기존에 허가된 치료제가 없는 적응증인 경우나, 또는 치료제가 있긴 하지만 그 치료제로는 환자의 치료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는 때"라고 설명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일종의 급행료에 해당하는 바우처를 구입해 우선심사를 신청하는 방법이 있다. 바우처는 시기마다 가격이 다르지만 지난해에 거래된 2건의 경우 대략 14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진 회장은 "리보세라닙이 표준심사로 결정된 이유는 간암 1차 치료제 약물이 이미 나와 있기 때문"이라면서 "물론 HLB는 리보세라닙이 OS(전체생존기간)와 PFS(무진행생존기간)에서 탁월한 임상 결과를 보였기에, 내심 우선심사를 시도해 본 것이나, 전례로 볼 때 쉽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물론 1400억원에 이르는 바우처를 구입하는 방법도 있겠으나, 허가 4개월 단축을 위해 바우처 구입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주주 여러분들도 동의하지 않았을 것이며, 저 또한 그럴 돈이 있으면 마케팅에 더 사용하는 게 낫다고 생각했다"고 전했다.
다만 일부 절차는 생략됐다. 리보세라닙은 신약허가 과정에서 청문회로 불리는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 청취제도인 자문단 미팅(Advisory Committee meeting) 절차 생략을 통보 받았다. 이에 따라 HLB는 약 20억원의 경비를 아끼는 부수적인 성과를 거두게 됐다.
진 회장은 "중간중간 진행 상황을 공지하지 않는 것, 적극적인 홍보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해 아쉬워 하는 분들도 있다고 들었지만, 긴 호흡으로 봐야 할 신약 개발 과정을 마치 스포츠 중계하듯 계속 알리는 것이 적절한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다"면서 "다만 이번처럼 중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적극 알리겠다. 긴 호흡으로 신약 개발을 묵묵히 해 온 HLB의 여정을, 똑같은 호흡으로 응원해준 주주들 덕분에 이 어려운 길을 계속 걸어올 수 있었다"며 주주들을 독려했다.
한편 이날 오전 HLB는 한때 17%가 넘는 급등세를 나타냈지만 차익실현을 위한 매도세가 이어지면서 상승폭을 일부 반납했다. 이날 오전 10시30분께 약 3% 안팎의 강세를 보이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