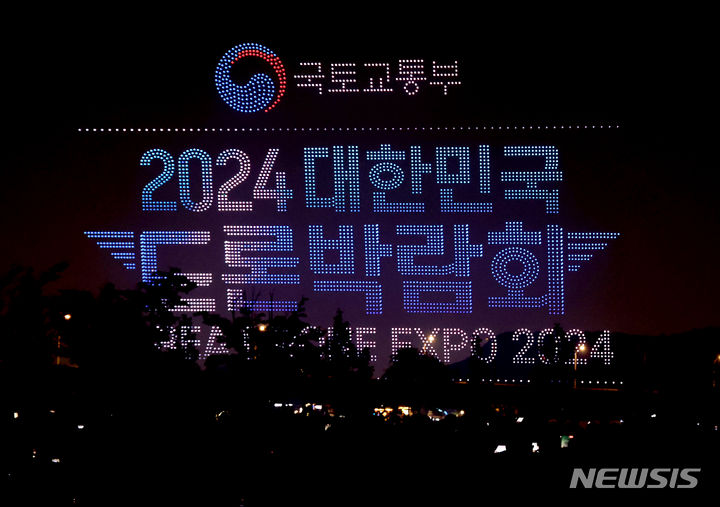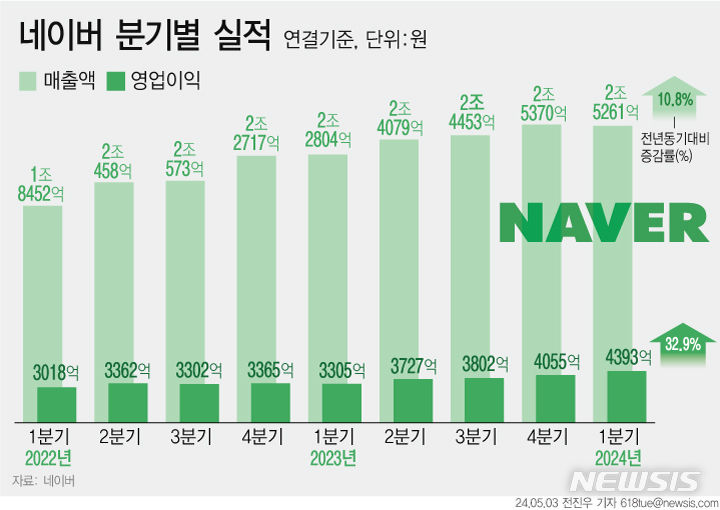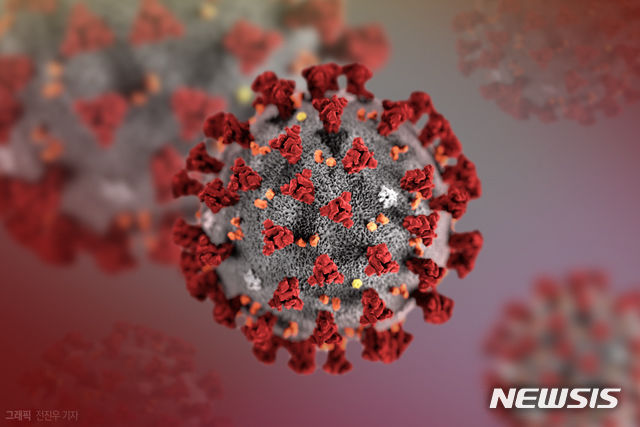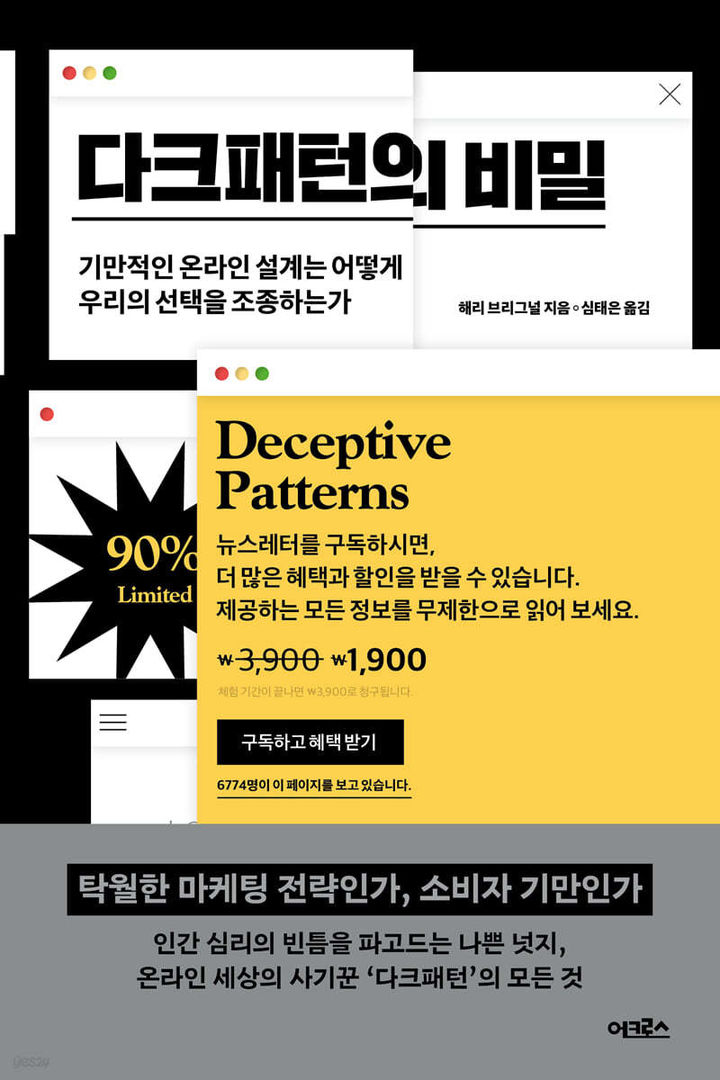[단독]우울증 아내 죽일뻔한 흉기난동…"딸 돌봐라" 집행유예
1심, 살인미수 혐의 40대 징역 3년·집행유예 5년
아내 휴대전화 몰래보다 다툼→흉기로 5회 찔러
재판부 "범행수법 위험하다"면서 실형은 안 내려
"범행 이후 직접 신고, 부양할 초등생 딸 등 감안"
![[단독]우울증 아내 죽일뻔한 흉기난동…"딸 돌봐라" 집행유예](http://image.newsis.com/2016/12/14/NISI20161214_0012497079_web.jpg?rnd=20170411134527)
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환승)는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최모(46)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전날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씨에게 2년간의 보호관찰도 명했다.
검찰은 앞서 결심공판에서 징역 6년을 구형했다.
판결에 따르면 최씨의 아내 A(38·여)씨는 평소 우울증을 앓고 있었고, 지난해에는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시도하기도 했다. 이에 A씨는 지인들이 있는 지방에 한동안 내려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해 12월 중순 다시 서울에 있는 집으로 올라왔는데, 당일 최씨는 A씨가 잠든 틈을 타 새벽시간대에 A씨 휴대전화를 꺼내 보려고 시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최씨의 이같은 모습을 보고 "남의 휴대전화을 왜 보느냐, 아직도 나를 못 믿느냐"라고 따지며 두 사람의 다툼이 시작된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는 싱크대 보관함에 있던 흉기를 꺼내 A씨를 위협했고, A씨가 "객기 부리지 마라, 이제 나에게 안 통한다"라고 말하자 순간적으로 격분해 흉기로 A씨 왼쪽 옆구리를 한차례 찌르고, 얼굴·왼팔·흉부 등 총 5차례 찌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특히 왼쪽 옆구리 급소를 찔려 출혈량이 2ℓ나 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수술을 맡은 의사는 "신장 봉합수술을 하지 않았으면 생명이 위독한 상태였고, 흉기가 좀 더 깊이 들어갔으면 신장 내 대동맥을 건드려 생명이 위험한 상태였다"고 소견을 밝혔다.
사건 당시 최씨는 피를 많이 흘리는 A씨를 보자 겁을 먹고 범행을 멈춘 뒤 119에 직접 신고했는데, 최씨 측은 재판에서 이같은 점들을 바탕으로 '살인 고의가 없었다', '살인 고의가 있었더라도 중지미수에 해당한다'라고 주장해 왔다.
'중지미수'란 범죄 실행에 착수한 자가 범죄가 완성되기 전에 자신의 의사로 범행을 중단하거나 결과의 발생을 방지한 경우를 말한다.
하지만 재판부는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 또는 위험을 인식하거나 예견했다고 볼 수 있는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중지미수 주장과 관련해서도 재판부는 최씨가 "피해자의 부상 부위에서 피가 철철 흐르는 것을 보고 범행을 멈춘
후 119에 신고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범행 중단은 범죄 완수에 장애가 되는 외부 사정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를 자의에 의한 미수로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그럼에도 재판부는 최씨에게 실형은 내리지 않았다.
재판부는 "치명적인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흉기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찌르는 등 그 범행수법이 위험하다"면서도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범행 이후 직접 119에 신고해 피해자가 병원으로 후송되도록 했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에게는 직접 부양하여야 할 초등학생 딸이 있다"고 양형배경을 설명했다.
또 최씨가 2014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원의 처벌을 받은 점 외에 달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도 재판부는 언급했다.
한편 최씨는 지난 결심공판에서 눈물을 흘리며 "둘째 아들이 막내를 보살피며 지내고 있는데, 4월이면 둘째도 군대를 간다. 그러면 아무것도 모르는 초등학생이 달랑 혼자 지내게 되는데 돌봐줄 사람이 없다"면서 재판부에 선처를 요청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