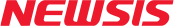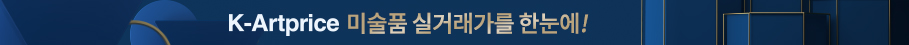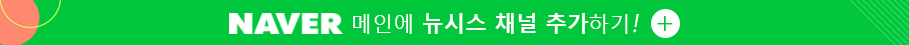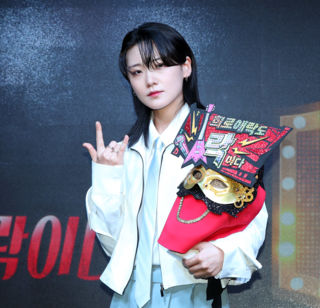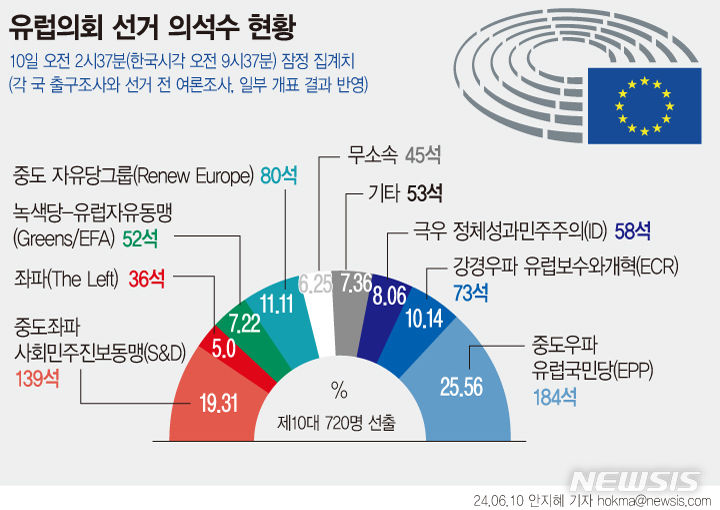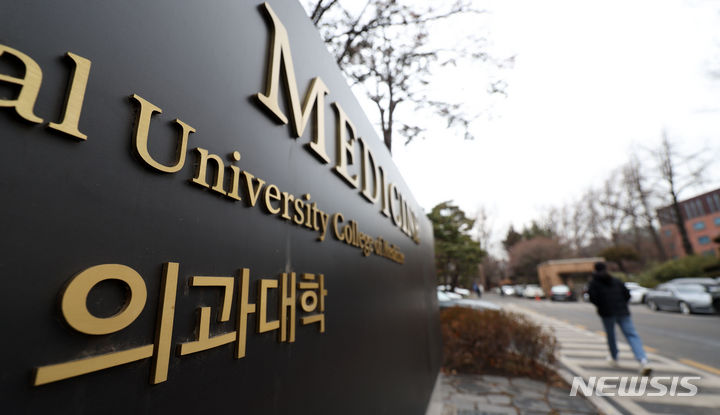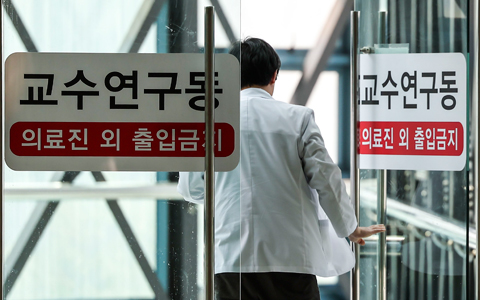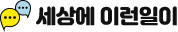"인권유린 속 지옥이었던 곳" 부산 '영화숙·재생원'을 말하다
피해 생존자 증언·토론
"너무 맞아 골병들었다"
진상규명 등 촉구 목소리
![[부산=뉴시스] 김민지 기자 = 24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변호사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집단수용시설 영화숙·재생원 피해생존자의 존엄한 삶을 위한 증언 및 토론회'에서 피해 생존자들이 자신의 경험에 대해 증언하고 있다. 2024.05.24. mingya@newsis.com](https://image.newsis.com/2024/05/24/NISI20240524_0001558605_web.jpg?rnd=20240524142153)
[부산=뉴시스] 김민지 기자 = 24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변호사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집단수용시설 영화숙·재생원 피해생존자의 존엄한 삶을 위한 증언 및 토론회'에서 피해 생존자들이 자신의 경험에 대해 증언하고 있다. 2024.05.24. [email protected]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1950~70년대 인권유린이 자행된 부산의 집단수용시설 '영화숙·재생원'에 머물렀던 피해 생존자의 이야기를 전하고, 해당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24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변호사회 대회의실에서 '집단수용시설 영화숙·재생원 피해생존자의 존엄한 삶을 위한 증언 및 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영화숙·재생원피해생존자협의회(협의회),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 부산지부, 열린네트워크,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한국사회사학회 등의 공동 주최로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총 3부인 ▲"채 피지 못한 친구들을 그리며, 이제는 알리려 합니다" - 피해 생존자 증언 ▲잊혔던 수용시설에서 현재적 사건으로: 형제복지원의 원형, 영화숙·재생원 ▲한국 사회의 책임, 무엇을 어떻게 물을 것인가?로 진행됐다.
영화숙·재생원은 1951년 설립 당시 50여명을 수용하던 소규모 시설 영화숙에서 시작돼 1976년 영화숙·재생원으로 확대됐다. 당시 부랑인으로 여겨진 사람들이 이곳에 납치돼 집단 수용됐으며, 강제 노역과 폭행을 당하는 등 인권 유린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피해 생존자 첫 발언자로 나선 김성주씨는 "어릴 적 한 날 엄마와 떨어져 파출소에서 밤을 새우면서 경찰이 우리 엄마를 찾아줄 것이라 믿고 기다렸지만, 기대와는 달리 트럭 한 대가 와서 나를 어디론가 태워 갔다"며 "그 도착지가 바로 부산 장림동에 있는 영화숙이었다"고 회상했다.
이어 그는 영화숙·재생원에서의 생활에 대해 '하루하루가 지옥이자 악몽'이었다고 비유했다. 김씨는 "너무 맞아서 골병든 사람도 있었고, 또 너무 맞아 앓다가 죽은 아이를 뒷산에 묻은 기억도 난다"며 "동성 간 성폭행도 매일 일어나고, 여자아이들도 성폭행을 당하는 일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부산=뉴시스] 김민지 기자 = 24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변호사회 대회의실에서 '집단수용시설 영화숙·재생원 피해생존자의 존엄한 삶을 위한 증언 및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 2024.05.24. mingya@newsis.com](https://image.newsis.com/2024/05/24/NISI20240524_0001558607_web.jpg?rnd=20240524142257)
[부산=뉴시스] 김민지 기자 = 24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변호사회 대회의실에서 '집단수용시설 영화숙·재생원 피해생존자의 존엄한 삶을 위한 증언 및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 2024.05.24. [email protected]
또 다른 피해 생존자 송태호씨는 "그 많은 피해자 대부분이 전쟁고아도 아니고 정부가 이야기하는 부랑아도 아니다"라며 "영화숙·재생원을 창립한 그분들의 욕심과 현실을 인식하지 못한 당시의 공무원들이 만들어낸 작품이라는 것을 인지하시고, 부디 다시는 이런 탁상머리 작품이 만들어지지 않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피해 생존자 진순애씨는 영화숙·재생원 피해자에 대한 소박한 바람을 전하기도 했다. 그는 "오랜 시간이 이렇게 흘렀는데 이제 와서 정부나 누구한테 바라는 것이 뭐가 있겠냐"며 "그저 고생한 사람들 몇 푼이라도 보상을 조금 받고, 다들 나이 많고 병들었지만 나머지 인생에서 밥이라도 제대로 따뜻하게 먹었으면 한다"고 소망했다.
이어진 2부에서 김일환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잊혀졌던 수용시설, 부산 영화숙·재생원의 역사'를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김 교수는 영화숙·재생원 사건의 의미가 제대로 성찰되지 못하며 이는 형제복지원의 비극으로 이어졌다고 이야기했다.
그는 "영화숙·재생원 시설 폐쇄 이후 1970년대 부산은 빠르게 변화되는 사회에서 관광도시로 발전하기 위한 '관광지 정화' 성격을 부여받으며 부랑인을 계속 격리수용해야 한다는 압력 역시 강화됐다"며 "이후 부산시가 사회복지법인 형제원과 위탁계약을 체결하며 전국 최대 규모의 부랑인 수용시설 '형제복지원'이 탄생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손석주 협의회 대표는 피해 생존자의 존엄한 삶을 위한 사건 해결 방향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는 협의회 요구사항으로 ▲피해 생존자 추가 발굴 조치 및 피해 생존자 추가 진정 ▲협의회와의 공식 협력절차 마련 ▲인권 실태조사 및 지원 예산 마련 ▲진실규명을 위한 연구 및 기록물 접근권 보장 ▲피해 사망자 위령제 및 유해 매장 부지 발굴 계획 수립 ▲국가 수용시설 정책으로 인한 중대한 인권침해 피해 선언 및 재발 예방 등을 이야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