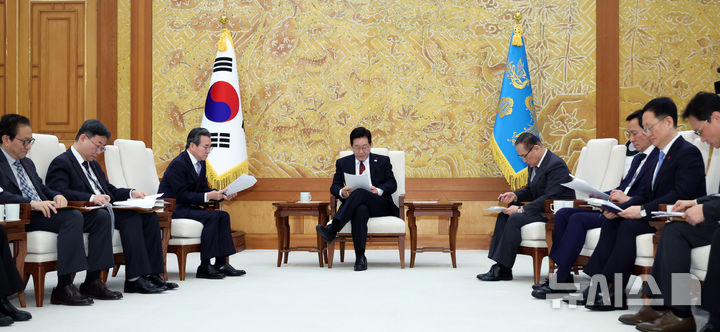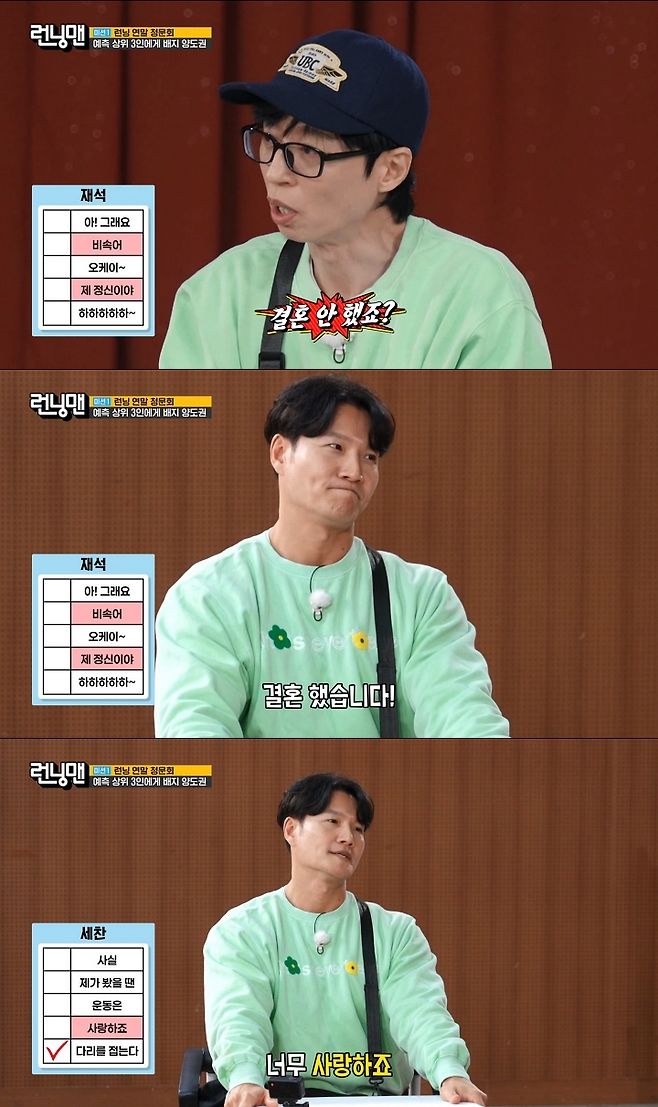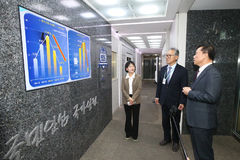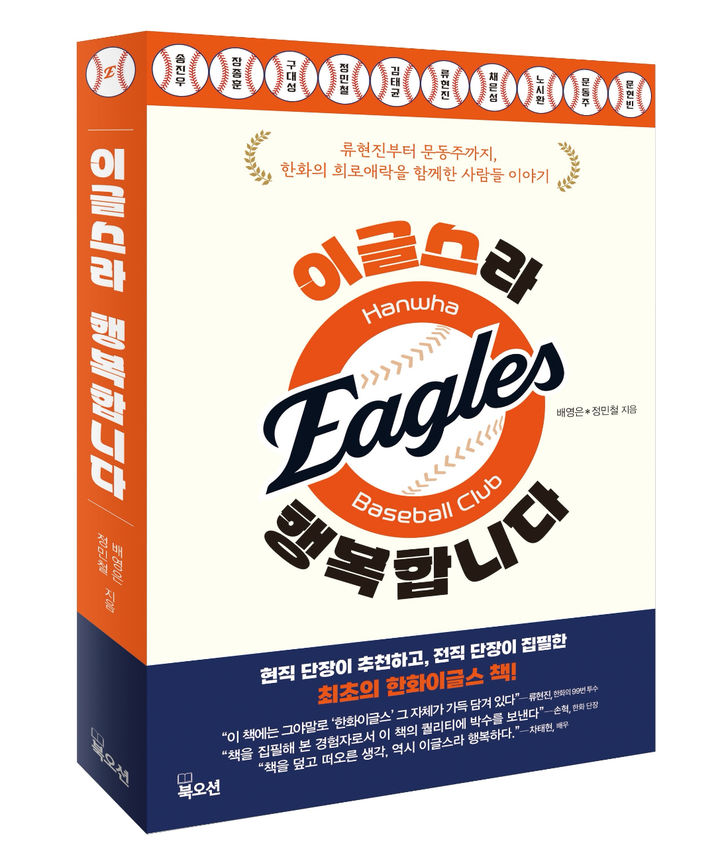화가 오치균, 감나무 열매란 그에게 무엇인가

가난했던 어린 시절 고향집 앞마당에 있던 커다란 감나무는 작가에게 생활고를 해결하기 위한 일거리였다. 어릴 적 가을은 곧 노동의 계절이었던 셈이다.
"가을이 오면 모든 작물을 수확해 돈과 양식으로 바꿔야 했는데 비교적 손질하기가 수월했던 감 수확은 집안의 노동력이 많을수록 좋았다"며 "특히 아이들의 일거리였다"고 옛 기억을 끄집어냈다.
감잎이 빨갛게 물들기 시작할 무렵, 이른 새벽 엄마의 잠 깨우는 소리가 아직도 귀에 쟁쟁하다. "형제들 중 제일 모범생이고 부지런했던 나는 눈을 비비며 팬티 차림으로 바구니를 들고 우리 집에서 가장 멀리 있는 감나무 밑부터 뒤지기 시작해 떨어진 감을 한아름 소쿠리에 주워 왔다"며 "혹시라도 꾸무럭거리다 다른 집 애들이 먼저 감을 주워 갈 때면 몇날며칠 밥상머리에서 엄마의 잔소리를 들어야 했다"고 회상했다.
열심히 따고 주워 잘 닦은 감은 어머니와 함께 새벽 첫차를 타고 시장에 나가 팔았다. "시장에서 감을 팔 때면 엄마가 '감 사세요'를 외치고 나도 따라서 '감 사세요'라고 외쳤다. 엄마를 따라 큰소리로 '감 사세요'를 외쳤는데 이상하게도 내 소리는 밖으로 나오지 않아 거의 들리지 않았다"며 웃는다.
오씨는 "당시 시골 생활은 생각만 해도 지긋지긋하다"고 털어놓았다. 고향 땅을 벗어나는 것이 인생의 목표라고 생각했을 정도다. 공부에 매달린 이유다. 그러나 "대학에 들어가 멀리멀리 고향 땅을 벗어나 다른 일로 돈벌이 투쟁할 때, 그때부터는 그 지겨운 고향 땅이 그리움으로 변했다"며 "빨갛게 떨어진 감잎은 그 어느 시보다도 강렬하게 내 귀 속에서 바삭거린다"고 그리워했다.

서울 신사동 갤러리현대 강남에 다양한 시간을 담은 감 작품 10점을 24일부터 선보인다. 2009년부터 올해까지 작업한 4년 만의 신작 '감' 시리즈다. 작품의 풍경 속에 감나무를 종종 담아왔지만 감이 주제가 되는 시리즈는 처음이다.
정겹던 옛 시절이 떠오르게 하는 감나무에 대롱대롱 매달린 작품 속 붉은 감은 가을을 흠뻑 머금고 있다. 감은 마치 살아 움직이는 듯 역동적이다. 다양한 리듬으로 감기고 뻗어나가는 가지와 불타오르는 것만 같은 감은 저마다의 사연으로 빛을 발한다.
새벽 동트는 찰나를 만나는 감, 한낮의 햇빛을 머금은 감, 넝쿨 위로 감겨 올라간 감나무 등이 생명체로 제 각각 꿈틀거린다. 9월20일까지 볼 수 있다. 02-519-0800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