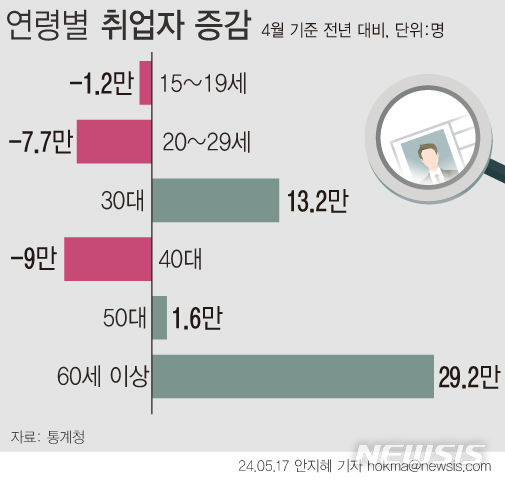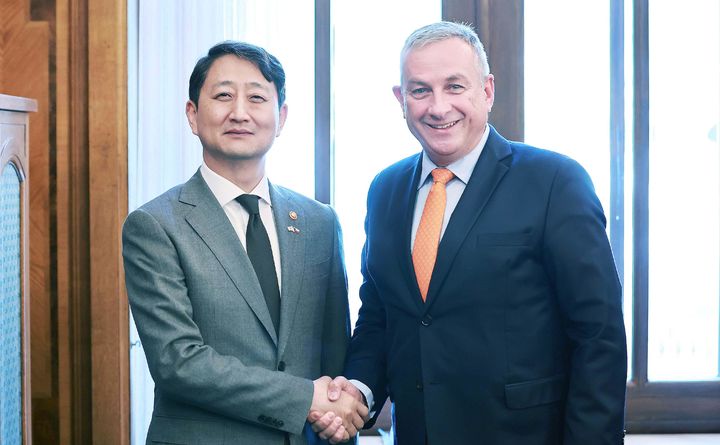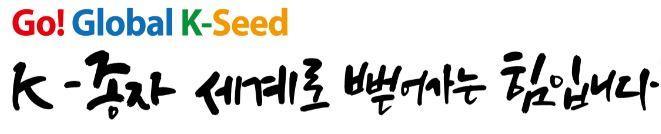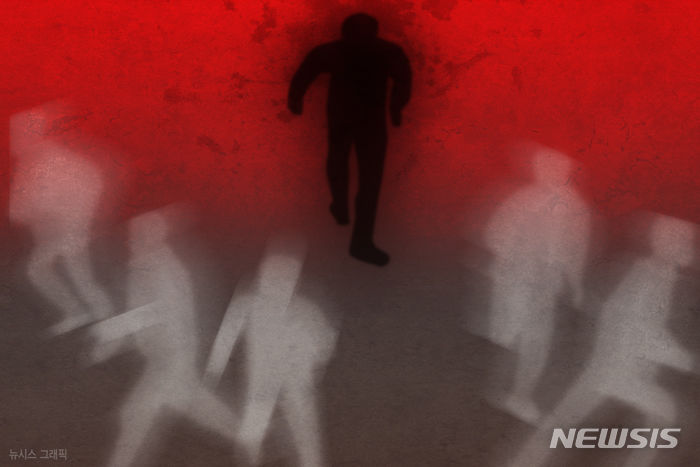'SK배임 혐의' 책임 피한 최태원…"공모한 증거 없었다"
검찰, 최태원 배임 혐의 적용 못해
"의심되는 정황 있지만 증거 없어"
수감·재판 중 상황서 보고 못 받아
관련 사건은 종결, 추가 수사 없어
![[서울=뉴시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지난 18일 오전 최종현 학술원이 온라인으로 주최한 '동북아의 미래와 한미동맹' 세미나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사진=최종현학술원 유튜브 캡쳐) *재판매 및 DB 금지](http://image.newsis.com/2021/05/18/NISI20210518_0000749397_web.jpg?rnd=20210518174242)
[서울=뉴시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지난 18일 오전 최종현 학술원이 온라인으로 주최한 '동북아의 미래와 한미동맹' 세미나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사진=최종현학술원 유튜브 캡쳐) *재판매 및 DB 금지
당시 수감·재판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보고를 받지 못했을 거란 설명인데, 의심되는 정황은 있지만 최태원 회장이 최신원 회장 의혹에 개입했다는 명확한 증거를 찾지 못해 이러한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2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전준철)는 이날 'SK그룹 2인자'로 꼽히는 조대식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 등 그룹 관계자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을 처분하면서 그룹 계열사인 SKC가 SK텔레시스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과정을 그룹이 주도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최신원 회장의 강력한 요구가 있었고, 그룹 지주사는 이를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것이다.
특히 조 의장의 경우 첫 유상증자가 이뤄졌던 2012년 지주사인 SK주식회사의 재무팀장이자 자율책임경영지원단장으로 그룹 전체 계열사의 재무·경영진단을 하는 등 그룹 내 중책을 맡은 인물로 판단했다.
하지만 검찰은 최태원 회장까지 배임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고, 입건조차 하지 않았다. 조사를 할 상당한 필요성으로 서면조사까지 진행했지만 최신원 회장이 최신원 회장과 공모했다고 할 만한 증거를 찾지 못했단 취지다.
일단 검찰은 조 의장 등이 최태원 회장에게 SKC가 SK텔레시스 유상증자에 참여할 예정이라고 보고했다고 했다. 이어 최태원 회장은 SK텔레시스가 자본잠식으로 회생이 불가능한 상태인 점 등을 알고 있었지만, 이를 승인했다고도 판단했다.
다만 최태원 회장의 경우 조 의장 등이 SKC 사외이사들을 속여 유상증자 승인을 받는 등 구체적인 진행상황을 보고 받았다고 볼 만한 증거를 찾지 못해 배임 혐의는 적용할 수 없었단 설명이다.
검찰은 2012년 유상증자 당시엔 최태원 회장이 '2000억원대 횡령·배임 의혹'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어 유상증자 상황을 보고 받지 못한 것으로 봤다. 아울러 2015년 유상증자 시기엔 최태원 회장이 대법원서 징역 4년을 확정 받아 수감 중인 상황이었다.
검찰은 최태원 회장이 유상증자 요구가 있어서 승인을 했지만, 불법적인 과정들을 보고 받거나 그 과정을 지시한 흔적은 없다고 했다. 검찰 관계자는 "최태원 회장이 관련 보고를 받았다는 증거를 찾기 어려웠다"고 했다.
다만 이를 승인한 배경으로 최태원 회장이 최신원 회장의 요구를 거절해 경영권 분쟁 등에 휘말릴 경우 재판서 불리해지는 점, 수감 중 사면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 여론이 악화될 수도 있다는 점 등을 우려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선 최태원 회장이 자신의 목적을 위해 SK텔레시스가 부실한 회사인 것을 알고도 유상증자를 승인한 것은 배임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그러나 검찰은 "의심되는 정황이 있지만 유상증자 실행 과정을 정확히 인식하고 관여했다고 인정할 구체적인 증거가 확인되지 않았다"고만 답변했다. 소환조사 없이 서면으로만 조사를 마무리한 이유라고도 부연했다.
검찰은 이날로 관련 수사를 모두 마무리했다. 최태원 회장 등 그룹 관계자 추가 수사 역시도 진행하지 않을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