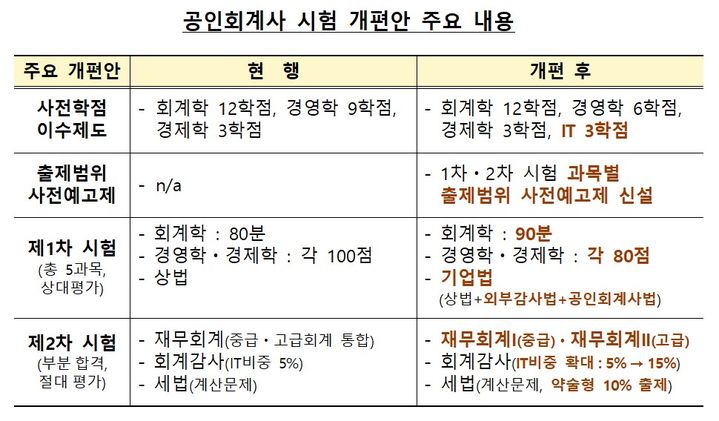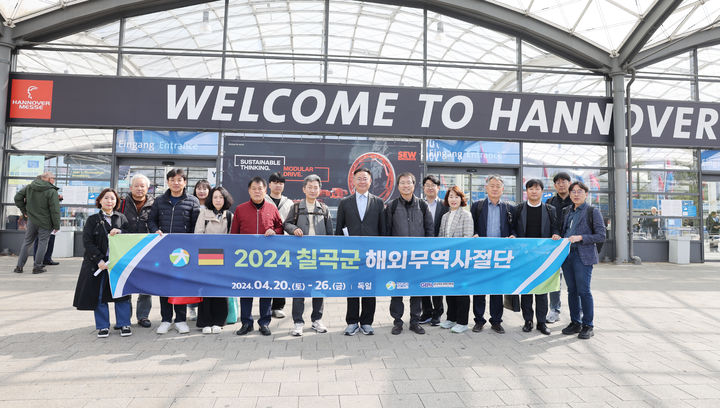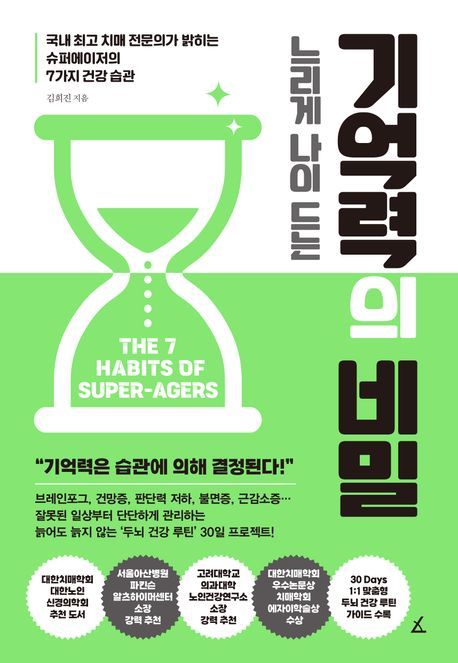넘쳐나는 우주쓰레기에 저궤도 사용 한계…美 청소 계획 본격 추진
'우주 파편 늘어 제궤도 사용 불가능'
케슬러 효과 이미 일부 궤도에서 진행중
기후변화처럼 국제사회 공동대응할 문제
![[알렉산드리아=AP/뉴시스]우주 전문 매체 '스페이스 뉴스'와 국제 학술지 '네이처' 등은 오는 4일 달의 후면에 4t가량의 우주 쓰레기가 9300kph의 속도로 충돌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 우주 쓰레기의 실체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사진은 미 항공우주국(NASA)가 제공한 2011년 달 뒷면 사진. 2022.03.02.](http://image.newsis.com/2022/03/02/NISI20220302_0018545958_web.jpg?rnd=20220302153308)
[알렉산드리아=AP/뉴시스]우주 전문 매체 '스페이스 뉴스'와 국제 학술지 '네이처' 등은 오는 4일 달의 후면에 4t가량의 우주 쓰레기가 9300kph의 속도로 충돌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 우주 쓰레기의 실체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사진은 미 항공우주국(NASA)가 제공한 2011년 달 뒷면 사진. 2022.03.02.
[서울=뉴시스] 강영진 기자 = 지구 주변 우주궤도를 도는 인공위성과 우주 파편이 근접 거리에 놓이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미 정부가 우주쓰레기 청소를 검토중이라고 미국의 인터넷 매체 액시오스(AXIOS)가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시속 2만7360km로 지구 주변을 도는 우주쓰레기가 수천 개에 달해 인공위성과 우주정거장을 위협하고 있다.
모리바 자 프리버티어 스페이스사 공동설립자는 "우주의 많은 지역이 쓸 수 없게 됐으며 앞으로 몇 년 내 사고가 터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미 백악관은 지난달 말 우주 파편을 추적해 경로를 바꾸고 필요할 경우 제거하는 실행계획을 발표했다. 전 정부가 세운 방안을 세부화한 내용이다.
여러 기관이 참여해 작성한 계획에 우주쓰레기 청소, 추적, 억제를 담당하는 부서가 지정됐다. 또 저궤도에 있는 직경 1cm 이하의 파편도 추적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밖에 발사 뒤 궤도에 남는 로켓 등 우주 파편이 궤도에 머물수 있는 기한도 논의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국제적으로 공인된 기준은 폐기된 인공위성과 로켓이 25년까지 궤도에 머물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만 이것이 너무 느슨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지난달 중국 로켓과 스페이스X사 캡슐 조각이 통제되지 않은 채 낙하한 일과 궤도에 있는 위성과 파편이 충돌하는 가능성이 갈수록 많아질 것으로 경고한다.
아스트로스케일 US사 룩 리스벡은 우주쓰레기간 충돌이 발생해 파편이 늘어나면서 저궤도상 우주 파편 밀도가 일정 수준을 넘으면 저궤도 사용이 불가능해질 것이라는 케슬러 효과(미 항공우주국(NASA) 과학자 이름을 딴 이론)가 이미 일부 궤도에서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우주쓰레기 청소작업은 한나라가 책임지고 처리할 수 있는 과제가 아니다.
전문가들은 기후변화 문제와 마찬가지로 많은 나라들이 공동 규범을 정해 적극적으로 우주 파편 제거와 무력화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한다.
백악관 과학 및 기술정책 담당 부국장 에진 우조-오코로는 "우주 파편은 국제적 문제지만 미국이 주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유럽, 일본과 달리 미국은 아직 우주청소 작업을 공식화하지 않았다. 계획이 실행 단계까지 진전되지 못한 것이다. 궤도에서 쓰레기를 정기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필요한 규제 틀도 실제 청소작업에 나서는 국가가 만들기 전까지는 복잡한 문제로 남는다.
한나라가 다른 나라의 우주 쓰레기를 치울 경우 다른 나라의 인공위성을 간섭하는 행위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
우주 쓰레기 청소는 국가적 자존심의 문제이기도 하다. 안전한 세상 재단의 빅토리아 샘슨은 "우주에 많은 것을 발사할 계획이 없거나 우주 공간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나라들로선 자신들이 우주 쓰레기를 직접 청소할 능력이 없다는 것이 굴욕스럽게 느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백악관이 제시한 계획이 실행되려면 의회가 예산을 뒷받침해줘야 한다.
프리버티어 스페이스사의 자 공동 설립자는 "의회가 예산을 배정하면 담당 부서가 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 시점까지 온 것이 반갑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