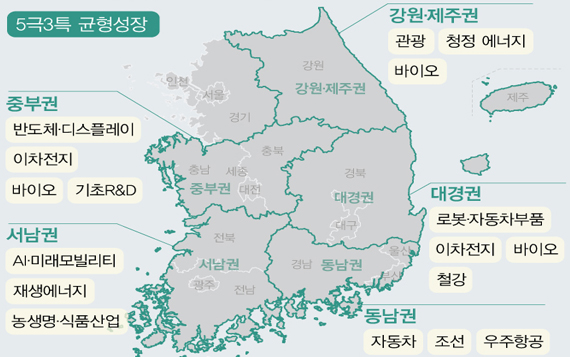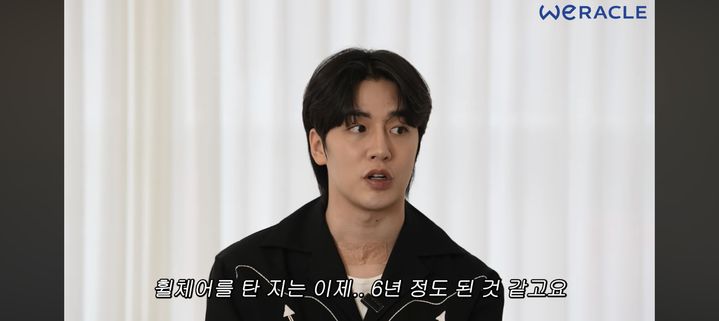소설 항왜 김충선<9>갓난이와 무사 "모두 죽인다"

어린 사야가는 증오나 저주의 말뜻을 알지 못했다. 그러나 파도를 오히려 삼키려는 수연의 절규를 단지 짐작할 뿐이다. 그런데 이들 모자의 새벽 안개바다에 불청객이 등장했다.
“응애…응애….”
어린 아기의 울음소리였다. 바다 소리와 수연의 탄식 사이에서도 갓난 아기의 울음은 신기하게 높고 널리 퍼져 나갔다. 도저히 이른 새벽에 들을 수 있는 울음이 아니었다. 새벽의 바다에서 좀처럼 볼 수 없는 광경이 벌어졌다.
‘뚜벅뚜벅!’
한 필의 말을 끌고 전투복 차림의 일본인 무장이 등장한 것이다. 갓난 아기의 울음소리는 무장의 등 뒤 포대 속에서 울려왔다. 헝겊으로 겹겹이 감춰 있어 아기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사야가는 이른 새벽에 목격하게 된 전투복장의 무사에게서 일종의 위압감을 느끼고 몸을 도사렸다. 그러나 수연은 상대에 대해서 개의치 않고 있었다. 오히려 그녀의 목청은 더욱 더 높아갔다.
“그 사람이 너무나 보고프다…사야가!”
사야가는 두려운 눈빛으로 일본인 무사를 훔쳐봤다. 그러나 그 무사 역시 사야가 모자에게는 관심이 없는 듯 새벽 바다만을 뚫어지게 노려보고 있을 뿐이었다.
‘누구지?’하는 의구심이 들었다. 비록 어린 소견이지만 마을에서 전투복장의 무사를 보는 일은 매우 드물었다. 더구나 그 사람은 갓난 아기를 포대에 업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적이 전혀 없는 새벽 바다에 나타난 것이다. 그러다가 문득 무사의 시선이 사야가 모자에게로 향했다.
“….”
사야가는 섬뜩한 심정이 돼 모친 수연의 품 안으로 기어 들어갔다. 무사의 눈초리가 야수와 다름없이 번쩍거렸기 때문이었다. 그래도 수연은 사야가의 귀에 자신의 이야기만 속삭였다.
“너도 조선을 좋아하게 될 것이다. 봄에는 들과 산 지천으로 아름다운 들꽃이 향기를 뿜어내고, 여름에는 산과 계곡이 파랗게 빛난다. 강과 바닷가에 아이들 흥겨움이 끊이지 않는다. 가을은 곡식으로 풍성하고, 하늘이 청명하며 웃음이 그득하다. 겨울은 가족과 이웃, 친구들이 따뜻한 화로에 둘러앉아 도란거리며 정을 쌓는다.”
“엄마…무서워요.”
“조선은 그런 나라다.”
“어서 집으로 돌아가요.”
“그래…난 조선의 내 집으로 너무 돌아가고 싶다. 이 바다를 단숨에 건너서!”
수연은 아들을 더욱 강하게 끌어안으며 보이지 않는, 도저히 보일 수 없는 현해탄 저 너머의 조선을 그리워한다. 이때 말발굽 소리가 요란하게 울리면서 한패거리의 인마가 모습을 드러냈다.
“저기다!”
금일의 새벽 바닷가에는 평상시와 다른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었다. 역시 전투복을 착용하고 있는 군사들이 우르르 몰려들어서 갓난 아기를 업고 있던 무사를 포위하였다.
“토다! 더 이상 도주할 곳은 없다.”
아시가루(보병)의 군사들은 장창을 꼬나 쥐고 토다라 불리는 무장에게 천천히 조여 들어갔다. 잠시 울음을 멈췄던 아기가 그 기운을 느꼈던지 또 세차게 울기 시작했다.
“으앵…응애.”
토다는 포대를 토닥거리면서 다른 한 손으로는 말에 매달아 놨던 칼을 칼집에서 꺼내 들었다. 새벽안개를 일거에 도륙 낼 듯이 시퍼런 섬광이 뿜어졌다. 사야가의 눈이 순간적으로 감겨졌다.
“모두 죽인다!”
사내에게서 음산한 조선말이 튀어 나왔다. <계속>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