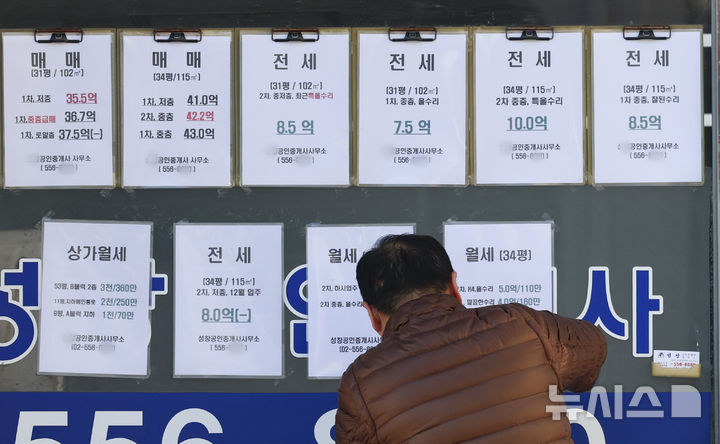새 대법관 후보 제청한 김명수…용산 '거부 검토' 고려했나
윤석열 정부 들어 두 번째 대법관 교체
정계선·박순영 후보 '대통령실 거부 논란'
제청된 서경환·권영준, 비교적 '중립' 평가
![[서울=뉴시스]김명수 대법원장은 9일 조재연·박정화 대법관의 후임으로 서경환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권영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청했다.](https://img1.newsis.com/2023/06/09/NISI20230609_0001286323_web.jpg?rnd=20230609180858)
[서울=뉴시스]김명수 대법원장은 9일 조재연·박정화 대법관의 후임으로 서경환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권영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청했다.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오는 7월 퇴임하는 조재연·박정화 대법관 후임으로 서경환 서울고법 부장판사(57·사법연수원 21기)와 권영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52·25기)를 임명제청했다. 법원 안팎에선 앞서 특정 대법관 후보들을 두고 불편한 심리를 드러낸 대통령실과의 갈등을 피하기 위한 결정을 내린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9일 법원에 따르면 김 대법원장은 이날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8명의 후보자 가운데 서 부장판사와 권 교수를 대법관으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했다.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서 부장판사는 서울지법 서부지원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지법 판사,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으며 지난 2월부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맡고 있다.
서 부장판사는 IMF 외환위기 당시 2년간 대기업 법정관리 등 도산사건을 담당한 이래 도산법 분야에서 다양한 실무경험을 쌓았다. 서울회생법원 수석부장판사 직무대리, 서울회생법원장을 차례로 역임했고 현재 도산법분야연구회장을 맡고 있다.
권 교수는 서울대 법학과를 나와 박사까지 수료한 뒤 서울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했다. 대구지법 판사,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판사 등을 거쳤으며 지난 2015년부터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권 교수는 판사 재직 중엔 재판을 원만히 진행했으며 판결문 작성 능력이 뛰어났다는 평가를 받는다. 서울대 법과대학 조교수로 부임한 2006년 이래로는 민법뿐 아니라 지식재산권법, 개인정보보호법, 국제거래법 등 폭넓은 분야에서 연구활동을 벌여온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전원합의체 선고를 위해 자리에 앉아있다. (공동취재사진) 2023.05.11.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3/05/11/NISI20230511_0019882976_web.jpg?rnd=20230511144717)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전원합의체 선고를 위해 자리에 앉아있다. (공동취재사진) 2023.05.11. [email protected]
법조계에선 김 대법원장이 대통령실과의 갈등 국면을 피하기 위한 인사를 택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최근 대통령실에서 특정 이념 성향을 이유로 일부 후보들에 대해 임명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논란이 됐다. 이에 김 대법원장이 해당 후보들을 제청하는 것이 부담됐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대통령실이 거부 의사를 드러낸 것으로 알려진 후보는 정계선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와 박순영 서울고법 판사다. 정 부장판사는 진보성향의 법관 모임으로 알려진 우리법연구회·국제인권법연구회 경력이 있고, 박 판사는 김 대법원장이 2021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관위원으로 지명한 인물이다.
이번에 김 대법원장이 제청한 서 부장판사와 권 교수에 대해선 상대적으로 중립적이라는 평가가 있다.
한 판사 출신 변호사는 "김 대법원장이 이전에 제청한 분들도 훌륭했지만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경력으로 딱지가 붙으면서 어떤 판결을 내려도 설득력이 떨어지는 면이 있었다"며 "(서 부장판사와 권 교수는) 정치적인 색깔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서 부장판사와 권 교수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친 뒤 윤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게 된다. 윤석열 정부 들어 대법관 교체는 오석준 대법관 이후 두 번째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