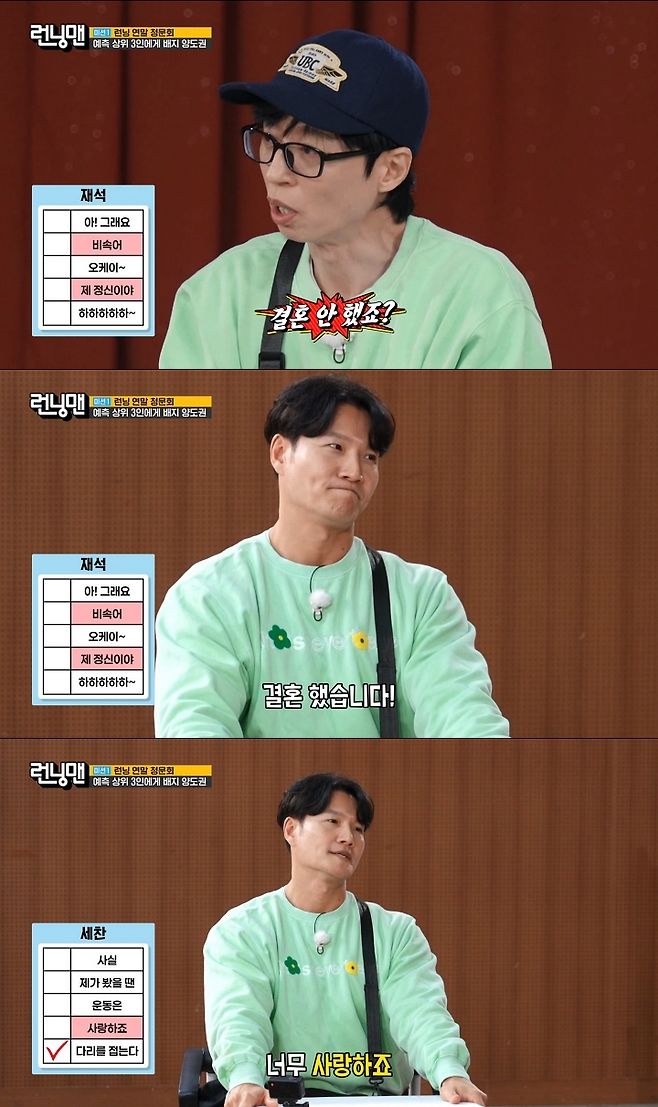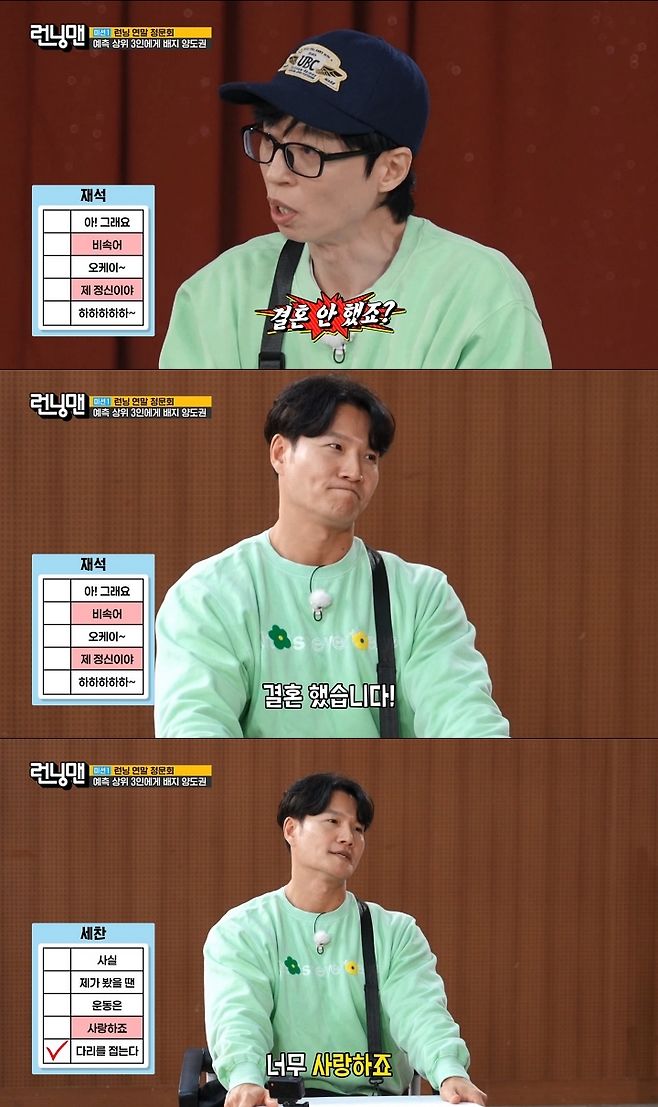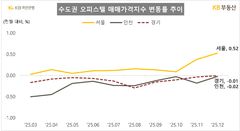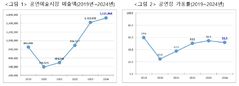[한상언의 책과 사람들] ‘씨네마팬’이 불러온 영화잡지의 추억
![[서울=뉴시스] 씨네마팬 (사진= 한상언 영화연구소대표 제공) 20223.02.2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3/02/21/NISI20230221_0001200765_web.jpg?rnd=20230221160558)
[서울=뉴시스] 씨네마팬 (사진= 한상언 영화연구소대표 제공) 20223.02.2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영화는 현실을 지독하게 사실적으로 반영해 보여주기도 하지만, 현실과 동떨어진 꿈과 환상을 관객들에게 펼쳐 보여주기도 한다. 그래서인지 영화관은 세상의 불합리한 진실을 알리고 학습하는 ‘학교’이면서, 현실에서 이루기 힘든 꿈을 제시해 보여주는 ‘꿈의 궁전’이기도 하다. 특히 전통적으로 미국영화는 모험과 사랑이라는 낭만적인 소재와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평범한 사람들의 성공담을 테마로 만들어지기에, 이런 미국영화가 만들어지는 할리우드를 일컬어 ‘꿈의 공장’이라 부르기도 한다.
1950년대 우리에게 영화는 전쟁이 만들어 낸, 외면하고 싶은 현실에서 빠져나와 꾸는 한편의 꿈이었는지도 모른다. 1954년 시행된 국산영화 입장세 면세조치와 이규환 감독이 연출한 ‘춘향전’의 흥행 성공으로 우리나라 영화 산업은 급속도로 팽창했다. 그와 별도로 할리우드 영화를 비롯한 많은 외국영화들이 도시의 영화관을 환하게 밝혔다.
영화 산업이 성장하면서 영화잡지들도 하나, 둘 등장하기 시작했다. 그중 ‘국제영화’와 ‘영화세계’는 1950-60년대를 대표하는 양대 잡지였다. 그 외에도 많은 영화잡지들이 명멸해 갔다. 그중 특기할 만한 잡지로 ‘씨네마팬’이 있다. 1960년 1월 창간된 이 잡지의 발행인은 ‘영화세계’가 1957년 창간됐을 당시 발행인인 강인순이었다. 그녀는 ‘영화예술’ 1959년 신년호에 남편과 사별한 배우 조미령이 호텔에 드나들면서 산부인과에서 진료를 받았다는 식의 악의적인 기사를 게재해 문제가 되었다. 소위 ‘조미령 사태’로 강인순이 일선에서 물러났고, ‘영화세계’는 사촌동생인 강대선에게 넘겨주었다.
그러나 ‘국민보’ 출판국장을 비롯해 ‘영화세계’ 발행인을 역임했던 강인순은 잡지계를 아예 떠날 수 없었던 것 같다. 얼마 후 그녀는 다시 영화잡지를 시작하는데, 그게 바로 ‘씨네마팬’이다. ‘씨네마팬’은 창간 당시 여성 발행인과 여성 편집주간이 만든 잡지로 이채를 띠었다. 당시 편집주간은 영화감독 박남옥이었다. 그녀는 1955년 ‘미망인’을 연출해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감독이라는 타이틀을 얻은 인물이었다. 하지만 ‘미망인’이 흥행에서 실패하면서 후속작을 만들 기회가 없었다. 그러다보니 1957년부터 영화계를 떠나 둘째 언니 부부가 운영하던 동아출판사에 근무했다. 그러던 중 ‘씨네마팬’의 편집주간 제의를 받은 것이다. 그러나 박남옥이 영화잡지를 만든 시기는 불과 1년도 안 됐다. 동아출판사의 일이 많아지면서 ‘씨네마팬’의 편집을 맡는 일이 힘들어진 탓이다.
박남옥에 이어 잡지 편집을 맡은 이는 편국도신문 사회부 기자 출신으로 ‘씨네마팬’의 취재부장이던 편거영이다. 편거영은 제호를 ‘씨네팬’으로 바꿨다. 또 자신이 쓴 씨나리오를 잡지에 게재했는데, 이 작품들이 영화로 만들어지게 되자 잡지사를 나와 전문 시나리오작가로 활약하다가 영화감독으로 데뷔까지 했다.
편거영 이후 ‘씨네팬’은 김영대 편집장을 거쳐 정인영 편집장으로 이어졌다. 정인영 편집장 시절 다시 제호를 ‘씨네마’로 바꿨다. 영화에 대해 문외한이던 김영대-정인영 편집장 시절, 영화평론가 김종원 선생이 동성영화사에서 퇴사해 잡지 편집에 깊숙이 간여했다. 그 결과 김종원 선생은 20대의 어린 나이에 김규동 시인이 발간하던 ‘영화잡지’의 창간 편집장을 맡기도 한다.
내가 소장하고 있는 ‘씨네마팬’ 1960년 4월호는 시나리오 작가이자 극작가로 유명한 하유상 선생이 소장하던 것이다. 하유상은 이 당시 ‘씨나리오문예’라는 영화잡지를 발간하고 있었다.
작년 영화강좌를 준비하면서 현재 상업적 목적의 영화잡지는 ‘씨네21’ 하나만 남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마저 영향력이 예전 같지 않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1919년 최초의 영화잡지 ‘녹성’이 만들어진 이후 수없이 명멸해 간 영화잡지는 영화에 대한 지식과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역할을 했다. 과거 영화잡지의 역할은 지금 유튜브와 네이버·다음 같은 인터넷 포털이 대신하고 있다. 한 세기를 풍미한 영화잡지가 사라지듯, 시간은 흐르고 새로운 것은 낡은 것을 대체한다. 이것이 순리라는 생각이지만, 한 시대가 추억으로 사라진다는 점에서 낡은 잡지를 펼쳐 보는 것이 쓸쓸할 뿐이다.
▲한상언 영화연구소대표·영화학 박사·영화사가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