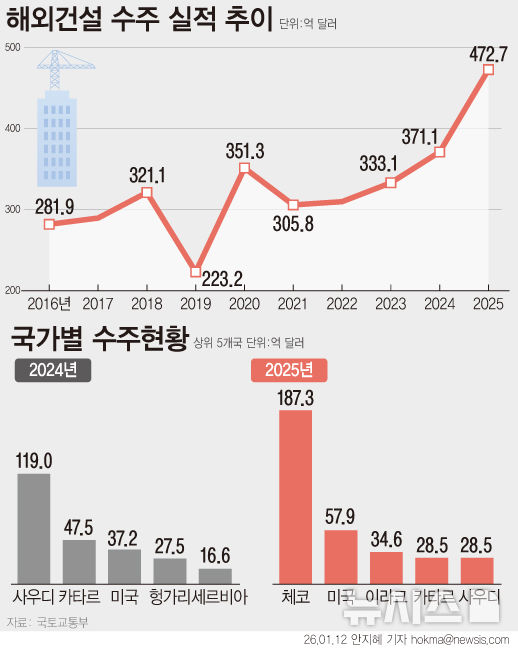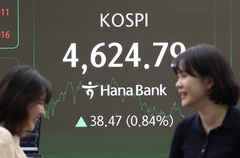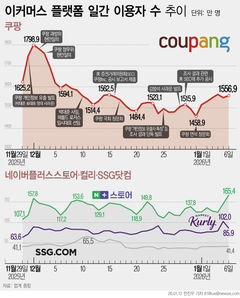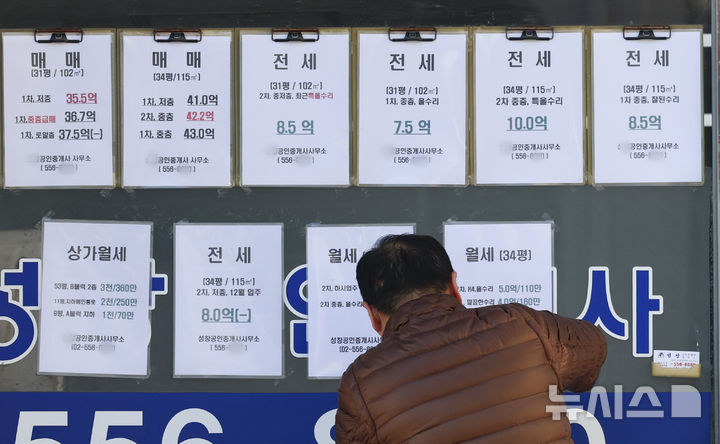이동관, 아들 학폭 논란에 "졸업 후에도 친한 사이…가짜뉴스 멈춰달라"(종합)
입장문 내고 "사실여부 떠나 학폭논란 송구"
"대응 자제해왔으나 카더라식 폭로 이어져"
"관련 학생들에 정신적 피해 이어져 우려"
"선도위, 전학 조치…조건 없이 수용했다"
"母, 담임 압박했단 주장, 음해성 유언비어"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이 7일 오전 서울 강남구 이명박 전 대통령 사무실에 도착하고 있다. 2018.03.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미영 기자 = 차기 방송통신위원장으로 거론되는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는 8일 "제 자식이 고교 재학 중 학폭 논란이 빚어진 데 대해 대히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이 특보는 이날 대통령실 출입기자들에 입장문을 내고 "사실관계를 떠나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공직 후보자로 지명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에 대한 각종 의혹에 대응하는 것이 인사권자에 대한 도리가 아니며, 정도(正道)도 아니라고 생각해 그간 공식 대응을 자제해 왔다"며 "그러나 최근 야당 대표까지 나서 무차별한 '카더라'식 폭로를 지속하고, 이것이 왜곡 과장되어 언론과 SNS 등을 통해 확대 재생산되고 있는 상황에 더는 침묵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입장문을 내는 이유를 밝혔다.
이어 "저와 제 가족은 차치하더라도 무엇보다 사회의 일원으로 성실히 살아가고 있는 관련 학생들에게 정신적, 실질적인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가장 우려스럽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소한의 사실관계를 바로 잡기 위해 입장문을 발표하니 정치권부터 정쟁을 위한 무책임한 폭로와 가짜뉴스 생산을 멈춰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이 특보는 해당 논란과 관련해 조목조목 설명했다.
이 특보는 2011년 1학년 재학 당시 아들과 같은 반 학생 A군 상호간 물리적 다툼이 있었던 건 사실이나 일방적 가해 상황은 아니었던 데다, 당시 당사자 간에 이미 사과와 화해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그는 "오히려 A군은 아들에 대한 처벌과 전학 조치를 하지 말 것을 담임교사와 교장에 호소했다"며 "당시 담임교사도 이러한 사실을 2015년 언론 인터뷰에서 증언했다"고 했다.
이어 "아들과 A씨는 고교 졸업 후에도 서로 연락하고 지내는 친한 사이"라며 "학폭 피해자였다면 있을 수 없고 상상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전학과 관련해선 "당시 학교 선도위원회 결정으로 아들에 대해 학기 중 전학조치가 내려졌다"며 "당시 사안은 '당사자들이 화해하고, 처벌을 불원한 케이스'로 9가지 징계처분 중 접촉 보복 금지, 교내봉사에 해당하는 경징계 대상이나 시범케이스로 중징계 처분을 받은 것 같다는 게 복수의 학폭 전문변호사의 견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녀의 장래를 생각한다면 선도위 결정 불복과 법적 대응 등 여러 조치를 취하며 징계를 늦출 수도 있었지만 전직 고위공직자 신분으로 낮은 자세로 임하는 게 타당하다 생각해 선도위 결정을 조건없이 수용했다"고 했다.
이 특보는 부인이 학교를 찾아가 이의를 제기한 교사들 명단을 적어달라고 하는 등 담임교사를 압박했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 "전혀 사실과 다른 음해성 유언비어"라며 "이를 주장한 교사도 전언(傳言)이라는 식으로 루머를 퍼뜨렸다"고 밝혔다. 해당 교사는 전교조 소속으로 MBC 등 외부에 관련 문건과 학생 개인 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특보는 "어떤 부모도 자식을 가르치는 선생님 앞에서는 '을(乙)중의 을'일 수 밖에 없는 것이 한국 교육 현장의 현실"이라며 "가짜뉴스는 학부모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해 법적 대응도 검토했으나 모든 것을 법으로 풀기보다 비록 억울한 점이 있더라도 보다 낮은 자세로 임해야 한다는 생각에 그동안 일체 대응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