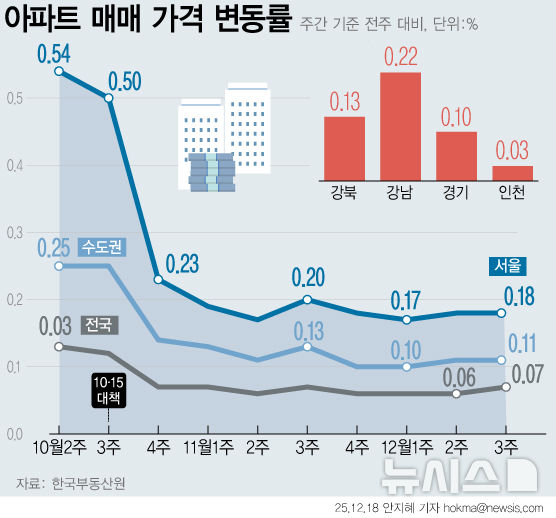한국이 4D영화 종주국이라고? 누가 그래…

이른바 4D 영화 관련으로 대대적인 보도가 나왔다. 그것도 한국이 4D 영화 종주국이라는 대범한 주장을 담았다. 4D는 기존 3D 상영관에 특수장치를 가동시켜 관객의 촉각, 후각, 방향 감각까지 자극하는 관람 시스템을 가리킨다.
조선일보 6월30일자 기사 ‘4D…어떤 감각도 쉴 틈 없는 영화관의 미래’는 “미국 유니버설 스튜디오 등 일부 놀이공원에서 홍보용 정도로 사용되던 4D 영화 기술을 일반 극장용 영화로까지 발전시킨 것은 한국이 처음이다. 2009년 1월 CGV가 할리우드 가족영화 ‘잃어버린 세계를 찾아서’를 4D로 만들어 상영한 게 세계 최초의 4D 극장 영화라고 한다”면서 “4D 영화관은 최근 들어 중국 등 해외로까지 수출되고 있다. ‘슈렉’ ‘쿵푸팬더’의 제작자이자 드림웍스 CEO인 제프리 카젠버그가 얼마 전 “영화관의 미래를 알려면 한국의 극장에 가라”고 얘기했을 정도로 4D는 이제 한국의 ‘문화 수출상품’으로 발전될 가능성까지 보여주고 있다”고 전했다.
기사는 또 국내 4D 기술의 면면도 자세히 소개했다. “각 장면별 시놉시스 초안이 완성되면 4D 제작팀은 각 특수효과를 어느 시점에 사용할지를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만든다. 영상과 특수효과가 초 단위까지 똑같은 시점에 일어나야 하기 때문에 최소 1주일에서 길게는 열흘 이상 걸리는 고난도의 작업”이라면서 “겉으로 보면 특수효과의 성찬(盛饌)이지만 사실 4D 제작자들이 가장 신경 쓰는 것은 “영화의 이야기와 감정선(感情線)”이다. “4D 제작은 기본적으로 영화 자체에 충실하게 보조적인 효과를 덧입히는 것”(롯데시네마 4D 프로그래머 최묵 실장)이라는 것이다. CGV 박혜영 과장은 “특수효과가 너무 과도하면 관객이 영화에서는 감동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 오히려 4D 효과는 적절히 자제하려고 힘쓴다”고 했다”고 전했다.
기사만 보면 분명 뭔가 큰일이 일어난 것도 같다. 3D 기술에선 비록 미국에 밀렸지만 4D 기술을 선점해 역전에 나선 것처럼도 여겨진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그렇지가 않다.
일단 한국은 4D 영화를 만들어낸 게 아니다. 한국은 아직 전체 3D 영화도 만든 바가 없다. 몇몇 3D 기획들이 등장하긴 했지만 대부분 다 기획과정에서 소위 ‘엎어졌다.’ 그러니 한국에서 시도하는 기술은 엄격히 말하자면 4D 영화 기술이 아니라, 할리우드의 3D 영화를 상영할 시 이를 4D로 옮겨내는 기술, 즉 영화 상영관에 각종 장치들을 동원해 감상효과를 늘려주는 장치기술에 불과할 따름이다.
이런 식의 장치기술은 딱히 고난이도의 노하우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사실 맘만 먹으면 웬만한 기술중진국 정도면 모두들 큰 어려움 없이 할 수 있다. 기사 중에도 이미 “보통 10~20일간의 공정을 거쳐 완성된다”고 밝히고 있다. 식당 인테리어 공사보다도 짧게 걸린다. 극히 단순한 장치기술이란 얘기다.
그런데 이 단순 장치기술을 놓고 왜 한국이 선두주자인양 보도되고 있을까. 한국이 이 기술을 가장 먼저 ‘일반극장’에 도입했기 때문이다. 나머지는 모두 놀이공원 등에서 시도했던 게 전부라는 것이다.
그런데 그런 놀이공원도 하나하나 따져보면 ‘놀이공원 내 영화관’에서 시도했던 것들이다. 세계 최초의 4D 영화 상영으로 알려진 1984년 미국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시 식스 플랙스 테마파크에서의 ‘더 센소리움’ 상영부터 1986년 미국, 프랑스, 일본 디즈니랜드에 걸친 ‘캡틴EO’ 상영, 2002년 네덜란드 에프텔링 테마파크의 ‘팬더드룸’ 상영에 이르기까지 모두 그렇다.
따지고 보면 어차피 모두 같은 ‘영화관상영’이다. 다만 ‘일반 상업영화상영관’이냐 ‘놀이공원 내에 존재하는 상업영화상영관’이냐의 차이만 있을 뿐이다. 정확히 말해, 기술적 측면에선 하등 차이가 없다. 상영장소의 성격만 다른 것이다. 결국 한국의 ‘할리우드 3D 콘텐츠의 4D 관람 기술’은 ‘남들이 못하는 것’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안 하는 것’을 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왜 해외에선 4D 상영을 일반 상업영화상영관에서 하지 않았을까. 단적으로 말해, 그게 산업적 결론이었기 때문이다. 영화상영관 장치기술을 처음 시도했던 미국에서 그런 결론을 가장 먼저 냈다. 그것도 벌써 50여 년 전 일이다.
B급 독립영화제작자 윌리엄 캐슬이 그 선구자 격 인물이다. 캐슬은 객석 아래 모터가 달린 장치를 부착한 뒤 특정 장면이 시작될 때 객석이 동시에 흔들리도록 고안하고, 객석에 전기장치를 부착해 특정 장면에서 가벼운 전기쇼크가 오도록 전류를 흘려보내는 등 ‘오감 체험’ 관람에 갖가지 실험을 가했다. 이 같은 상영방식을 취한 영화는 1950~60년대 당시 ‘기믹 무비(gimmick movie)’라 불렸다. 그런데 1960년대 중반 즈음까지 명맥을 유지하다 유행이 끝나버렸다. 이유는 단순했다. 처음에는 신기한 발명품이라는 생각에 호응했지만, 엄밀히 말하자면 내러티브형 영화의 관람만족도 면에서 극히 떨어지는 상영방식이었기 때문이다. 처음의 신기함이 사라지고 나면 불쾌감이 더 크게 일었다.
먼저 관객들이 영화에 집중할 수가 없었다. 영상에 녹아든 내러티브에 집중하려 하면 각종 장치들이 깜짝 놀래키고, 계속되는 관객들의 비명소리 탓에 영화의 대사조차 제대로 들을 수 없는 지경이었다. 또한 애초 ‘기믹 무비’를 지향해 나온 영화들은 각종 장치효과를 감안해두고 만들어지다 보니 플롯과 형식이 어색하고 아귀가 들어맞지 않는 현상이 일어났다. 이른바 ‘구두에 맞춰 발을 자르는’ 형태가 돼버린 것이다.
그래서 1970년대에 이르러 ‘기믹 무비’는 완전히 소멸돼버렸고, 1980년대에 테마파크에서 놀이기구로서 다시 부활하기에 이르렀다. ‘기믹 무비’ 관람은 영화 관람이 아니라 놀이기구 탑승의 마인드로 접근해야 대중만족도가 높아진다는 결론이 선 것이다. 그게 미국대중문화산업이 일찌감치 내린 결론이었다.
물론 이 같은 결론을 내린 건 미국뿐만이 아니다. 유럽이나 일본 등지에서도 4D 관람은 유원지 놀이기구 탑승이라는 인식이 강하며, 내러티브형 콘텐츠를 즐기는 일반 상업영화상영관 상영 시 오히려 거부감을 불러일으킨다는 결론들을 내렸다. 한국은 그런 거부감에 개의치 않고 일반 상업영화상영관 체인인 CGV 측에서 자진해 4D 상영을 밀어붙이고 있는 것뿐이다.
그러니 4D 관람이라는 개념은 기본 형식에 있어 오래 전 시도됐다가 부작용 탓에 거둬들여진 낡은 개념에 불과하고, 해외가 망설이고 우리가 그 첫 일반 상업영화상영관 도입 주자가 된 것도 바로 그 탓이며, 지금은 그저 3D의 부활에 맞춰 4D라는 더 선진적인 캐치프레이즈로 거듭나있는 상태에 불과하다는 얘기다. 별로 자랑할 게 못 된다. 그런데도 그걸 놓고서 조선일보는 발문으로 ‘한국은 4D 종주국’이란 카피를 뽑았다. 혹여 해외에서 웃음거리로 소화되지나 않을까 걱정되는 카피다.
끝으로, 위 기사는 오보와 오보로 여겨질 만한 미확인 정보까지 들이밀고 있다. 기사 중 제프리 카첸버그는 “영화관의 미래를 알려면 한국의 극장에 가라”고 말했다고 한다. 그러나 구글 검색 등을 통해 국내외 뉴스를 아무리 찾아봐도 그 같은 발언을 했다는 내용은 조선일보 기사에만 등장한다.
또한 카첸버그는 기사에 언급된 것처럼 드림웍스의 CEO인 것이 아니다. 그는 드림웍스 애니메이션의 CEO다. 1994년 스티븐 스필버그, 데이비드 게펜 등과 함께 드림웍스 SKG를 공동 창립한 것은 맞지만, 그는 죽 드림웍스의 애니메이션 부문만을 맡았다. 그러다 2004년 드림웍스 애니메이션 부문이 드림웍스 애니메이션이라는 회사명으로 본사로부터 독립돼나가면서 해당회사의 CEO가 됐다.
이런 측면에서 그간 국내 보도된 카첸버그의 몇몇 발언들도 수정될 필요가 있다. 연합뉴스 2010년 10월14일자 기사 ‘드림웍스 모든 콘텐츠, 3D로 제작’은 “드림웍스의 제프리 카첸버그 CEO(최고경영자)는 14일 “앞으로 제작하는 모든 콘텐츠에 3D 기술을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일단 카첸버그가 드림웍스 CEO가 아니라는 점에서 조선일보와 같은 부분을 틀렸다. 그리고 카첸버그는 드림웍스 애니메이션을 벗어난 상황에 대해선 말할 입장이 못 된다. 따라서 그의 발언은 “앞으로 드림웍스 애니메이션에서 제작하는 모든 애니메이션 콘텐츠에 3D기술을 적용할 것”이라 해석돼야 맞다. 카첸버그는 2010년 4월20일 미국 TV프로그램 ‘더 콜버트 리포트’에 출연해서도 “향후 드림웍스 애니메이션이 제작할 모든 영화는 3D가 될 것”이라 밝힌 바 있다.
결국 카첸버그는 언제나 ‘애니메이션만’ 3D로 계속 제작하겠다는 뜻을 밝혀온 셈이다. 애니메이션 주소비층인 유소년층 관객들의 경우 진진한 내러티브형 콘텐츠보다는 각종 요란스런 효과가 넘실대는 놀이기구형 콘텐츠에 더 큰 만족도를 보이는 경우가 종종 눈에 띈다. 그래서 이 같은 발언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2011년 들어 거대자본이 투여된 3D 애니메이션 ‘화성은 엄마가 필요해’가 대실패하고, 역시 3D로 무장한 ‘쿵푸 팬더 2’마저 북미 흥행에서 전편의 3분의 2도 채 못 벌어들이는 이변이 발생하면서, 유소년층의 변덕스런 취향에서 3D가 벌써 밀려난 것은 아닌가하는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카첸버그부터가 자신의 노선에 위기의식을 갖게 될 시점이란 얘기다.
지금 같은 3D ‘허당’ 현상이 내년까지도 지속된다면, 그리고 카첸버그가 정말로 “영화관의 미래를 알려면 한국의 극장에 가라”고 말한 게 맞다면, 아마 내년쯤 카첸버그는 “한국 영화관의 팝콘이 맛있어서” 그런 발언을 했다고 발뺌할는지도 모르겠다. 아니면 어차피 어떤 보도를 찾아봐도 한국의 조선일보 외에는 그런 발언을 담은 적이 없으니, 단순히 조선일보의 오보였다고 지적하든가 말이다.
대중문화평론가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