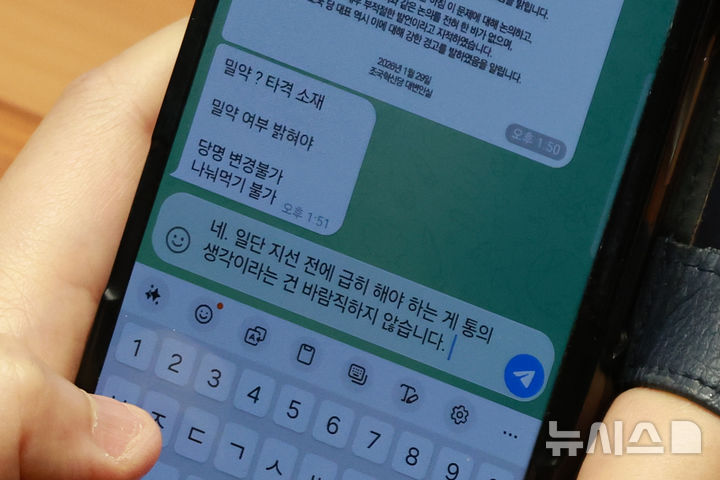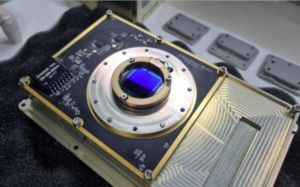복지부 소관 된 국립대병원…'지역필수의료 강화' 마중물 될까
국회서 소관부처 법 개정 통과…논의 시작 20여년만
"이관으로 끝나선 안돼…인력 더하고 별도 투자해야"
![[대구=뉴시스] 대구 시내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이동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DB) 2025.09.01.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9/01/NISI20250901_0020954567_web.jpg?rnd=20250901150835)
[대구=뉴시스] 대구 시내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이동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DB) 2025.09.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국립대병원 소관부처를 이관하는 법 개정이 약 20년 만에 통과되면서 지역필수의료 강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부처 이관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행·재정적 지원 등 다양한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는 조언도 나온다.
30일 국회를 통과한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등에 따르면 지역 국립대학(치과) 병원 소관 부처가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된다. 이는 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된다.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 이관은 2005년부터 논의됐던 사안이다. 국립대병원을 지역 진료·교육·연구 거점병원으로 육성해 수도권 원정 진료, 지역필수의료 붕괴, 지역 간 의료 격차 등의 의료계 문제점을 해결하겠다는 이유에서다.
국가 보건의료 정책 총괄은 보건복지부이지만 국립대병원은 소관 부처가 달라 의료전달 체계나 필수의료, 지역의료 정책과 연계가 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복지부 소관 공공병원과 달리 공공정책 수행에 따른 손실 보전 체계가 취약해 재정 지원 구조에서 한계가 있다는 문제점도 있었다.
다만 소관 부처 이관만으로 이와 같은 문제점이 한 번에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9개 지역 국립대학병원은 소관 부처 이관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던 지난해 11월 27일 긴급 공동 입장문을 내고 "부처 이관 후 국립대병원이 국정과제인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종래 국립대병원의 설치 목적인 교육·연구·진료의 지속성과 안정성은 어떻게 담보할 지 등 핵심 내용이 빠져있다"며 "지역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필수 인력과 자원의 부족도 심각하다"고 했다.
국립대병원협회 지역필수의료강화 TF도 지난해 11월 국립대병원 교수 1063명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79.9%가 이관에 부정적이었다며 부처 변경에 반대했다.
정부 역시 소관 부처 이관만으로는 정책 목표 달성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국립대병원의 종합적 육성 방안을 마련 중이다.
교수 신분은 현행 유지하고 전임 교원은 계속 증원하면서 안정적인 교육·연구 환경을 조성하는 등 우수 인력을 확보하고 첨단 치료 장비, 노후 병원 신축·이전 등 인프라도 첨단화할 계획이다. 또 전공의 배정 확대와 특화 연구개발(R&D) 지원 등 교육과 연구에 투자를 확대하고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를 통한 안정적인 중장기 재정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책 수가 등 국립대병원 수행 기능 보상도 확대 추진한다.
동시에 국립대병원이 지역필수의료 네트워크의 중추 기관으로서 권역 내 진료 협력과 필수의료 자원 운영 등을 조정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국립대병원 지원과 육성을 담당할 별도 부서 신설을 행정안전부에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전문가들은 국립대병원의 역할 강화를 위해서는 투자 강화가 필수라고 입을 모은다.
나백주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정책위원장은 "지방에 다른 공공병원이나 보건소와 연계를 하려면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돼있어야 했는데, 이제 자기 자리를 찾아가는 것"이라며 "지역의사제 교육·수련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희귀·난치·필수의료 역할도 강화해야 하는 만큼 인력을 더하고 별도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재헌 무상의료운동본부 사무국장은 "부처 이관으로만 끝나서는 안 된다"며 "그간 국립대병원도 사립병원처럼 이익 중심 운영 구조였는데, 국립대병원 위상에 맞게 바꿀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